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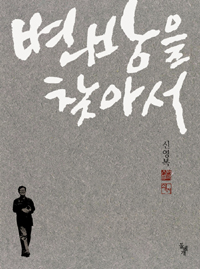
▲ 책겉그림 신영복 교수의 〈변방을 찾아서〉
ⓒ 돌베개
"변방은 그런 것이다. 비록 변방에 있는 글씨를 찾아가는 한가한 취재였지만, 나로서는 취재를 마감하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변방'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그런 상념을 담는 데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글의 양도 부족하고 붓글씨라는 한가한 소재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글들은 독자들의 것이다. 내가 신문의 연재 글을 책으로 내는 데에 동의한 것도 '독자의 탄생'을 믿기 때문이다."
신영복 교수의 <변방을 찾아서>에 나오는 머리글이다. 신영복 교수 자신이 직접 붓글씨를 써서 보낸 곳들을 몇 군데 둘러보고, 그곳에서 던져주는 변방성(邊方性)의 의미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책을 엮어 냈다. 해남의 송지초등학교 서정분교를 비롯해 강릉의 허균·허난설한 기념관과 벽초 홍명희 문학비와 생가도 둘러보지만 서울특별시 시장실도 들어간다. 단순한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변방이 아니라 변화와 소통, 창조와 생명의 의미로 내다 본 까닭이다.
제일 첫 번째 방문지는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의 서정분교다. 그곳에는 신영복 교수가 현판 글씨를 써 준 '꿈을 담는 도서관'이 있다. 서울에서 6시간 걸려 도착한 그 학교는 오히려 생기발랄하고 행복한 곳이었다고 한다. 전교생이 5명으로 줄어서 폐교직전까지 갔던 학교가 지금은 전교생 66명에 교직원도 13명으로 늘어났다고 하고.
그곳에서 신영복 교수는 그걸 깨닫는다. 꿈은 머리나 가방에다 담는 게 아니라고. 꿈은 오히려 가슴에다 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다. 폐교 직전의 그 학교가 되살아났던 것은, 그리고 지금은 젊은 학부모들이 앞 다투어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이름난 학교가 된 것은, 마을과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슴에 담았던 까닭일 것이다. 성적이나 성과만 생각했다면 진즉 사라졌을 학교였지 않았을까?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자기에게 맞춘다는 의미가 세상을 인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면 글자 그대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이처럼 우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조금씩 새롭게 바뀌어 왔다는 사실이다."(57쪽)
한국의 변방인 강원도, 다시 그곳의 변방인 초당동 기념관에서 느낀 감회의 기록이다. 27살의 한 많은 생애를 마감한 난설헌 허초희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허균의 생애를 되뇌면서 한 말이다. 허균의 '호민론' 앞에서는 더욱더 숙연해진다. 조선 시대의 체제와 주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지 않은 당당한 주체성과 저항성을 확보하는 것 말이다. 그들의 창조정신과 개혁정신은 아직도 유효할 것이다.
그런 정신을 받드는 이를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 하던가? 아흔 살이 넘은 우공이라는 노인이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옮기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 말이다. 그가 어찌 그 당대만 생각했겠는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나갈 것을 내 비친 게 아니겠는가. 신영복 교수가 봉하마을을 찾아 성찰한 것도 그것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이디였던 '노공이산'(盧公移山)처럼, 사람 사는 세상을 일구는 게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봉하에서 받는 위로요, 그 변방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희망이라고 신영복 교수는 회고한다.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조화와 소통이 아닐까. 산수(山水)는 대우(大友)라고 한다. 산과 물은 오래된 친구라는 뜻이다. 물이 없이 어떻게 산이 수목을 키울 수 있으며 산이 없이 어찌 물이 흐를 수 있으랴. 북악과 한강이 서로 환포(環抱)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어루만져야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는 법이다."(131쪽)
박원순 서울 시장을 만나고서 토로한 회고다. 신영복 교수는 서울 시청이 변방이 아님에도 그 변방성을 깊이 이해해 준 박원순 시장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예전에 자신이 출품한 붓글씨 작품 〈서울〉에도 그런 의미를 체현했다고 한다. 기호에 불과한 '서'와 '울'을 '산'과 '강'으로 형상한 것 말이다. 서울이 북악과 한강으로 그려지고, 북악과 한강은 다시 왕조 권력과 민초들의 애환으로 대비하여 드러낸 것. 박원순 시장도 그와 같은 변방의 애환을 담는 것이 자신의 시정철학이라 받아들인다.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의 애환에 귀 기울이는 삶의 정치 말이다.
신영복 교수의 예전 책들도 그랬듯이 이번 책에서도 관계론적 성찰이 돋보인다. 중심과 변방, 변방과 중심의 관계론적 역학 관계가 그것이다. 중심부에서 한참이나 밀려난 게 변방이지만, 중심은 변방이 안고 있는 애환과 설움을 통해 자각과 변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모든 중심부의 창조정신과 개혁정신은 그 변방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말이다.
요즘 우리사회 곳곳에서 변방으로 밀려나는 이들이 많다. 체제와 주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지 못한, 아니 포섭당하지 않는 우직한 이들이 그렇다. 시대의 어리석음으로, 관계론의 부족으로 내쳐지는 이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변방성을 수용하지 못한 중심부에 대해서 뭐라고 소리치는 이들도 없다. 중심을 꿰차려는 이들로 다들 우글거리고 있는 까닭이다. 신영복 교수가 회고한 변방성의 깊은 의미를 다시금 성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변방을 찾아서
신영복 지음,
돌베개, 2012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