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혼자 필리핀 팔라완 배낭여행을 했다. 더 '늙기' 전에 떠난 여행이었다. 팔라완의 북부여행은 '바다와 몸', 남부여행은 '바다와 사람들'이었다. 팔라완은 안전하고 아름답고 순수했다. 고되고, 거칠고, 가난하고, 고맙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여행을 했다. 두 달 만에 얼굴은 새카맣게 탔고 몸무게는 11kg 빠졌다. 팔라완은 이제 내게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리운 곳이 되었다. - 기자 말
a

▲ 바다 코론 CYC 섬 앞 바다의 바다색이 환상적이다. ⓒ 강은경
"괜찮아요?"
뒤따라 올라온 아영씨가 물었다. 나는 대답은커녕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 허우적거리며 켁켁 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눈은 찢어질 듯 아프고, 콧등은 떨어져 나갈 듯 얼얼했다. 엄살이 너무 심했나? 모랫바닥을 박차고 죽자 사자 물 밖으로 탈출한 이유는, 마스크 안으로 밀려든 바닷물. 공포였다.
"지금은 수심이 낮아서 괜찮지만, 깊은 데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어떤 경우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전날 받은 이론수업 시작부터 반복해서 들은 말이었다.
'당황하지 마라! 안전규칙을 반드시 지켜라!'
스쿠버 다이빙 실기교육 첫날이었다. CYC(Coron Youth Club, 코론 유스 클럽) 섬 앞바다였다. 팔라완 부수앙가 섬의 코론 시에서 방카를 타고 20여 분 남쪽으로 달려왔다(방카는 필리핀 전통 배. 폭이 좁고 대나무나 통나무 날개가 배 양편에 달려 있다). CYC 섬은 작은 무인도였다.
해변 앞 완만한 모래 바다는 스쿠버다이빙 초보자들의 교육 장소가 될 만했다. 주변엔 그림처럼 방카가 몇 척 떠 있었다. 스노클링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나 다이버들을 싣고 왔다. 아침 바다는 맑고 잔잔했다. 산호모래 옥빛 바다에 아침햇살이 투명한 그물처럼 펼쳐져 어룽 어룽거렸다.
밴 기사에 배낭족 묵는 싼 숙소 안내해달라고 부탁
a

▲ 코론 트라이시클이 달리는 코론 시내 모습. ⓒ 강은경
그제 오후, 나는 부수앙가 공항에서 승객을 호객하고 있던 밴을 타고 코론 시로 이동했다. 50여 분 시골 길을 달렸다. 나는 밴 기사에게 배낭족이 묵는 싼 숙소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기사는 시내를 돌며 리조트와 선착장 앞에 다른 승객들을 다 내려준 뒤, 그가 잘 아는 숙소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시내 한복판이었다.
선풍기 달린 작은 방에 침대 하나, 공동욕실, 700페소짜리 방이었다. 나는 짐만 방에 들여놓고 밖으로 나왔다. 해거름 녘이었다. 사리사리(구멍가게)에서 시든 바나나 두 쪽이랑 물 한 병을 샀다. 그 자리에서 허기만 대충 때우고 시내를 어슬렁거렸다. 더웠다. 여기서 뭘 하지?
바닷가 작은 관광도시였다. 오토바이와 트라이시클이 소음을 내뿜으며 좁은 도로를 오고 갔다. 여행객들로 보이는 서양인들과 필리핀 사람들이 기념품가게와 식당들을 들고났다. 나는 기념품가게와 다이브 센터, 바, 식당, 세탁소들을 기웃거리며 번화가를 따라 걸었다.
무슬림 상가지역을 지날 때는 히잡이나 타끼야 차림의 상인들이 "예스, 맘!" 하며, 가게를 기웃거리는 내게 다가오곤 했다. 얼마 안 가 넓은 공터가 펼쳐졌다. 쓰레기 매립지였다. 매립지 제방 끝으로 바다를 보러 갔다.
앞바다 왼쪽에 길게 누워 있는 코론 섬과, 수평선을 가리고 있는 작은 섬들이 보였다. 빼어난 경관은 아니었다. 뭐 없나? 기왕이면 입이 딱 벌어지게 굉장한 거. 죽기 전에 봐야 할 비경, 수천수만 년 전 인류문명의 흔적, 뒷골목의 포르노 극장... 그보다 더 격하게 끌리는 것들 말이다. 그런데 여기는 태평양의 섬이다. 여행자는 바다를 보려고 이 도시를 찾는다. 스노클링, 난파선 다이빙, 아일랜드 호핑...
a

▲ 코론 방카에 스쿠벙다이빙 장비를 싣고 바다로 나간다. ⓒ 강은경
왔던 길로 돌아갔다. 한 다이브 숍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안쪽 벽에 스쿠버다이빙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다. 다이버와 유영하고 있는 심해의 물고기들, 고래상어, 만타레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심장이 쿵쿵쿵... 그 소리가 노크 소리인양 하나씩 열리는 문. 되살아나는 기억들이 있었다. 쥘 베른의 '해저 2만리', BBC의 푸른 지구(The Blue Planet), 레이첼 카슨의 '우리를 둘러싼 바다'... 인어공주의 노래 'Under The Sea(언더 더 시)'...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숍 안으로 들어섰다. 필리핀 아가씨가 혼자 숍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다짜고짜 "스쿠버다이빙을 하고 싶어요!" 실로폰 소리처럼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인쇄물 한 장을 건네주었다. 스쿠버다이빙 강습 코스와 비용 목록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면 반드시 강습을 받고 다이버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장비를 빌릴 수 있고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
아가씨의 설명을 들으며 꼼꼼히 목록을 훑어보았다. 비용을 계산했다. 코스는 다섯 단계였다. 나는 첫 단계인 오픈 워터 다이버(open water diver)부터, 이왕 배우는 거 어설프게 맛만 보고 말 수 없으니 두 번째 단계인 어드밴스트 오픈 워터 다이버(advenced open water diver) 자격증까지 따고 싶었다. 그러면 준비해온 여행경비의 3분의 1이 뭉텅이로 빠져나간다. 남은 돈으로 남은 여행을 해야 한다. 두 달여 동안. 경제사정이 아주 팍팍해진다. 가능할까? 못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못 할 것도 같았다.
두 군데 더 다이브 숍을 들렸다. 수강료는 조금씩 차이가 났지만, 거기서 거기였다. 스쿠버다이빙 강습비가 가장 싼 곳이 필리핀이라는데, 그것도 내겐 거금이었다. 나는 그만 풀이 팍 죽어 버렸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버킷 리스트는 만들지 않았지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돼버렸다. 지르고 보자는 오기가 은근히 발동했다.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싶었다. 설마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지. 쉰 줄이라고 못 할 게 뭐 있겠나. 14kg 짐을 지고 혼자 배낭여행도 나선 판인데. 스쿠버다이빙쯤이야, 자신만만했다. 나는 물을 좋아하고, 수영도 좀 하고. 담력이 세, 웬만해선 무서움 타는 게 별로 없다.
삼거리에 '산호'라고 한국어 상호가 걸린 다이브 숍이 보였다. 거기서 강사 아영씨와 재만씨를 만났다.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린 30대 젊은이들이었다. 바닷바람처럼 에너지가 넘쳐 보였다. 두 사람과 얘기하다 마음을 완전히 굳혔다. 당장 스케줄을 잡았다. 제대로 꽂힌 거다. 그리고 수강료를 좀 깎아달라고 찌질하게 징징거렸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이다, 죽기 전 소원이다, 돈이 없다, 도와 달라, 라는 거짓말까지는 안 했다.
쉰 줄이라고 못 할 게 뭐 있나... 나의 첫 다이빙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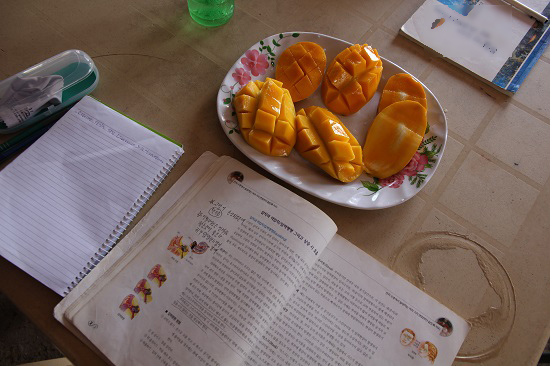
▲ 스쿠버다이빙 세 시간 넘게 이론수업을 받다. ⓒ 강은경
다음날 이론수업을 받고, 선착장 매립지 앞에 있는 숙소로 방을 옮겼다. 산호 다이브 센터에서 코앞이다. 방값은 500페소. 좁고 덥고 시끄러운 숙소 따위는 대수가 아니었다. 곧 신세계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바다가 무서워졌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바다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 나를 과신했나?
눈물콧물 짠물 다 빼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하강하기 전, 아영씨가 되풀이 말했다. 수심 1.5m 모래 바닥으로 내려가 '마스크 물 빼기' 연습을 다시 시도했다. 혹 마스크 안으로 물이 들어올 불상사를 대비해 일부러 마스크 안으로 물을 집어넣었다 빼는 연습이었다. 실패했다. 그다음 시도도 실패했다. 마스크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무섭게 매번 미친 듯이 수면 위로 뛰쳐 올라오고 말았다.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40대 한국 남자인 박은 나랑 딴판이게, 잘했다. 교육과정 하나하나 침착하게 잘 따라 했다.
어느새 해가 정수리 꼭대기로 올라섰다. 마침, 방카를 같이 타고 왔던 러시아 다이버들과 가이드들이 스쿠버다이빙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도 방카로 올라갔다. 선상에서 점심밥을 먹었다. 생선구이, 돼지고기 바비큐, 빡삐(호박과 야채들을 볶아 만든 필리핀 요리), 톨탈탕롱(필리핀 가지 요리), 밥, 바나나... 다이브 숍에서 준비한 음식이었다. 내겐 성찬이었다. 여행 시작하고 처음으로 풍족한 음식을 대했다. 과식했다. 영양보충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행히 기운이 솟는 것 같았다. 다시 바다에 들어갈 용기가 생겼다.
a

▲ 코론 방카에서 점심식사 ⓒ 강은경
잠수 슈트를 입고 허리에 웨이트를 찼다. 납덩어리 6kg. 공기통을 부착한 BC(Buoyancy Compensator, 부력조절기)를 입었다. 왼쪽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세월호 참사' 7일째였다.) 오리발을 신고 마스크를 썼다. 마지막으로 호흡기를 입에 물었다. 아영씨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하강을 시작했다. BC의 인플레이터 호스를 위쪽으로 높이 들고 공기배출 버튼을 눌렀다. 겁을 잔뜩 집어 먹은 채.
오후 1시 58분, 하얀 모래 절벽을 타고 수심 8m까지 하강했다. 모래바다임에도 바닷속은 말 그대로 신세계였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해수면 아래로 쏟아지는 빛의 타래, 그 속에서 유영하는 열대어, 하늘거리는 수초, 푸르륵 모래밭을 스쳐가는 스톤 피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수 35분 내내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호흡 조절, 이퀄라이징, 중성부력 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호흡기나 마스크가 빠져 달아날까, 시퍼렇게 어두운 난바다로 쓸려갈까... 겁에 질려 보이는 게 없었다. 나의 첫 다이빙은 그렇게 끝났다.
그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소음과 더위에 시달리며 업치락 뒤치락, '거대한 고래들이 헤엄쳐 오고 있는 곳.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주문처럼 비몽사몽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십여 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a

▲ 코론 방카 위에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받는다. ⓒ 강은경
인도양 안다만 군도, 한 무인도에서의 추억이다. 서로 낯선 십여 명의 배낭여행자들이 백사장 해안가에 해먹을 치고 지냈었다. 14일 동안. 일상이 야생이었다. 밤이면 발가벗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검은 밤바다에 들어가 물장구를 쳤다. 바다가 온통 반짝반짝 출렁였다. 온몸이 빛 무리에 감싸 반짝였다. 인광을 내는 플랑크톤이 반딧불처럼 발광하는 거였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또 홀딱 벗고 붉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태어날 때 몸이듯, 물살에 맑게 씻긴 알몸으로 바다에서 걸어 나왔다. 팬티 한 장의 문명마저 완전히 벗어버리자, 비로소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온전히 몸으로 느끼는 기쁨이었다. 문명도 문란도 사라진 바다, 그 순수한 오르가슴의 바다.
내가 여태껏 겪었던 바다는 그렇게 유희고 자유고 낭만이었다. 그런데 팔라완에서 완전히 다른 바다를 겪게 됐다. '나는 아직도 바다가 두렵다. 하지만 지금도 바다는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라는 어느 베테랑 다이버의 말이 딱 내 느낌이다. 지금 내게 바다는 숨 막히게 무섭다. 숨 막히게 나를 설레게 한다. 결국 나는 바닷속에서 자유로워지고 말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a

▲ 코론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다. ⓒ 강은경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