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어느 날, 정확히는 2014년 10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후 7시쯤. 시간까지 잊을 수 없는 그 일이 생긴 날, 당시 육아 휴직 4개월 차에 접어들던 저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일과 중 하나로 아이들의 목욕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이라 직접 씻길 필요는 없지만, 목욕하는 사이에 책을 읽어 달라기도 하고, 또 목욕탕에 놀러 온 아줌마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는 목욕탕 아줌마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직접 씻기는 것보다 더 분주합니다. 그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 사이 연락이 뜸하던 대학교 때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느 날 거짓말처럼 오른 1위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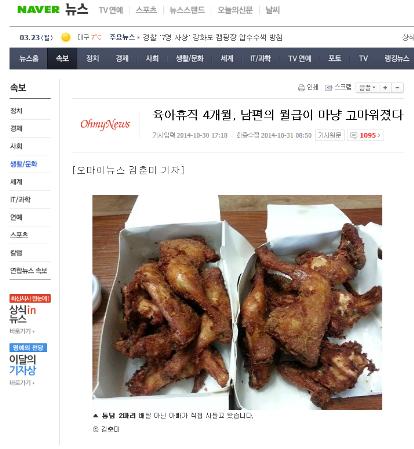
|
| ▲ 당시 많이본 뉴스 1위의 기사 댓글이 무려 1095개 달렸습니다. |
| ⓒ 네이버뉴스 화면 갈무리 |
관련사진보기 |
'아줌마, 회사 다니다 육아 휴직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N포털 뉴스에 기사가 뜬 걸 보니 잘 살고 있네.'위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다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얜 무슨 소리래?' 적당히 무시하고 목욕탕 주인 아줌마 역할로 돌아가려는 사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 혹시 오마이뉴스 기사 올렸어?"혈액형이 A, 그것도 트리플 A라서 웬만한 일로는 흥분도 하지 않는 남편의 흥분된 목소리. '아니, 목욕탕 놀이에 푹 좀 빠져 보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했습니다.
"응, 쓰긴 썼는데... 왜?""이그, 우리가 먹은 통닭, 그리고 당신 이름. 딱 이네... 아이구, 뉴스 좀 봐 보셔!"'금요일 저녁 하라는 퇴근은 안 하고 왜 뉴스를 보라고 전화래' 이렇게 중얼대며 젖은 손을 대충 옷에 문질러 닦고 휴대폰으로 N포털에 접속했습니다.
"오마이 갓! 꿈이니 생시니, 아니 웬 난리니?"며칠 전 우리 집에서 먹었던 낯익은 통닭 두 마리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고,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기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 육아휴직 4개월, 남편의 월급이 마냥 고마워졌다). 그리고 댓글은 눈 깜짝할 사이에 500개, 600개, 그리고 700개를 훌쩍 뛰어 넘고 있었습니다. 잠시 상황 파악이 안 돼 멈춰 서서 '이게 뭔가' 하고 얼빠져 있는 사이, 목욕탕 손님 역할에 충실했던 아이들은 이미 목욕을 마치고 수건으로 잘 닦지도 않은 채 나와 물을 뚝뚝 흘리며 이리저리로 뛰고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여러 개 올려 보긴 했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선 젖은 채로 망아지처럼 뛰는 아이들을 잡아 옷을 입히고 머리를 말리면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아이뉴스 편집부에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저, 혹시 기사가 포털사이트에도 뜨나요? 아니 전 이럴 줄은 몰랐는데..."당연히, 각 신문사 주요 기사를 보내는 것처럼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 너무도 당연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영예의 1위'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사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늘어나는 댓글에 부담스러웠던 저는 부랴부랴 편집부에 전화를 걸어 또다시 '이 사진 좀 빼주세요. 저 문구 좀 바꿔주세요'라며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나쁜 내용의 기사도 아니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나누는 기사였음에도 얼떨결에 얻은 1위 자리에 부담스럽고 주렁주렁 달린 댓글을 몇 개를 읽다 상처아닌 상처도 입었습니다. 예측불가, 꿈도 못 꾼 '영광스러운 1위'가 남긴 혼동과 상처로 다시는 이렇게 글 쓰는 건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며칠간은 꽁꽁 얼어 붙어 오마이뉴스 사이트는 들어와 보지도 않고, 가급적이면 인터넷도 아예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 부담스러운데 도대체 왜 쓰는 거니?5년 전쯤입니다. 주말 부부로 3살, 5살 두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이었던 저는 아침에 출근하려면 두 아이를 깨워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와 스피드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큰아이는 옷 안 입는다고 보채고, 둘째 아이는 밥 안 먹겠다고 보채는 가운데 출근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저도 달래다 달래다 지쳐 어쩌지 못하고 주저앉아 목놓아 울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축 풀린 팔과 다리. 그저 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는 엄마가 이상했는지 먼저 울음을 그쳐준 아이들에게 고마워하며 간신히 눈물을 닦고 오른손으로는 큰아이의 손을 잡고 또 왼손으로는 작은 아이를 안고 나오던 그 날, 점심시간 사무실 앉아서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사였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우연히 인터넷을 타고 들어와 읽게 된 '사는 이야기' 글들을 읽으며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비슷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살고 있구나' 또 '이런 삶도 있네'라고 느끼며 그 기사들을 통해 위로 받고 힘을 얻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사는 이야기'의 작은 끼적임이 주는 큰 기쁨과 따스함, 바로 그것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며칠에 걸쳐 고민한 끝에 내 마음 속에서 돌아온 그 대답으로 저는 전문 기자도 아니면서 얼떨결에 차지한 '거짓말 같은 1위 기사'의 후유증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천천히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힘도 얻고, 함께 아파하기도 하며 더불어 살아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