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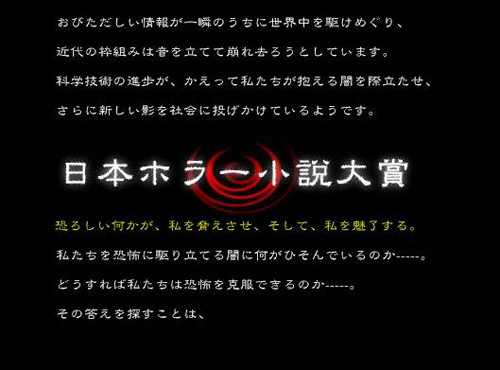
|
| ▲ 일본 호러소설 대상 홈페이지(화면 갈무리). |
1990년대 한국 사회(경제)가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달성이라는 일종의 포만감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 사회(경제)는 버블경제(Bubble Economy, 실물경제에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경기 과열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풀어 오른 것 같은 양상)의 붕괴와 함께 경기 침체의 늪에 서서히 빠져들었다.
일본은 머니게임(money-game)으로 들끓던 버블경제(1986~1992년)가 붕괴되면서 '외적 팽창'의 종언을 맞는다. 1980년대 일본 사회 전반엔 미국 경제를 추월해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되는 일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환상이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 사회는 계층 간 갈등이나 사회 내부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버블경제 붕괴와 함께 이러한 믿음도 사회 내부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소련 붕괴로 시작된 세계 질서 재편은 시대의 불안을 한층 더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버블 붕괴는 1994년 라틴아메리카 금융 공황, 1997년 아시아 통화 위기 등 도미노 현상처럼 각지를 휩쓸고 다니며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현재 일본은 세계 에너지 문제 및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10년(버블경제 붕괴 후 2002년까지 이어진 장기불황)'이 장기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에너지 절약 및 경기 부양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2006년 일본 유행어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사회 현상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난) '격차사회'(양극화)의 그림자는 비정규직 노동자(프리타) 증가와 함께 더욱 짙어지고 있다.
버블경제 붕괴와 호러의 출현호러소설은 1990년대 일본의 불안을 전면적으로 드러낸 문화 현상이었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던 경제 호황이 끝나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에 믿었던, 혹은 유효했던 가치들도 함께 파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동시대의 공포와 불안감을 잘 드러낸 것이 호러소설이라 할 수 있다. 공포는 곧 도래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한 생물학적 감각을 지칭한다. 범죄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공포가 인간의 생득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즉 호러는 9.11사건과 같은 직접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두려움과 달리 내재적인 공포를 통해 한 시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 호러소설이라는 장르가 정착한 것은 1993년 이후이다. 그렇다면 괴담류의 소설과 호러소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괴담이 '해결 가능한' 원한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된다면, 호러소설은 '해결 불가능한' 공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장르의 성격은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호러라 하면 미국 호러영화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호러영화 중에서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Night of the Living Dead>(1968)이나 후퍼 감독의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The Texas Chain Saw Massacre>(1974)은 호러라는 장르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두 작품은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음에도 결국 미국이 패한 역사적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1960~70년대 서구 사회는 68혁명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확고하다고 믿었던 사회 질서의 재편을 목도했다.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는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 불신을 안겨주었고, 수많은 전사자를 배출하면서 시대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좀비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습격하고 사회 시스템을 공격하는 배경에는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확산된 사회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좀비를 공포로 바꾸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좀비가 전염병처럼 확산되듯이 공포 또한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3년 대형 출판사가 '일본 호러소설 대상'이라는 문학상을 만들었다(현재 15회 수상자까지 선정됐다). 가도카와 호러문고(角川ホラー文庫)는 많은 히트작품을 출판하며 확고한 위치를 굳혔고, 이와이 시마코(岩井志麻子), 반도 마사코(坂東眞砂子), 시노다 세쓰코(篠田節子), 온다 리쿠(恩田陸), 오노 후유미(小野不由美) 등의 여성 작가도 등장했다. 호러는 단순히 문학작품만이 아니라 '망가'(만화)에도 등장한다. 오카자키 교코(岡崎 京子)의 <리버스 엣찌>(1994), <헤르타 스케르타>(2003)등은 호러가 소설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에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도 호러라는 장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 자체가 '해결 불가능한' 내부의 갖가지 모순을 안고 있는 것과 깊이 연관돼 있다.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의 윤리적 척도로 한 사회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 사회 자체의 모순이 축적되고 그것이 내부로부터 파열되기 시작한 상황을 의미한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가치의 붕괴를 알렸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도래는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면서 빈부 격차를 더 확대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다수 서민들의 일상을 순식간에 파괴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2006)은 한강변의 평화로운 일상에 갑자기 괴물이 뛰어 들어오면서 한 서민 가정의 일상이 어떻게 위협받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 괴물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그리고 IMF 경제위기로 치환하면 괴물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괴물의 등장은 공포가 어떻게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지를 잘 보여준다. 괴물은 서서히 우리 주변을 서성이다가, 갑작스럽게 일상으로 뛰어든다. 그 갑작스러움이 실제로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포는 사회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무차별 살인,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일본에서는 도오리마(通り魔, 묻지 마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도오리마는 자기 쾌락 및 사회에 대한 복수를 위해 모르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사건의 공통점은 20~30대 젊은이들이 범인의 대다수라는 것과 함께, 인간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불만 및 분노가 누적되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범행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묻지 마 살인' 사건은 2007년 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06년에 비해 4배 증가한 수치다(일본경찰청의 범죄 분석 통계). 2008년에는 이미 이바라키(茨城)연속 살상 사건(3월 22일), JR 오카야마역(岡山駅)살해 사건(3월 25일), 아키하바라(秋葉原)무차별 살해 사건(6월 8일), 하치오지(八王子)살상 사건(7월 22일)이 벌어졌다. 이외에도 히라쓰카(平塚)에서 행인을 칼로 베고 달아난 사건을 비롯해, 열다섯 살짜리 중학생 소년이 부모에게 혼난 후 아이치(愛知)에서 버스를 납치한 사건(7월 16일, 살상자는 없었다)이 벌어지는 등 2008년은 그 어느 해보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차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치오지 살상 사건의 범인 칸노 쇼이치(菅野 昭一, 33)는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 부모와 상의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부모에게 앙갚음을 하고 싶어서" 서점 여직원을 식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해 사건은 이바라키 사건(8명 살상) 때보다 많은 17명이 살상된 대형 사건으로 일본 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안겨줬다. 이 사건의 범인인 가토 도모히로(加藤智大, 26)는 6월 8일 일요일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에 아키하바라 보행자 천국(일요일에는 자동차 통행을 막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게 하고 있다)에 2톤 트럭을 몰고 돌진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치고, 트럭에서 내려 차례차례 사람들을 찔렀다.
가토는 파견사원으로 범행 전 인터넷 게시판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애인이 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그래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오라고 전화가 온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모자라니까", "어딘가 다른 공장에 간들 반년도 못 가서 또 이렇게 될 것은 뻔하다" 등의 글을 남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공술에서는 "생활에 지쳤다. 누구라도 좋으니 죽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의 "누구라도 좋았다"라는 발언은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이는 또한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르는 범인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파견사원이었던 점, 사회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점을 들어 이러한 범죄를 양산하는 사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예비 범죄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백서(労働白書)>에 따르면 1991년 62만 명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매년 10~20만 명씩 증가해 2004년에는 217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취직을 희망하는 실업자까지 넣고 계산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1990년 183만 명, 2001년에는 417만 명에 이르는 등 <노동백서>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더 많다는 보고도 있다. 417만 명 가운데 15~34세 사이의 프리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격차사회에서 희망은 전쟁 뿐?한국도 이러한 흐름에서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위의 사건들과 조금 다르지만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2003년 2월) 및 최근 벌어진 일련의 '묻지 마 살인'(올해 4월 운동 중이던 여고생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무참히 찔러 숨지게 한 양구군 '묻지 마 살인' 사건, 8월 15일 "그날은 누군가를 꼭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행인을 찔러 숨지게 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살인 사건 등)을 보면 일본에서 먼저 벌어진 사건들을 남의 나라 일로만 치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또한 고도성장기를 마감하고, 경기가 침체되며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사건을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리타이면서 프리랜서 라이터인 아카기 도모히로(赤木 智弘)는 '마루야마 마사오를 세게 때리고 싶다'(<論座> 2007년 1월호)라는 기사에서 '네트워크 우익'(고이즈미 정권 당시 등장한 세력으로 인터넷에서 우익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혐한류를 주도한 세력이기도 하다)이 등장한 배경이 격차사회에 있음을 밝히면서, 그 격차사회 해결의 대안으로 전쟁을 제시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회가 움직인다"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을 호소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젊은이들이 징집되며, 그곳에서는 빈부 격차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한다는 것이 그 글의 요지였다. 즉 도쿄대 출신의 엘리트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릴 수 있는 기회란 전쟁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동의하건 그렇지 않건, 노동빈곤층(working poor, 아무리 일해도 생계를 겨우 유지하거나 생활 보호 대상자 수준 이하의 수입밖에 손에 넣을 수 없는 사회 계층으로 일본에서는 <NHK 스페셜>에서 2006년 7월 23일에 방송된 후 격차사회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의 절망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이러한 주장이 왜 나오는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리타의 희망이 전쟁'이라는 말은 힘없는 개인이 설자리가 없어진 일본 사회에 대한 공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호러와 '묻지 마 살인'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다.
큰사진보기

|
| ▲ 일본의 '묻지 마' 살인과 그 사회적 의미는 국내 언론에도 소개됐다. |
| ⓒ <한겨레>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