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그림
스토리닷
시골에서 살림을 짓는 하루를 보내면서 문득 책 하나를 엮었습니다.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입니다. 이렇게 긴 이름을 붙여도 될까 싶었지만, 때로는 조금 긴 이름도 어울릴 테고, 단출히 '들꽃내음 작은책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때 서울에서 살며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여밀 적에는, 살림살이를 말에 담는 길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고 여기면서, 들숲바다를 늘 헤아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아예 시골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낱말책을 짓거나 엮는 일꾼이라면 스스로 살림을 가꿀 뿐 아니라 언제나 들숲바다를 품는 하루를 누려야 하는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서울이나 큰고장에서도 자주 들마실·숲마실·바다마실을 하면서 들숲바다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내내 새롭게 흐르는 해바람비에 풀꽃나무에 들숲바다를 늘 지켜보고 살펴보고 들여다보지 않고서야 말을 말답게 못 여미겠구나 싶더군요. 왜냐하면 우리말이건 일본말이건 중국말이건 영어이건, 다 그 나라 삶자리에서 태어난 말인데, '말이 처음 태어난 삶자리'는 모두 시골이고 숲이고 바다이고 들입니다.
모든 말은 살림하는 어른과 어버이와 아이가 스스로 지었습니다. 살림꾼이 지은 말을 따로 '사투리'라고 합니다. 이 사투리를 요모조모 알맞게 오늘날 흐름에 맞추어 새로 엮기에 '새말'입니다. 번쩍거리거나 높거나 대단해 보이는 서울살림이라 하더라도, 모두 '숲에서 태어난 말'을 바탕으로 엮습니다.

▲서울 뿌리서점
숲노래
책숲은 어떤 곳인가?
<들꽃내음 작은책집>은 두 가지를 기둥으로 삼습니다. 첫째는 '들꽃내음'이고, 둘째는 '작은책집'입니다. 낱말을 살피는 길에 늘 들꽃내음을 살폈습니다. 들꽃내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다니면서 말 한 마디를 다루고 익혀 왔습니다. 이러면서 작은책집을 찾아나서려고 온나라 곳곳을 하염없이 걷고 다시 걷고 새로 걸었습니다. 큰책집에 잔뜩 있는 책만 읽어도 될 수 있지만, 큰책숲(대형도서관)에 깃든 책만 읽어도 한가득일 테지만, 큰책집이나 큰책숲에 없는 책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더 헌책집을 찾아간다. 지쳐서 쓰러지려는 몸에 기운을 불어넣으려고 헌책집을 찾아가서 책을 읽는다. 납작오징어로 짓눌리거나 밟히거나 치이더라도 손을 위로 뻗어서 책을 읽으면, 한 칸에 1500사람이 넘게 탄 숨막혀서 죽겠는 지옥철에서조차 '찌끄러진 몸'을 잊은 채 '나비처럼 홀가분히 팔랑거리는 마음'으로 접어들 수 있다. (35쪽/1994.11.2.)
요즈음은 '독립출판'이라 하는데, 예전에는 '비매품'이라 하면서 조그맣게 태어난 책이 있습니다. 고을마다 모임마다 작은책을 꾸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비매품을 자주 냈고, 작은글꾼도 작은책을 자그맣게 묶어서 선보이는데, 이런 작은이야기는 새책집도 큰책집도 큰책숲도 아닌 '작은 헌책집'에만 들어왔습니다.
큰책집에서 다루는 책에 적힌 낱말만 본다면, 낱말책을 제대로 못 엮습니다. 온누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말글을 다루는지 살피려면, 새책집이나 큰책숲에 아예 안 들어가는 '작은 헌책집에만 들어오는 작은책'을 꼭 두루 읽고 새겨야 합니다.

▲서울 뿌리서점
숲노래
바구니에 담겨도 꽃이고 꽃그릇에 꽂혀도 꽃이지만, 들판에서 자라도 꽃이요, 나무그늘 밑에서 피어도 꽃이다. 책숲(도서관)에 꽂혀도 책이고, 새책집에 꽂혀도 책이지만, 헌책집에 꽂혀도 책이다. 책은 언제나 책이다. 쇳가루를 마시고 기름 먹으며 일한 손으로 쥐어도 책이며, 아파 드러누운 자리에서 힘겨이 쥐어도 책이다. 배움터에서도 책이고, 집에서도 책이다. 아이도 어른도 똑같은 책을 손에 쥔다. 누가 읽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책은 아니다. 어떤 넋으로 읽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책이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바뀌는 책은 아니다. 바로 오늘 즐거이 알아보고 읽으면 바뀌는 책이다. (69쪽/2000.9.26.)
저는 2007년 4월부터 책마루숲(서재도서관)을 열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아닌 개인도서관입니다. 낱말책을 쓰고 여미고 짓는 길에 곁에 둔 책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열어둔 '서재도서관'이고, 서재인 도서관이라서 '책마루 + 책숲' 얼거리로 새말을 지었습니다.
책을 사고파는 곳이기에 '책집'입니다. 누구나 홀가분히 드나들며 책을 읽고 누리는 곳이기에 '책숲'입니다. '숲'이란 모든 숨붙이가 가벼이 드나들며 어울리는 푸른터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라면 '나라책숲'이요, 시립도서관이나 도립도서관이라면 '고을책숲'입니다. 마을에서 조촐히 누리는 도서관은 '마을책숲'입니다.
우리나라에 책숲이 있는가?
작은책집을 꽤 오래도록 찾아다닙니다. 일고여덟 살 어린이일 무렵에는 언니 심부름으로 만화책을 사거나, 어머니 심부름으로 여성잡지를 사려고 다달이 드나들었습니다. 열네 살부터는 스스로 되새길 읽을거리를 찾으려고 혼자 조용히 마실했습니다. 열일곱 살부터 '책숲마실'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둘레에 나누었습니다. 작은책집을 알리는 혼책(독립출판)을 1994년부터 내놓다가 2004년에는 <모든 책은 헌책이다>를 따로 써내기도 했습니다.

▲서울 골목책방
숲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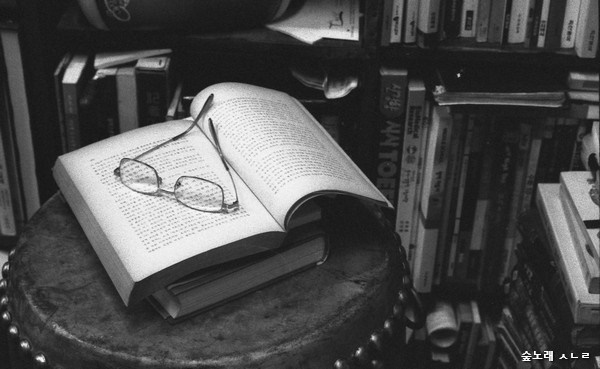
▲서울 굴다리헌책방
숲노래
저는 2007년에 책마루숲을 열어서 2024년에도 시골에서 그대로 이어갑니다. 나라책숲이나 고을책숲이 아쉽다면 스스로 책숲을 꾸리면서 책을 노래할 노릇이라고 느껴요. 나라에서 안 한다면 내가 하면 됩니다. 아직 우리말꽃(국어사전)이 제대로 안 나왔다면, 언제 마무리할는지 몰라도 내가 스스로 하면 됩니다.

▲서울 신고서점
숲노래
이제는 책숲을 찾아볼 때
작은책집이 깃든 곳은 으레 마을 안쪽입니다. 작은책집을 찾아나서려면 늘 골목마실을 하게 마련입니다. 골목길이란 들꽃과 마당나무가 조촐히 어우러진 작은숲입니다. 처음에는 책집만 찾으려고 골목을 거닐었는데, 책집을 둘러싼 골목집을 하나둘 스치고 지나다니면서, 어느새 책집 못지않게 골목집에서 흐르는 풀꽃내음을 맡으며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책을 보려고 책숲마실을 하다가, 시나브로 골목마실로 발걸음이 바뀌더군요.
아이를 무릎에 앉혀서 함께 읽는 책을 산다. 책꽂이에 곱게 채워 놓을 책은 사지 않는다. 꽤 많이 팔리는 책이라 해서 사지 않는다. 사람들이 입에 침이 닳도록 치켜세우는 책이라 할지라도 딱히 사지 않는다. 마음으로 스며들 때에 책을 산다. 마음을 활짝 열도록 다가오는 책을 산다. 나부터 두고두고 사랑할 만한 책을 산다. 우리 아이가 튼튼하고 씩씩하게 큰 다음에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책일까 헤아리며 산다. 돈이 넉넉하기에 책을 사지 않는다. 돈이 모자라기에 책을 못 사지 않는다. 돈을 좀 벌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책이나 사지 않는다. 살림돈이 바닥났어도 책을 산다. 집에 책꽂이가 모자라지만 책을 산다. (142쪽/2010.10.31.)
열 살이나 열너덧 살이나 열예닐곱 살에는 책값 500원에도 망설였습니다. 스무 살이나 스물두어 살에는 책값 1000원에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으레 '서서읽기'를 했습니다. 책값 500원이나 1000원이 없기에 "사서 집에서 느긋이 읽고픈 책"을 "책집 구석에 서서 조용히 읽기"로 누렸습니다. 서서 열 자락을 읽어야 한 자락을 샀고, 서서 서른 자락을 읽은 끝에 한 자락을 사기도 했습니다.

▲서울 혜성서점
숲노래
가난한 책벌레는 겨우겨우 몇 자락을 장만하면서 한나절이고 두나절이고 책집에 눌러붙었는데, 여태 어느 책집지기도 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책집을 닫을 밤에 이르면 "이봐, 젊은이, 이제 나도 닫고 집에 가야 하는데 아직 덜 봤나?" 하고 부르셨어요.
돈이 넉넉한 사람한테도, 주머니가 후줄근한 사람한테도, 책은 그저 똑같이 책입니다. 돈이 넉넉해서 깨끗한 새책을 온돈을 치르며 바로바로 사는 사람만 책읽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서 헌책집에서 눅은값으로 뒤늦게 장만하거나 서서읽기를 하는 사람도 책빛은 고스란히 스밉니다.
1999년이었지 싶은데, '책집 단골'을 놓고 '책집에 자주 오는 아저씨'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서울 용산에 있는 헌책집 〈뿌리서점〉이었다. 그곳을 날마다 드나드는 아저씨가 꽤 많은데, 그분들이 서로 옥신각신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서로 생각을 모두었다. 그분들이 말하는 '책집 단골'은 이렇다. ㄱ 서른 해 넘도록 드나들기 ㄴ 오천 자락 넘게 장만하기 (142쪽/2014.7.17.)
책만 읽으면 바보입니다. 책을 안 읽어도 바보입니다. 왼손에는 붓을 쥐되, 오른손에는 호미를 잡아야 어질게 살림을 짓습니다. 왼손으로는 이야기를 쓰고, 오른손으로는 아이를 안거나 기저귀를 손빨래하거나 밥을 짓거나 집안을 치워야 슬기롭게 살림을 일굽니다.
작은책집으로 책마실을 다니면서 작은이웃을 숱하게 만났고, 작은말씀을 고맙게 들었습니다. 책에 적힌 바 없는 온갖 살림이야기를 작은이웃 눈망울과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배울 수 있는 책마실을 <들꽃내음 작은책집>에 옮겨 보려고 했습니다.

▲서울 작은우리
숲노래

▲서울 뿌리서점
숲노래
책집을 놀이터로 물려주는
<들꽃내음 작은책집> 겉그림은 부산 보수동 헌책집 〈고서점〉 예전 모습입니다. 슈룹(우산)을 든 아이는 책집 아저씨 조카입니다. 2005년에 담은 그림이니, 벌써 스무 해쯤 된 지난날입니다.
하루하루 흐르면서 삶을 이루고, 이 삶을 돌보고 보듬으니 살림으로 잇고, 이 살림을 포근하게 품고 풀기에 사랑을 알아보고, 이 사랑으로 보금자리와 마을을 짓기에 숲으로 간다고 느낍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책이 100만 자락 읽혀도 아름다울 텐데, 아무런 문학상을 받은 적이 없는 알차고 야무진 책 1000가지가 해마다 1000 자락씩 팔리고 읽힌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작고 아름다운 책 2000가지가 해마다 500 자락씩 팔리고 읽혀도 몹시 사랑스럽고 아름다울 테고요.
우리 집이 숲이 되기를, 우리 집을 숲으로 가꾸기를, 우리 마음에 숲이 자라기를, 우리 눈에서 숲을 바라보는 기쁨이 샘솟기를, 조용히 꿈꾼다. 종이로 지은 책을 읽는 일이란, 어쩌면 숲을 읽는 일일 수 있다. 숲을 읽으려고 책을 손에 쥔다. 이야기로도 삶으로도 숲을 읽으려고 시골에서 보금자리를 일구며 책시렁을 짠다. (220쪽/2019.11.9.)
아무리 우람한 숲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티끌만큼 작은씨 한 톨에서 비롯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한테 물려줄 터전은 '아름누리'이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름숲을 물려받기를 바라요. 아이들이 아름바다와 아름들과 아름마을을 이어받기를 바라요. 아이들이 아름책과 아름말과 아름글을 넘겨받기를 바라고요.
아름누리를 이루려면 먼저 살림누리여야겠지요. 아름말을 물려주려면 먼저 살림말을 가꾸어야겠지요. 오늘은 서른걸음 이야기를 추스르면서 이 길을 걸으니, 곧 마흔걸음과 쉰걸음을 잇는 하루를 만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걸어 보시겠어요? 빨리 가야 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읽어야 하지 않습니다. 아이하고 손을 잡고서 마을길을 거닐면서 작은책집으로 찾아가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기에 즐겁습니다. 들꽃내음을 맡고 누리는 골목길 사이에 있는 작은책집에서 같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작은책집을 걸어서 찾아다닌 서른해를 돌아본 이야기
숲노래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최종규 (지은이),
스토리닷, 2024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새로 쓴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를 꾸린다. 《쉬운 말이 평화》《책숲마실》《이오덕 마음 읽기》《우리말 동시 사전》《겹말 꾸러미 사전》《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시골에서 도서관 하는 즐거움》《비슷한말 꾸러미 사전》《10대와 통하는 새롭게 살려낸 우리말》《숲에서 살려낸 우리말》《읽는 우리말 사전 1, 2, 3》을 썼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