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춘은 그 중요성에 비해 사람들이 정말 몰라주는 음악인이다. 김민기, 한대수, 심지어 장사익은 알아도 정태춘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열거한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태춘은 그분들과 동급 혹은 이상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정태춘은 얼마 전에 새 앨범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2002)를 내놓았다. 여기서 그는 밴드 구성을 갖추어 음악적 변화를 꾀했으나 그의 노래들은 여전히 힘이 있지만 왠지 이전만큼의 아우라는 느낄 수 없었다. 그것은 지난 앨범 '정동진/건너간다'(1998)에서도 느꼈던 아쉬움인데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대외적 여건을 생각해본다면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개혁성향 정권의 등장과 그에 따라 일어난 자연스러운 사회적 억압요소들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나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자면 지금보다 감성이 훨씬 말랑말랑할 무렵 들었던 그의 이전 음반들이 더 살갑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태춘의 인터뷰를 보면 그는 예전에 비해 무엇을 향해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불확실해졌음을 말하고 있으니 그는 지금 새로운 지향점과 문제의식을 찾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그의 음악 여정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데뷔(1978)부터 초기시절을 정리하는 베스트가 나오는 1987년까지가 그 첫 번째, 사회적 소명감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사전심의 철폐 투쟁을 시작했던 시기인 '무진 새노래'(1988), '아 대한민국'(1990), '92년 장마, 종로에서'(1993)가 그 두 번째,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아직 현역 음악인이므로 세 번째 시기에 대해 판단하기는 이른데 적어도 내 관점에서는 그의 두 번째 시기야말로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말하고 싶다.
'아 대한민국'은 그 음악적 태도에서 본다면 가요사에 있어 일대 테러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는 단번에 국내 저항 음악인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이후 대학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저항적인 활동을 하다가 여전히 존재하는 음반 사전 심의에 저항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지 않은 채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발매한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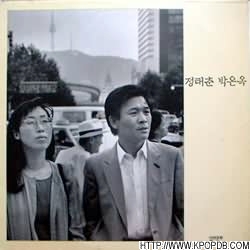
▲ 92년 장마, 종로에서(1993, 앞면) ⓒ kpopdb.com
첫 곡 '양단 몇마름'을 듣고 나는 너무 놀랐는데 이런 여성적 감성을 남자인 정태춘은 하나의 삽화처럼 간결하게 꺼내놓았기 때문이다. 72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72년은 그가 재수하면서 한참 방황하던 시기이다.
시골 새댁의 안쓰러운 정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였으니 데뷔앨범에서 그렇게 완성도 있는 곡들을 쏟아낸 것은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 동반자 박은옥에 의해 살아 있는 곡이 되었으니 이 곡은 이십년 이상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다.
'저 들에 불을 놓아'와 '비둘기의 꿈'에서 그는 점차 사회적 약자가 되어가는 농민 그리고 청소년의 비애감을 절절하게 노래한다. 역시 박은옥의 처연한 목소리로 불려져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하고 있다. 다음곡 '이 어두운 터널을 박차고'에서 정태춘은 앞으로 나아가자고 힘차게 노래하지만 그의 외침은 앞 곡들에서 노래한 절망적 현실과 병치되어 자조적으로 들린다. 그 자조적 여운은 '비둘기의 꿈' 연주곡이 흐르는 시간 내내 함께 있다가 턴테이블에서 바늘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끝난다.
a

▲ LP 뒷면 ⓒ kpopdb.com
앞면이 현실을 주관적 관점에서 노래했다면 뒷면에서 그는 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사람들'에서는 몇몇 재야인사들의 동향을 실명을 거론해가며 얘기하는데 87년 이후 점차 약해져 가는 변혁의 시대를 하나의 컷으로 잡아 이렇게 부르니 조금은 비애감이 든다.
이런 정서는 'LA 스케치'에서 묘사되는 '서울시 나성(羅城)구'의 분위기에서도, '나 살던 고향'의 일본 관광객들의 행태 묘사에서도 이어진다. 마지막 곡 '92년 장마, 종로에서'에서 그는 분명 한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희망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혁성향의 정권은 들어섰지만 아직도 '시청 앞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있으니 그의 소망대로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은게지. 2002년 여름 시청 앞에서 우리는 광장의 의미를 되찾았으니 세상은 바뀐 것일까?
어떻게 들으면 정태춘의 이 앨범은 전작 '아 대한민국'(1990)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가열찬 모습에 비해 지나친 패배주의적 정서라고 느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이 앨범에서 어떻게든 흘러가는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은 분명 관망이 아니라 애정이다.
그 현실을 노래하여 정태춘은 동시대 사람들과 공명, 공감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현실을 때로는 있는 그대로, 때로는 자조적이거나 희화화시켜가면서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노랫말과 노래하는 방식은 절묘하게 결합되어 듣는 이로 하여금 노래 속의 희망과 자존을 발견하게 만드는데 바로 그 점이 이 음반을 명반으로 만들고 있다.
이 내용과 형식(가사와 곡 구조)의 적확한 결합은 주로 뒷면에서 드러나는데 '사람들'에서 정태춘은 노래와 내레이션, 장면삽입 등을 통해 이야기처럼 곡을 끌어가고 있으며 특히 실명을 나열하여 현실감을 살리고 있다.
이런 효과는 'LA 스케치'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진다. 아무래도 그 신랄함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곡은 '나 살던 고향'일 것이다. 그는 곽재구의 시에 곡을 붙여 노래하고 있는데 뽕끼어린 엔까풍으로 노래불러 듣는 이에게 쓴웃음을 짓게 하는 동시에 아직도 일본의 그늘 속에 있는 우리를 아프게 한다.
이 앨범이 얻어낸 성취는 사회의식을 정제하여 가사에 담고 그것을 음악이라는 형식에 결합시킴에 있어서 미학적으로 어긋남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 이전과 이후의 어떤 포크, 민중가요, 펑크, 인디 음악에서도 이 정도의 완성도를 지녔던 음반은 없었다. 그는 음악인이다. 그가 아무리 저항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음악적 성취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는 음악인이라기보다는 운동가로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삶의 태도를 음악에 반영해왔으며 그 정점을 이 앨범에서 끌어내었다.
학부 다닐 때 정태춘이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다. 너무나 적은 수의 학생만이 듣고 있어서 안쓰러웠지만 정태춘은 힘 있게 노래를 했다. 나는 그에게 단 하나를 물어보고 싶어 사과쥬스를 사들고 무대 뒤로 들어서며 갈증을 느끼던 그에게 줄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음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해야만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한마디를 들어서 가슴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있기에 나는 외국의 친구들에게 한국에는 저항 포크가 있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