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을 찾아가는 길, <선운사>
정읍에서 흥덕으로 가, 흥덕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귀거래민박을 찾아간다. 깜깜하다. 동백여관이 선운사 입구라 거기에 묵을까도 생각해보지만 이화성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어서 귀거래민박으로 숙소를 정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 성함은 이화성이 아니라 이필성이었다. 곽재구 시인이 착각한 모양이라고 한다.
할머니께서 직접 차밭에서 따 말린 작설차를 마시며, 귀거래 식당 시절 할머니의 삶을 듣는다. 여러 자식이 있지만 단 한 명도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맺어졌다는 말씀이 서정주 시인의 시보다 더 울림이 크다.
우하당(又下堂)과 진흥굴
밤늦게까지 회포를 푸느라 눈이 잘 떠지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3월만 되면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가리라 별러오던 터였다. 동백이 다 져버린 후에야 오기는 했지만.
아직 사하촌은 새벽안개로 가득하다. 우리는 그 안개를 뚫고 선운사로 향한다. 복분자(覆盆子)밭과 벚나무 숲이 열을 지어선 길을 따라 오르니 일주문이 떡 하니 나타난다. 일주문을 들어서자 잔디밭이 곧게 오른 목련나무 몇그루를 안고 수줍게 퍼져있다. 산책하듯 천천히 오른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길은 보이지 않는다.
선운사로 오르는 길, 서정주 시인의 시<선운사 동구>가 송창식의 노래로 들려온다. '저기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드는데'로 내 오감을 전율케 했던 <푸르른 날>도 들려온다.
한때 서정주 시인은 '나도 저런 시를 쓰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한 사람이었다.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시인의 이러저러한 정치적 행적을 알게 되면서 한 번 좋아한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나는 문학과 그의 정치행위를 분리시켜 생각하려는 어리석은 짓까지도 했었다. 그 만큼 나는 서정주 시인의 시를 좋아했었다. 물론, 지금은 더 없이 낮은 집, 우하당(又下堂) 이라는 집에 살면서 왜 더 없이 높은 분들을 찬양했을까?
그의 그러한 행적을 납득하기 힘들지만. 한때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로 시작하는 그의 시 <자화상>을 비롯한 몇몇 시편들은 내게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보다 더 울림이 컸음을 고백한다. 나의 밤잠을 흔들어 깨웠고 때론 내 사랑의 표현을 전달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맨 처음 만난 것은 백파선사비가 있는 부도밭이다. 내소사 부도밭은 일부러 찾아 나서지 않으면 놓치기 쉽상이지만 선운사 부도밭은 자연스럽게 발길이 닿는 곳에 있다.
유홍준이 찬사를 아끼지 않은 백파 선바비는 남포오석(藍浦烏石)에 화엄종주백파대율사대기대용지비(華嚴宗主白坡大律師大機大用)라고 김정희의 추사체로 위엄 있게 씌어져 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것이 조촐한 비석 가족들 중 어른 같다.
a

▲ 백파선사비 ⓒ 이재성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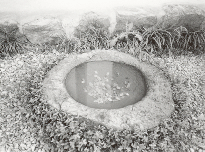
▲ 빗물고인 돌확 ⓒ 이재성
a

▲ 암각여래상 ⓒ 이재성
떨어진 나뭇잎 사이로 드러난 커다란 나무의 뿌리를 밟고 부도밭을 나와 선운사 경내로 들어섰다. 대웅전 뒤로 낮게 펼쳐졌으리라 생각했는데 동백 숲은 선운사를 둘러싸고 있다. 맑은 초록색의 반짝거리는 속살거림에 이끌려 동백 숲으로 올라가 보지만 말라버린 꽃잎 한 장 발견할 수 없다.
대웅전 앞 돌확은 빗물을 가득 담고 있다. 어디서 왔는지 하얗고 엷은 꽃잎도 몇 개 떠 있다. 내려다 보는 내 얼굴도 담아준다. 손을 담가보다. 얼굴을 찡그린다.
경내를 둘러 본 후 우리는 귀로만 듣던 물소리를 직접 보게 되는데 그 물빛이라는 것이 걷히지 않는 안개와 비에 젖은 나무의 그림자를 안고 시퍼렇게 꿈틀거리는 것이다. 솜털이 모두 빳빳이 일어서는 긴장감을 갖게 되는 그 길은 기이하고도 괴이하다.
a

▲ 선운사 가는 길 ⓒ 이재성
그 길을 빨리 빠져 나와 좀 더 걷다보면 진흥왕이 말년에 왕위를 버리고 아내 도솔과 딸 중애를 데리고 들어와 수도 생활을 했다던 진흥굴이 나온다. 죄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 이른 시간 탓인지, 흐린 날씨 탓인지 나는 또 다시 섬뜩해진다. 그 버리기 힘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버리고 백제의 산 속에 불자로 돌아온 신라의 왕 이야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진흥굴을 지나 우리가 칠송대암각여래상에 도착할 무렵에 햇살이 내리기 시작한다. 유월에 그 고운 햇살은 칠송대암각여래상 이마위로 쏟아져 내린다. 그 섬뜩한 귀기가 확 사라지는 순간이다. 40미터가 넘는 깍아 지른 암벽에 거의 입체감이 느껴지지않을 정도로 얕게 조각된 여래상은 투박하면서도 아주 씩씩해 보인다.이 여래상에는 동학운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배꼽 부위에 감실이 있는데, 그 속에 신기한 비결(秘潔)이 들어 있어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 한양이 망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널리 퍼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지만 거기에 벼락살이 들어 있다고 하여 감히 열어 볼 엄두를 내지 못하며 세월만 흘렀다.
1820년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가 마애불의 서랍을 열었다가 갑자기 벼락이 치는 바람에 '이서구가 열어보다'라는 대목만 얼핏 보고 도로 넣었다고 한다. 그후 1892년 동학운동이 일어나기전 손화중(孫和中)이 서랍을 열어본다. 그러나 비결은 손화중이 어디론가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다. 단지 그 비결책이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였다는 소문과 그냥 평범한 불경이었을 것이란 추측만 전할뿐이다.
옆으로 난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 도솔암에 이르렀다. 칠송대암각여래상의 뒤통수를 마주본다. 햇살이 따뜻하다. 잠깐 생각에 잠겨본다.
선운사, 이 절은 걷는 내내 물음표를 만들어 내는 절이다. 그 버리기 힘든 권력을 버리고 백제의 땅에 불자로 들어와 살았다는 신라 진흥왕 이야기가 그렇고, 백제에 땅에 태어나 <신라초>를 쓴 시인이 시에서 모든 것을 얻고도 정치적인 권력을 꿈꾸었다는 것이 그렇다. 그리고 꽃과 잎이 나뉘어 핀다는 석산화를 보는 가슴 또한 무심할 수가 없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