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대산문화재단
우리는 너무 바쁘게만 달려왔다. 앞을 보기 바빠 뒤는커녕 옆을 돌아볼 새도 없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빨리 달려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이자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요령이었다.
그래서일까? 주어진 현상만을 좆아온 것은. 이 땅에 자본주의의 그릇된 면들이 오히려 순기능들을 몰아내고, 거짓 민주주의가 참 민주주의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려도 우리는 짐짓 무관심했다. 그것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우리네 일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상의 근본이 되는 사회 저변의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서는 이는 그저 돈키호테로 여겨지기 십상이었다. 한낱 피 끓는 젊은이들이나 매달리는 철없는 짓에 지나지 않다고 여겼다. 심지어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어려운 말까지 끌어다 대며 ‘먼저 네 앞가림이나 잘 하라’며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그 따뜻한 당부와 무관심의 결과는 어떠한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합당한 의견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소수는 다수에 밀리기 일쑤고, 약자는 강자에 무시당하는 것이 다반사다.
나아가 ‘수신제가’ 먼저 하고 ‘치국평천하’는 나중에 하라던 이의 대표격의 인물은 수중에 30만원도 채 안 가지고 있다며 정의와 법을 우롱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잠깐 흥분하는 듯하더니 하루를 사는 것이 바빴는지 이내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 버렸다.
또 작년 한 해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 광화문 일대를 온기 어린 촛불로 물들이던 이들도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 그토록 열렬히 주장하던 한미행정협정, 이른바 소파 개정도 요원한 상황이다. 변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나선다? 비겁한 자는 그저 말이나 할 뿐이다.
장길산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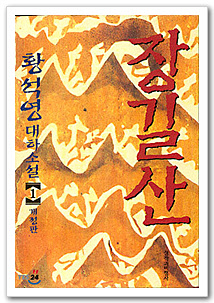
▲황석영 / 장길산 / 창작과비평사 / 1995창작과비평사
황석영을 처음 만난 것은 <손님>을 통해서였다. 일년의 5분의 3 이상을 야전에서 생활하던 전투병이었던 탓에 훈련이 지루할 정도로 길고 또 많았는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책을 몇 권씩 들고 나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중 한 권이 황석영의 <손님>이었던 것. 그랬던 황석영을 근 일 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번에는 그의 역작 <장길산>을 통해서.
지금은 북한의 장거리 포가 몰려 있다는 장산곶. 그러나 한때 그곳에는 바다 사람들과 함께 매 한 마리가 살고 있었으니, 바로 장산곶 매. <장길산>의 첫머리를 이루고 있는 장산곶 매는 곧 이 책의 전부를 아우르는 동시에 장길산의 삶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장길산은 17세기 조선의 봉건적 질곡과 해소하기 힘들 정도로 꼬이고 꼬인 사회•경제적 모순을 깨뜨리려 사회 체제에 도전했던 존재로, 홍길동과 임꺽정이라는 의적의 시대적 간극을 잇고 있는 인물이다.
장길산은 너무 공고한 나머지 어지간한 힘으로는 깨뜨리기 힘든 ‘사회 질서’에 대항했고, 집단을 조직하고 아우르며 이끌 수 있는 조직력과 포용력을 지녔던 동시에 실질적 무력 수단 역시 갖고 있었다.
이런 장길산을 간혹 돈키호테와 비교하는 이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난센스다. 실제로 장길산의 경우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숙종 18년(1692년) 12월 13일자를 비롯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에도 나오듯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로서, 이른바 당시 시대가 강요하던 신분에 따른 극단적인 차별과 인간이기 이전에 짐승처럼 일하고 유린당해야 했던 현실을 고쳐보자고 나선 도전자이자 승리자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길산 개인과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를 살아갔던 대다수의 사람들, 이른바 ‘상놈’과 ‘천한 것들’의 삶이 도대체 어떠했기에 직접 장길산이라는 개인이 나설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떠한 연유로 최종적으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일 것이다.

▲그들은 왜 천불천탑을 세웠을까.운주사
늦기 전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소설 <장길산>의 종착지인 전라남도 화순에 가고 싶다. 운주사(雲住寺)에 가고 싶고, 천불천탑(千佛千塔)을 보고 싶다. 과연 장길산과 그의 동지들은 무엇을 위해 천 개의 불상을 쪼았고 또 천 개의 석탑을 세우려 했을까.
과연 운주사가 말하고 있는 미륵이란 무엇을 이름이며, 장길산은 결국 미륵을 의미했던 것일까.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 장길산과 운주사가 갖는 그 매력에 이끌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저 마음 푹 놓고 감상에 젖은 채로라도 느껴보고 싶다. 비 안개 자욱한 운주사, 그리고 장길산을 말이다.
장길산 2
황석영 지음,
창비, 2004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우리들 기억 저편에 존재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찾아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저서로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알마, 2008), <다시, 서울을 걷다>(알마, 2012), <권기봉의 도시산책>(알마, 2015) 등이 있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