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라는 짧은 제목이 붙어있는 나의 습작시입니다. 타자로 쳐서 그것을 다시 붙여 놓은 것은 당시에는 그저 재미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좋은 추억이고 독특한 멋도 있습니다.박성필
하나하나 넘기며 셈을 해 보니 모두 51편이나 됩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고등학교 시절과 갓 대학을 입학했을 때 썼던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비록 '시'라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작품들이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시절 내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또 왜 그렇게 아픈 사랑을 했었는지….
사실 '시'에 대한 나의 애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니 위험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입한한 대학에서는 의학 계열의 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공과는 거리가 먼 '시'를 쓰는 '낭만파'에 가까웠습니다. 덕분에 학과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팸플릿에는 내가 쓴 '축시'들이 가장 앞머리에 자리 잡곤 했습니다. 그 시절까지 시를 쓰는 것은 그저 멋진 풍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 쓰기가 풍류였는지 집착이었는지 전공을 바꿔 지금은 국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다른 문학 장르보다 '시'에 관심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에 대한 조금씩 알게 되면 그만큼 시를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만 갔고 손에서 만들어진 언어들은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그런 두려움 때문일까. 시를 써 본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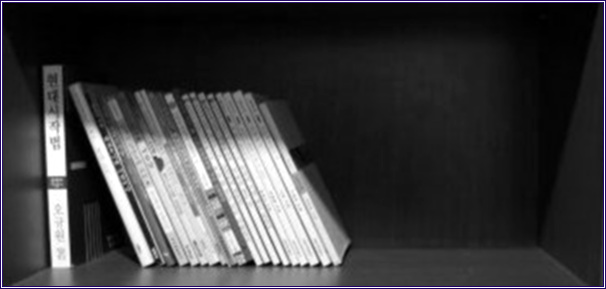
▲책꽂이를 정리하면서 좋아하는 시집들을 위해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맨 왼편에는 시를 공부할 때 바이블처럼 여겼던 책이 눈에 띕니다.박성필
시에 소박한 감정을 토로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한 편, 기교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시 쓰는 방법'에 관한 책들에 지나치게 매달려 왔던 것이 오히려 시쓰기에 방해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책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좋은 시가 무엇인지 깨우치지 못한 내 어리석음이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요즈음 일주일에 한두 번 서점에 들르곤 합니다. '현대시 모음'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서점의 한 코너가 서점을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몇 권의 새로운 시집들이 그 코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점을 갔을 때 새로 출간된 시집이 자리를 잡은 것을 보며 마치 내 책인 것처럼 흐뭇한 미소도 지어봅니다.
애타게 시인을 꿈꾸던 그 시절의 습작시들에서 많은 꿈과 용기들을 얻고 그것은 가만히 책꽂이 한 구석에 꽂아두었습니다. 이제 겸허한 시 한 편을 기다려 볼까 합니다. 올해에는 그런 시를 한 편 꼭 쓰고 싶습니다. 그 시절이나 오늘이나 기도는 같습니다.
'제게 겸허한 시 한 편을 주소서!'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