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운이 좋으면 바다 한가운데서 멀리 가물거리는 섬들사이로 지는 낙조를 감상할수도 있다 ⓒ 정윤섭
남해의 진섬 보길도를 찾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장 먼저 '윤선도 유적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고산이 이곳 보길도에서 유배생활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시대에 서남해의 섬들이 유배지로 이용되었으니 이러한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고산에게 있어서 보길도는 세상(속세)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경영한 공간이다.
어떤 사람은 고산이 보길도에 자신만의 유희적 생활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그 속에는 풍수사상(자연사상)과 성리학(유학자)적 생활을 추구한 사대부 고산의 생활철학이 들어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고산이 경영한 자연을 원림(園林)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다.
@BRI@그의 문학과 음악을 아우르는 예술적 기질로 인해 때론 고산의 생활이 음풍농월적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황과 양반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그 생산적 가치를 재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
보길도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보길도 부용동의 여기저기에 고산이 남긴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 보길도에선 고산의 유거지가 복원되어 가고 있고 그가 명명한 지명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보길도의 모습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길도지(甫吉島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보길도지>는 고산의 5대손인 윤위(尹위)가 고산문학의 산실인 보길도를 찾아 그곳의 조경과 풍경을 소상하게 밝힌 기행문이다. 고산의 5대손인 윤위(1725~1756)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여년 전 보길도를 답사하고 고산 유적의 배치와 구조, 그때까지 전해 내려오던 고산의 생활상을 낱낱이 기록하였는데, 고산이 손수 지었다는 낙서재(樂書齋)를 비롯해 고산과 얽힌 일화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보길도는 고산이 죽고 난 후 고산의 서손인 학관(學官)이 살면서 연못을 낙서재의 난간 아래 좌우에 옮겨 파고 화계(花階)를 쌓아 온갖 꽃을 줄지어 심고 기암괴석으로 꾸미기도 하였다. 또 학관의 아들 이관(爾寬)이 오량각(五梁閣)을 사치스럽게 지었다는 이야기도 나와 고산 이후 주변이 본래보다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때까지는 부용동에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a

▲ 세연정은 연못의 중심에 들어선 정원문화의 걸작이다 ⓒ 정윤섭
그런데 이관이 옛 터를 헐고 넓힐 때에 꿈에 백발노인이 나와 '날으는 용의 왼쪽 뿔을 깎아버렸으니 자손은 장차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지만 이관은 이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 때문인지 이관은 집을 지으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건물도 팔아버리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풍수사상이 담긴 작자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산 사후 이곳 보길도를 찾은 사람은 고산의 5대손인 윤위로 그가 보길도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는데 <보길도지>에서는 학관의 사위가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한다.
윤위는 이곳 보길도에서 부용동을 지키며 살고 있는 학관의 사위인 이동숙(李東淑)을 만난다. 윤위는 일가(친척)인 학관의 아들 청계(淸溪)와 함께 보길도를 찾는데 그로부터 보길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그런데 보길도 답사 후 일가 노인(청계)도 몇 개월 후 죽고 이동숙도 보길도를 떠나 육지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여 이때부터 부용동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은 곳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옛 영화를 간직한 전설 속 고립무원의 섬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윤위는 이곳에서 학관의 아들 청계(淸溪)로부터 선조(고산)가 남긴 발자취를 하나하나 알게 되는데, 윤위는 "옛날에 들은 말을 나를 위해 들려주고 또 선고(先考)께서 추모하던 성의와 수호하던 노고에 대해 들려줄 때 나는 전성시절에 와보지 못하고 나이 들어 황폐한 폐허만을 찾게 된 것을 슬퍼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같은 감회를 엮어 만든 것이 <보길도지>라고 할 수 있다.
고산이 보길도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병자호란의 와중에서 고산은 집안의 가솔들을 이끌고 남한산성에서 분전혈투하고 있는 인조를 돕기 위해 나서지만 인조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래서 오랑캐 나라인 청에 항복한 굴욕을 대신하여 신하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고산이 제주도를 향하여 가던 중 발견한 섬이 보길도라는 것이다.
a

▲ 돌을 이용해 보를 만들고 수위를 조절하는 과학성이 엿보인다 ⓒ 정윤섭
우연이든 인연이든 보길도라는 자연(섬)이 고산이라는 임자(주인)를 만나 자연과 인간의 결합(조화)이 이루어진 것이다. 고산의 문학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그의 대표적인 자연 경영지인 보길도 부용동이나 금쇄동은 '자연과의 일치'를 꿈꾸는 그의 사상을 읽을 수 있다. 풍수사상이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자연의 이치(모습, 형국)속에 사람의 거처를 정하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 순응형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보길도 부용동은 고산이 처음 보길도를 둘러보고 '물외(物外)의 가경(佳境)이요 선경(仙境)'이라고 찬탄하며 부용동(芙蓉洞)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러한 자연이 있기에 고산의 자연경영이 가능한 것이지 천혜의 자연이 없었다면 고산이 아무리 자연을 경영하려 해도 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보길도지>를 보면 지리지나 문학작품을 생각하게 할 만큼 뛰어난 인문지리적 묘사나 문학적 서술능력을 느낄 수 있다. 고산의 후손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주위가 60리인 보길도는 영암군(현재 완도군)에 속하는 섬으로 해남에서는 수로로 70리 거리이다."
보길도지의 첫 장을 보면 지리지의 개념이 잘 나타나 보길도 주변의 섬과 거리 위치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풍수지리 사상에 기초한 관념이 잘 나타나 있음도 알 수 있다.
"격자봉에서 세 번 꺾어져 정북향으로 혈전(穴田)이 떨어졌는데 이곳이 낙서재(樂書齋)의 양지 바른 터가 되는 곳이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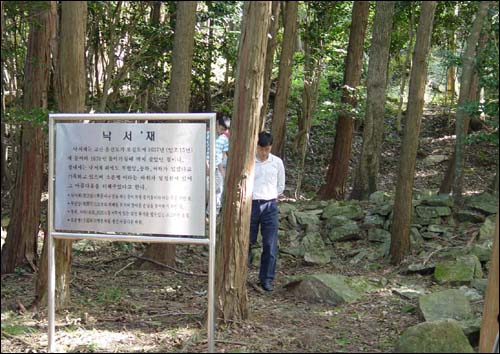
▲ 낙서재는 고산이 중심거처지로 삼은 곳이다 ⓒ 정윤섭
a

▲ 동천석실에서 내려다 보면 멀리 주산인 격아봉 아래 낙서재와 무민당, 조산등이 한눈에 보인다. ⓒ 정윤섭
낙서재는 고산이 기거했던 주 거처지로 가장 중요한 혈전에 낙서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 낙서재를 뒤로 하고 있는 격자봉은 보길도의 주산이라고 할 수 있다. 격자봉은 보길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낙서재를 뒤에서 받치고 있다.
보길도지를 보면 이 격자봉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낭음계(朗吟溪), 미전(薇田), 세연정(洗然亭), 옥소대(玉蕭臺)등의 지명에 대한 위치와 자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고산이 '금쇄동기'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여 각각의 바위나 지역에 명명한 것과 같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어찌 보면 고산이 이러한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연과의 일치를 꿈꾸고 자연과의 일치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낙서재(樂書齋), 무민당(無憫堂), 소은병(小隱屛), 승룡대(昇龍臺), 곡수당(曲水堂), 낭음계(郎吟溪), 하한대(夏寒臺), 혁희대(赫羲臺)…'
고산이 정말로 이곳 보길도에서 자연을 경영하며 자연 속에서 꿈꾸었던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각자의 위치와 심리상태에 따라 자유로운 상상력이 뒤따른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합일이 느껴진다면 보길도에서 만난 수백 년 전의 고산(孤山)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5백년 녹우당의 역사를 더듬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