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6초의 시간을 세어보자. 1…… 2…… 3…… 4…… 5…… 6…….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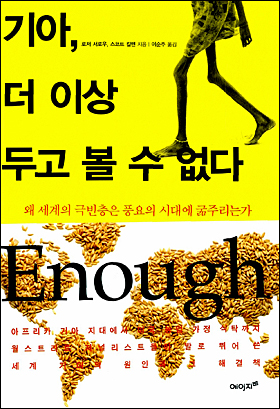
▲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표지 ⓒ 에이지21
▲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표지
| ⓒ 에이지21 |
|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짧은 그 시간에, 빠르면 두세 번 숨을 내쉬었을 그 시간에 한 명의 아이가 기아로 죽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절반은,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전쟁도 자연재해도 에이즈도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도 아닌, 배고픔 때문에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를 읽다가 올해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렸다. 이 책의 영향 때문인지 사회 곳곳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한동안은 일간지 곳곳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칼럼도 많이 보이기도 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우리 사회에 정의열풍이 불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것이 진실이었는지 과장이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인용해 말을 하든, 직접 묻든, 하다못해 그 책의 제목을 읽든 간에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책 제목이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녹색혁명
1940년대, 몇몇 사람들이 멕시코로 떠난다. 멕시코의 기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중에는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노먼 볼로그도 있었다. 멕시코에 간 노먼 볼로그는 식량이 부족한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다가 어렵게 그 해결책을 찾아냈다. 열정적인 왕복 교배 끝에 신품종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멕시코에 끼친 영향은 엄청났다. 1950년대 중반을 기해 멕시코로 하여금 밀 부족 현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것이다.
노먼 볼로그의 이 같은 노력은 아시아에서도 성공을 거둔다. 인도의 밀 수확이 4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가 하면 파키스탄에서는 기아가 종적을 감추기도 했다. 노먼 볼로그의 밀은 터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으로 퍼져갔고 그에 따라 '녹색혁명'이 일어났다.
이때만 해도 "기근은 곧 역사책에나 나오는 옛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지금 우리는, 기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녹색혁명이 일어난 그 시절과 현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녹색혁명이 위기에 처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공격에서 비롯된다. 녹색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강대국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하며 "구조 조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독재자들이 살기등등한 아프리카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할 수 있을까? 구조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기능을 민간 기업으로 넘기게 한 건 어떨까? 아프리카에서 곡물 구매, 수송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 얼마나 될까? 이것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뜻이었다.
식량 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농락한 강대국
동시에 미국과 유럽은 자국 농민들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불공평한 일이었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갔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녹색혁명은 후퇴했다. 강대국들은 식량을 갖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농락했다. 아프리카의 농민이 수확한 것에는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질 좋고 값이 싼 자국의 농산물로 맞서 무너뜨렸다.
'비교 우위'라는 논리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값 싼 농산물을 수입하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물론, 그에 대한 대가는 치명적이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쉽게 저항하지 못했다. 악순환이 반복됐고 그 사이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비극적인 사실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갈 때, 선진국에서는 "식량을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옳은 것일까?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럴 때마다 '정의'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때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존재하는 걸까?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실제적으로 효과를 봤던 대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식량 원조라는 명목으로 일회성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 영세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를 만드는 것 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합리적으로 농업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 책은 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참여한다"는 것을.
강대국들의 행패, 일반시민들이 막을 수 있다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다. 담배 한 갑 살 돈으로 그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기부하거나 강대국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선거 등으로 그것을 반대하자는 것이다.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까? 어느 나라든, 설사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일지라도 그것을 막아내는 건 일반 시민들이다.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식량 원조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기반을 파탄 내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건 시민들인 것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가뜩이나 요즘 같은 때, 식량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라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
이 책을 보며 '정의'라는 단어보다 '기아'라는 단어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6초의 시간을 세어본 후, 그 사이 한 명의 아이가 기아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한 후, 다시 물어보자. 정의란 무엇인가.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가 그것에 대한 정답 중 하나를 제시한다. 간절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 2010.10.12 09:45 |
ⓒ 2010 OhmyNews |
|
기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왜 세계의 극빈층은 풍요의 시대에 굶주리는가
로저 서로우 & 스코트 킬맨 지음, 이순주 옮김,
에이지21, 2010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