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강에서 뛰어 노는 북한 어린이들.
조천현
(이전 기사
"대북전단 날릴 때마다 조용히 사는 탈북자는 불안, 왜냐면"에서 이어집니다)
책 <탈북자>의 조천현 작가가 처음 탈북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건 1997년 'KBS 일요스페셜 - 지금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제작을 위해 탈북자를 취재하면서부터다. 북중 접경지대에 두 달여간 머물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취재했다.
하루는 압록강 강가에 북한 주민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한 선배는 배가 고파 움직일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달리 보였다. 강에서 햇빛을 쬐며 쉬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그는 '북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조 작가는 압록·두만강 변의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국경의 사람들'이라는 한 주제를 다큐멘터리, 사진, 글로 변주해가며 표현했다. 그가 처음 주목한 이들은 중국에 정착하고자 했던 탈북자와 북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탈북자였다. 한국행을 택하는 탈북자를 돕는 사람은 많지만, 그 외의 길을 선택한 탈북자들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자 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압록·두만강 변을 찾았다. 짧게는 10일 길게는 석 달씩 머무르며 북한 사람들이나 탈북자를 관찰했다. 취재 원칙은 세 부류의 탈북자를 균형 있게 만나 보는 것.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세 부류로 나눠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노력했다. 진보와 보수,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탈북자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나름의 기준이었다.
취재 현장은 종종 불안했다. 중국 공안의 단속에 걸려 테이프를 뺏기면 취재에 응한 탈북자들의 신상이 위험해졌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였다. 불안감은 여정 내내 그와 동반했다.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온전하게 촬영본을 숨기고 지켜야 한다는 강박 관념은 지금도 여전하다. 불안함은 늘 존재했지만 견디며 일했다. 혼자 취재를 다니면서도 무섭지는 않았다. 그의 취재 현장인 동북3성과,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중국말 잘 몰라요. 모르니까 용감하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나 탈북자를 만나면 대화가 통하잖아요. 단절돼 있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람 사는 모습, 사람들이 평화롭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묘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 북한이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취재할 때 제가 정말 무서워 해야 하는 건 중국 공안이나 변방 부대예요. 날 단속하는 건 중국 공안이거든요."
중국 공안에 잡혀 3년 동안 입국을 정지당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취재 현장으로 향한다. 가는 길은 매번 비슷하지만, 매번 달라지는 소소한 변화에 재미를 느낀다. 그는 "좋아하니까 하지 않겠냐"라며 "남북이 하나가 되어도 국경 사람들의 삶을 계속 기록하겠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체제나 정권에 대해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들이 평양 내부의 일을 모두 알 수 없을 뿐더러 정치 체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취재도 아니다. 그가 묻는 것은 강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모습이다.

▲양강도 마을 여인 한 명이 압록강에서 빨래를 머리에 이고 가는 모습
조천현
"내 눈에 보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하죠. 어떤 상황을 일반화하고 고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변한 걸 찍죠. 집이라든가 사람들 옷이라든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작은 변화를 찍는 거죠."
그는 특정한 그림을 정해두고 취재 길에 오르면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모험심을 가지고 현장에 부딪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면 몸을 사리게 돼요. 그러면 취재는 어려워지죠."
취재를 나가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는 여러 다양성을 '준비'라는 과정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여 년 간의 취재, 그 기록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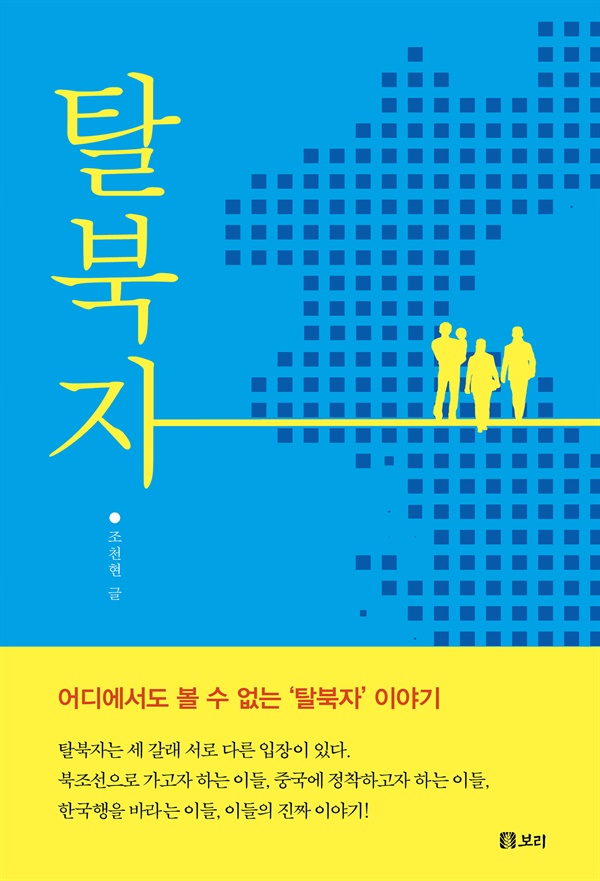
▲올해 조천현 작가가 출간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탈북자'(보리출판사).
보리
올해 1월 출간된 책 <탈북자>는 조 작가가 취재한 현장 기록을 모은 책이다. 그는 다큐멘터리 PD가 강변에서 만난 이야기를 진솔하게 엮어낸 책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중 국경 지대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보길 원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라 설명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그는 "탈북자들을 이념을 문제로 바라보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책이 탈북자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그들을 만나 왔지만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때 당시 현장의 기록으로 봐주길 바란다." -17쪽, <탈북자>
8월 출간 예정인 또 다른 책은 탈북자가 아닌 국경의 사람들을 다룬다. 국경 지역에서 만난 조선족 할머니, 할아버지,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나와 장사하는 사람들, 고려인,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등을 통해 국경의 또 다른 삶을 보여줄 예정이다. 압록·두만강 변에서 살아온 조선족 어르신들은 역사를 고스란히 살아낸 사람들이다. 조 작가는 이들을 비롯하여 국경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를 찬찬히 담아갈 것이라 이야기했다.
"언젠가 남북이 하나가 되더라도 압록강 두만강은 국경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양국의 사람들은 계속 강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풍경과 함께 북한의 변화하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는 2022년엔 국경의 삶을 담은 두 편의 독립영화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미 제작을 끝낸 <간도 아리랑>과 현재 제작 중인 <압록강 뗏목꾼의 노래>다. 조천현 작가는 <간도 아리랑>을 자신이 만난 이야기 중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으로 꼽았다.
▲내년 공개 예정인 <간도 아리랑> 장면 일부. 리화수 할아버지는 먼저 떠난 김영실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
조천현제공
딸과 함께 탈북한 할머니는 인신매매범에게 팔려 간 딸을 찾아다니며 6~7년을 떠돌았다. 그러다 한 조선족 할아버지를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산나물을 캔 돈을 모아 북에 있는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다시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나온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살아갔다.
어느 날 할머니는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다른 탈북자 할머니 집에 숨어 있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만 남았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품은 채 계속 살아간다.
다른 주제를 다뤄볼 생각은 없냐는 물음에 그는 "이제껏 해온 일인 만큼 끝까지 한 주제를 다뤄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하나는 "그들의 삶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사명감이 있냐는 물음에 그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 뿐이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명감이 뭔지도 모른다"는 답을 들려줬다.
오랜 시간 그의 인생과 마음은 북중 국경지대를 향했다. 20여 년의 고단함을 견디며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의 열정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국경 사람들에게서 옛 시골에 살던 추억과 기억을 발견한다는 그는 국경의 '사람 사는 모습'에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다.
조천현 작가는 정치적인 시각을 벗어나 탈북자들의 삶을 온전히 기록한다. 백 년쯤 후 북중 국경지대의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면, 그의 기록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탈북자 취재 20년' 그의 원칙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