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강원도 정선 덕송리. 그 시절 오토바이 ⓒ 느릿느릿 박철
강원도 정선에서의 첫 목회시절이었다. 나와 아내는 ‘덕송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동네 전체가 24가구였다. 교회 마당에 나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때가 신혼 초이기도 했고, 아내와 나는 소꿉장난 하듯이 지냈다. 가난하다는 것이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
교인이래야 어른 8명, 어린이와 학생들이 스무명 쯤 되었다. 아내는 들로 나물 뜯으러 가면 나는 산으로 고사리 꺾으러 다녔다. 살만했다. 아내는 오랜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가난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삶의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였다.
돈을 쓸 일이 없었다. 정선 읍내에 나가면 어쩌다 책을 사는 일 말고는 돈이 필요 없었다. 내가 살던 덕송리에서 정선읍내까지 걸어 나오는데 꼬박 한 시간이 걸렸다. 한 주에 한번 토요일 외출을 하는데 주보를 복사하기 위해서였다. 늘 걸어 다녔다. 서울에서 매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모처럼 걸어 다니니 그렇게 홀가분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
호젓한 산길을 휘파람을 불으며 걷는다. 길 아래에는 시퍼런 조양강이 흐르고 길 위로는 높은 산이 치솟아 있다. 한참 걷다가 목이 마르면 바위틈에서 나오는 샘물에 목을 축이면 된다. 또 어느 때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도 한다. 동네 사람들에게 일년에 두 번 녹을 받고 뱃사공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술을 좋아해서 그 양반이 술을 자시는 날은 걸어 다니고 술을 안 자시는 날은 배를 타고 건넜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교회에 유일하게 청년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집엘 가봤더니 자전거가 두 대가 있지 않은가? 하나는 신사용 자전거이고, 하나는 짐 자전거였다. 옛날 쌀집에서 쌀 배달할 때 사용하던 자전거이다. 그 청년은 신사용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짐 자전거는 헛간에 늘 세워두고 있었다.
교회에 부임해 간지 몇 달 안 되었는데, ‘그 자전거 안타면 좀 빌려 달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다. 좀 친해진 다음에 빌려달라고 해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그 짐 자전거를 끌고 오는 게 아닌가? 자전거를 끌고 와서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전도사님예, 저는 자전거가 두 대인데, 이 자전거는 커서 제가 타기가 힘들어요. 작년 농협에서 상으로 받은 건데 얼마타지 않고 헛간에 세워놓기만 했어요. 전도사님이 키가 크시니까 타시면 좋을 것 같아 갔고 왔어요.”
내가 한 마디 말도 안했는데, 내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닌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정선읍내엘 나가는데 얼마나 신이 나던지! 아내를 자전거 꽁무니 짐받이에 태우고 내처 달렸다. 자전거 짐받이가 쌀가마를 실을 수 있도록 크게 되어 있어 여자가 가랑이를 벌리고 타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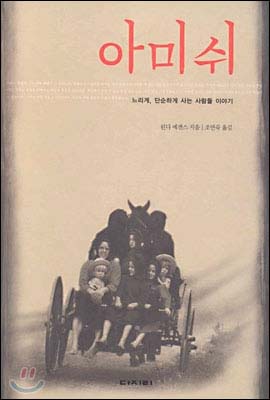
▲린다 에겐스. 아미쉬. 조연숙역. 다지리. 단순한 삶- 그러나 깊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볼만한 책이다. ⓒ yes24.com
그래서 아내가 선 채로 손잡이를 잡으면 마치 운동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돌아와 ‘카 퍼레이드’하는 것처럼, 정선읍내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고 다녔다. 얼마나 낭만적인가? 얼마 전만 해도 걸어 다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 읍내에 가기도 수월했고, 또 자전거 덕분에 이틀에 한번 꼴로 나갔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내게 자전거를 선물한 청년이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 50cc 자그만한 오토바이였다. 한 번 타보자고, 초등학교 분교운동장에서 가서 타 보았는데 이건 완전 딴 세상이었다.
내가 모터가 달린 기계는 그때 처음으로 운전해 본 것이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리한가? 그 때부터 오토바이 병에 걸렸다. 병치고는 중병이었다. ‘어떻게 하면 오토바이를 살까?’ 맨 날 그 궁리였다. 정선읍내에 나오면, 길옆에 누가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보기만 해도 무조건 올라타서 시동도 걸리지 않았는데 엑셀레이터를 당겨 본다.
오토바이 상회마다 다니면서 오토바이 중고 시세를 물어 보았다. 수중에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오토바이를 어떻게 하든지 살 궁리를 하자 아내는 내가 오토바이 사는 날, 그 날이 곧 우리 두 사람 이혼하는 날이라고 강력 반대를 하고 나섰다. 아내와 나는 오토바이 문제로 두어 달 동안 격렬하게 싸웠다.
아내는 오토바이를 타면 며칠 안으로 자기가 과부되는 줄 알고 있었다. 과부되기는 싫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아내와 티격태격하고 있었는데 장인 장모께서 오셨다. 정선읍내에서 택시를 대절해서 타고 오셨는데 그 때 돈으로 택시비가 5천원이었다.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는 걸 실감하시고,
“박 서방 오토바이 산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젊은 사람이 오죽 답답하겠냐? 오토바이 사서 살살 타고 다니라고 해라.”
장인어른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중고 오토바이를 결국은 구입하고 말았다. 죽으면 죽었지 오토바이를 안 타겠다고 장담했던 아내도 사흘째 되는 날부터 못 이기는 척하며 오토바이 꽁무니에 탔다.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 40km까지 약수 물을 길러 다녔다. 동네 물도 좋은데….
그 때가 30대 초반이니 피가 끓던 시절이었다. 내 앞에 어떤 차가 지나가도 반드시 추월했다. 강원도 길은 10미터가 똑바른 길이 없을 정도로 구불구불 했다. 그런 길을 뒤에 아내를 태우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코너웍'을 하며 질주했다. 간이 조금 부었던 시절이었다.
어쩌다 오토바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자전거를 타고 읍내를 나가던지 걸어서 나가던지 하면 그렇게 힘들고 귀찮을 수가 없었다. 강원도 정선에서의 4년 생활을 접고 경기도 남양으로 이사 와서도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오토바이를 십년 넘게 타고 다닌 셈이다. 그런데 보아하니 동료목사들이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나 밖에 없지 않은가?
무슨 회의가 있어 신사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데, 후배 목사가 승용차를 타고 비포장 길을 흙먼지를 날리며 내 옆을 보란 듯이 추월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 때가 삼십대 후반이었다. 자존심이 약간 상하기도 했다. 그래도 나이 사십 이전에는 절대로 자가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내 자신과 약속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속을 끓이며 결국은 약속을 지켰다. 사십이 넘어서 운전을 배웠고 교회에서 승합차를 구입했다.
가까운 교인 집에 가던지, 마을 회관을 가던지 자동차를 타고 간다. 시장에 볼일을 모아서 갖고 나가면 되는데 생각날 적마다 나간다. 걸어 다녀도 될 때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오염물질을 양산했다. 지구를 오염시키는데 한 몫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사람이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소위 ‘편리’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나 자신이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다.
나는 이제 내 자신과 또 다른 약속을 하려고 한다. 가급적 자동차를 멀리하고자 한다. 가까운 데는 걸어서 다니겠다. 그것이 지천명의 진입을 앞두고 시방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조금 느리고 헐겁게 살자. 그게 나이 값인지 모르겠다. 오늘 장자의 (外天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내가 스승에게 들은 것이지만 기계라는 것은 반드시 기계로서의 기능이 있게 마련이다. 기계의 기능이 있는 한 반드시 효율을 생각하게 되고, 효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본성을 보전할 수 없게 된다. 본성을 보전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이 자리를 잃고 생명이 자리를 잃으면 도가 깃들지 못하는 법이다. 내가 (기계를)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이 여겨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