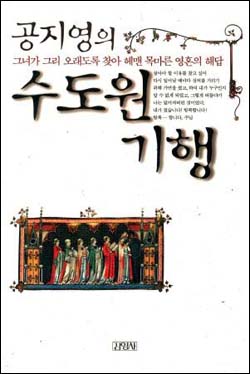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 김영사
솔직히 나는 이 책을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았다. 주변에서 이 책이 참 좋다고 많이 권했건만 그녀의 과거 서적들을 떠올릴 때에 느껴지던 괜한 실망감. 그 거부 반응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좋은 책과의 인연은 어떻게든 생기게 마련이다. 며칠 전 옆자리 동료가 두 권의 책을 주며 읽어보라고 권하는데 이 책이 끼어 있는 게 아닌가. 그 순간 '아, 이 책은 괜찮아요. 별로 읽고 싶지 않은데…'라고 약한 거부를 보였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한번 읽어보라고 강권한다.
내가 과거의 공지영 책에 대한 막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된 것은 그녀의 소설을 모두 섭렵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난 후였다. 처음 만나게 된 공지영의 장편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와 단편집 <인간에 대한 예의>만 하더라도 괜찮았다.
'운동권에 대한 회상'이라는 혹평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학번으로서 과거 선배들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소설은 그렇게 80년대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독자의 마음을 울렸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가 펴낸 소설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등어>는 나로 하여금 그녀에 대한 실망감을 확실하게 얻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말았다.
치열하게 살아온 80년대에 대한 지나친 감상주의, 그리고 그 때의 자신에 대한 후회가 가득 담긴 그 세 권의 책들은 왠지 모르게 그녀에 대한 평가를 다시금 내리도록 했다. '알량한 글솜씨'로 '운동권 이야기'를 팔아먹고 있지 않나 하는 회의. 그녀의 소설들을 읽으며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글로부터 멀어져갔고 그녀 또한 이혼과 재혼, 출산의 과정 속에 작품 활동을 중단하였다. 그런 공지영의 작품이니, 이 책 또한 '뻔한' 이야기나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지 않을 수 없었다.
2001년에 출간되어 꽤 많은 인기를 모은 이 책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은 '공지영'이라는 이름만으로 내 머리 속에서 그렇게 무시된 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며 그전과 달라진 성숙된 그녀의 목소리에 가만가만 동화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만큼 그녀는 달라졌다.
시련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는가. 이혼과 재혼,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녀는 많은 시련을 겪었음이 틀림없다. 이 책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 그녀가 가톨릭 신자로 거듭나면서 얻게 된 단상들을 부드러운 말투로 전달한다.
"그 전화를 받던 날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더운 여름이 가고 서늘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던 초가을이었다. 나는 그 무렵, 방학을 한 아이들과의 씨름에 지쳐 있었다. 정신없이 뛰어온 내 생은 사소한 일상에도 멀미를 일으키고 있었고 진심을 말하자면 나는, 몰라, 나는 모르겠다구, 하며 쉬고 싶었다."
일상에 지친 그녀에게 우연히 찾아온 수도원 기행은 망설임 끝에 결정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힘든 삶으로부터 도망치듯이 가방을 싸고 무턱대고 떠난 이 여행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
"수도원 기행의 첫 장소, 처음 만난 수녀님의 얼굴은 봉쇄 수도원의 음울한 창살을 연상하고 있던 내게는 놀라웠다. 그러니까 그 수녀님의 얼굴을 뭐랄까, 좋아서 죽겠는, 그런 얼굴이었던 것이다. 예상이 빗나간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바깥으로 나갈 수도, 외부인이 들어갈 수도 없는 철창 속에 갇힌 봉쇄 수도원. 왠지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두울 것이란 그녀의 편견은 행복해 보이는 수녀님의 모습을 통해 점차 바뀐다. 사실 우리들 스스로 마음의 철창을 만드는 것이 봉쇄 수도원의 어둠보다 더 서글픈 일이 아닐까?
공지영은 이 수도원에서 자신이 바람처럼 떠돌고 싶었으며 그렇게 살아 왔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자신을 철창 속에 가두었었노라고 반성한다. 아무도 그러라고 말해 준 이는 없지만 스스로를 가둔 채 답답하게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 여행을 통해 얻어진 값진 결과이다.
자신의 인생이 언제나 자기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세상엔 답답하고 험하고 고달픈 일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 극명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싶다. 공지영이 새롭게 깨달은 것들 또한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리라.
"버리면 얻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까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한다. 그렇게 불행한 결혼을 계속하면서 떠나지도 극복하지도 못하고 그냥 망가져 가는 친구들, 그렇게 붙들고 있는 자리 때문에 한없이 작아져 가는 친구들을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아니, 그건 비단 친구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때 세상을 버리고 싶었고, 한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 공지영.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삶을 증오하고 한 마리의 벌레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그러다 보면 인간의 성숙이란 시련과 아픔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발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그녀와 함께 여행하는 수도원은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존재한다. 거기서 느낀 생각들은 바로 삶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이다. 이 간단하고 명료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삶의 정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우리들.
공지영이 오랜 아픔을 통해 성숙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기나긴 시련의 강을 걸어야만 깨달음을 얻는다면 너무 늦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 삶을 돌아보는 한 자락의 시간을 가져 봄으로써 반성하고 깨닫는 순간을 얻는다면 머나먼 수도원으로 떠나 보지 않더라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