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멀리 서울 성곽을 따라 불빛이 건너다 보이고, 삼청각 처마 끝에 밝힌 등불도 따사로웠다. | | | ⓒ 김은주 | | 가을이 깊어 가는 삼청각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마른 잎사귀 비벼대는 소리 들리고, 살포시 떨어지는 노랗고 빨간 낙엽 덕분에 눈이 한껏 호강을 하는 데다가, 도심지 불빛을 비껴난 하늘에 총총 떠 있는 별빛도 참 고마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락, 우리 춤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좋은 공연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난 주말, 중요무형문화제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준인간문화재인 김일구 선생의 ‘적벽가’를 들으러 삼청각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맺히지 않은 통쾌한 소리, 비할 데 없이 호방하면서도 소름이 돋을 만큼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 | | ▲ 판소리 명창 김일구 선생 | | | ⓒ 김기 | | “우레 같은 소리를 지르며 말 놓아 달려들어 동에 얼른 서를 쳐 남에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들이몰아 사문에 와 번뜻 장졸의 머리가 추풍낙엽이라. 예 와서 번뜻하면 저가 땡그렁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서 땡그렁 베고, 좌우로 충돌, 허리파 허리파 허리파 백송두리 꿩차듯, 두꺼비 파리잡듯, 은장도 칼 빼듯, 여름날 번개치듯, 횡행행행 쳐들어갈 제, 피 흘려 강수 되고, 주검이 여산이라. 서황 장합 쌍접 게우게우 방어하고 호로곡으로 도망을 간다……”
김일구 선생의 맛깔스런 아니리가 이어지는 동안, 관객들은 연신 “얼쑤!” “잘한다!” “좋다!”를 외쳤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꽤 보이고, 예고에서 국악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여럿 공연을 보러 와 있었지요.
지나간 시절 번성했던 우리 가락을 몸으로 기억하는 세대들과 이제 막 피어나는 아이들이 한자리에 앉아 같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풍경은 보기에 퍽이나 기꺼웠습니다.
객석의 반응이 좋아서인지 김일구 선생도 한층 더 흥이 나는 듯했습니다. 조조가 싸움에서 패하고 도망가는 부분부터 시작한 이날 공연은 김일구 선생의 공연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선생도 손수건으로 연신 땀을 훔치면서 공을 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40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진 선생의 적벽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상’만 하는 것이 죄송스럽게 여겨질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온 존재를 소리 하나에 온전히 걸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감동적이면서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풍만한 소리의 향연이었지요.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선생의 벽력같은 소리가 귀를 통하지 않고 바로 뇌를, 심장을 때리는 것 같은 충격 때문에 제 팔에는 소름이 오소소 돋아 있었습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는 경험은 처음인 듯합니다.
춘향가나 심청가 같은 판소리는 방송이나 음반으로 종종 접해 본 일이 있지만 적벽가를 제대로 들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성 화자들이 등장하는 심청가나 춘향가와는 달리 온전히 남성의 세계를 목소리로 펼쳐 보여야 하는 적벽가는 장중하면서도 섬세한 표현이 동시에 요구되는 곡이라 특별히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김일구 선생은 중모리와 중중모리, 자진모리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살벌한 전장의 풍경을 때로는 희극적으로, 때로는 장엄하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적벽가를 마치고, 잠시 쉰 다음 김일구 선생은 가야금 산조와 아쟁 산조까지 연달아 들려주었는데, 공연 시작 전에 잠깐 맛보기로 '광대가'까지 불러 주었으니 한자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여 준 셈입니다.
“한 무대에서 이렇게 3가지를 다 하기는 이 무대가 처음인갑습니다.”
그러면서 김일구 선생은 사람 좋게 허허 웃어 보이셨지요. 아쟁 산조를 들려주기 전에 당신이 집에서 가끔 혼자 연주해 보곤 한다는 ‘목포의 눈물’을 아쟁으로 연주했을 때가 아마도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 | | ▲ 공연을 보러 온 예고 아이들과 기념 촬영. | | | ⓒ 김은주 | 사람들은 연신 손뼉을 치고, 몸을 이리저리 흔들거리며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아쟁 소리를 반주로 깔고 트로트를 불러 보기는 또 처음인지라, 신선한 흥겨움을 맘껏 누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보니, 진도씻김굿 공연을 하실 박병천 선생이 객석에서 걸어나와 무대연출가와 다음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아,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누군가 그랬거든요. 씻김굿이라는 것이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찐한’ 위로가 되는 묘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요.
하물며, 굿의 원형이 제대로 남아 있다는 진도씻김굿의 바로 그 박병천 선생이 바로 내 뒷자리에 앉아서 추임새를 넣어 주고 계셨으니, 얼마나 신나던지요. 이런저런 일정이 있는데도, 마음은 벌써 선생님의 굿판으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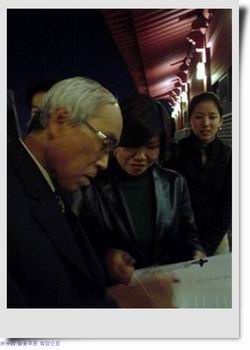 |  | | | ▲ 사인 하나 해 달라는 관객의 요청에 이름 석 자 쓰시는 데도 온 정성을 다 기울이신다. | | | ⓒ 김은주 | 밀양 백중놀이를 보여 줄 하용부 선생은 또 어떻고요. 사진작가 김수남의 책 <아름다움을 훔치다>에서, “사내 몸이 춤 없이 멋이 되는가” 하셨던 고 하보경옹을 뵙고는 밀양 백중놀이를 꼭 한번 찾아가 보리라 마음 먹었더랬는데, 바로 그 하보경 선생의 손자인 하용부 선생이 공연을 하신다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음 부대낄 때마다 시디 걸어 놓고 사념이 없어져 정갈해질 때까지 하염없이, 하염없이 되풀이 듣게 되는 황병기 선생의 가야금 산조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이래저래 마음 설레는 가을을 살게 생겼습니다. 겨울이 오기까지 한동안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마음이 잔뜩 달아오른 채 지내게 된 거지요.
사인 해 달라고 내민 종이에 한 자 한 자 정성 들여 이름 석 자 적어 주시던 김일구 선생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에 환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락, 우리 춤에 온전히 취할 날들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