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9월 국내 과학계 및 의료계뿐 아니라 전 세계 뇌 과학자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렸다. 다름 아닌 의료영상분야의 21세기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PET-MRI 뇌영상장비' 개발을 선포하였기 때문.
이 꿈의 장비개발을 위해 가천의대가 5년간 640억 원을 투자하고, 세계 최고의 의과학 장비업체인 독일 지멘스사가 합작 형태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독일 지멘스는 이를 위해 전 세계에 4대밖에 없는 7.0 T(테슬라·자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갖는 MRI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올해 7월이면 이 기기가 한국에 들어온다.
또 8월에는 74년 개발된 PET이후 성능이 급격히 개선된 최첨단 HRRT-PET가 들어올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도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고 올해 1월에는 미국 하버드대 뇌영상센터가 설립공사가 막 시작된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와 공동연구협정에 나섰다. 하버드대 뇌영상센터는 미 국립보건원(NIH)ㆍ국립암센터(NCI)ㆍ국방부 산하 연구기관(DARPA)의 지원을 받아 세계최고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사와 함께 민ㆍ관 합동 프로젝트로 '실시간 수술용 PET―MRI 입체영상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에 나서고 있다.
 |  | | | ▲ 세계적 뇌분야 석학 조장희 박사 | | | ⓒ KIBS | 이 모든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조장희(68) 박사다. X-레이, CT, MRI와 같은 선상에 있는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의 세계 최초 개발자로 한국인 중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로 손꼽히는 뇌 영상분야의 세계적 석학.
한국인 최초로 미국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원 의학부문 회원으로 선출된 조 박사의 화려한 이력과 세계 뇌 영상분야에서의 위상이, 작년 그의 귀국을 두고 국내 뇌 연구분야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과학기술계가 들썩거린 까닭이다.
조 박사는 이를 위해 40년 넘는 해외생활을 접고 작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다. 하지만, 독일 지멘스가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발 벗고 지원하는 까닭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현재 의료영상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장비는 MRI(자기공명영상기)와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PET는 뇌 세포의 움직임(유전자 기능)만 감지할 수 있고 MRI는 뇌의 구조, 즉 뇌 속의 형태만을 볼 수 있어 이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장비가 융합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셈.
만약 성공한다면 인류의 뇌질환 정복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중풍에서 정신분열증까지 다양한 뇌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멘스사를 비롯해 가천의대가 '베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조 박사가 이 두 장비의 유일한 세계적 대가라는 점 때문이다.
1975년 PET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본인인 것 이외에 1985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로 재직할 당시 단독으로 2.0T MRI를 개발해 의학계를 놀라게 한 MRI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하는 도전정신과 열정
조 박사의 이러한 업적이 어디서 비롯되었을지 궁금하다. 한 사람의 현재를 돌아보는 데에는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의 궤적을 보는 것이 손쉬운 터인데, 그의 과학자로서의 행보는 어떠했을까.
조 박사는 1962년 서울공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스웨덴 웁살라 대학을 시작으로 40여년이 넘게 외국에서 연구생활을 해왔다. 국제학술지에 2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 뇌 영상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그가 스웨덴 스톡홀름대를 비롯 미국 UCLA, UC샌디에이고, 콜럼비아대, UC어바인 등 많은 곳을 돌아다닌 것은 다소 의외다.
하지만 이유의 대부분이 안정된 자리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그에 따른 '연구환경'이라는 점이 일반인과의 차이점인 셈이다.
 |  | | | ▲ 세계최초 PET(Positron Emisson Tomography) | | | ⓒ 장래혁 | 그가 뇌영상장비분야에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도 그의 도전정신에서 비롯되었다. 1972년 미국의 UCLA에 있었을 때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CT개발 제의가 들어왔었으나 다들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다. 조 박사는 그때 CT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였고 그것이 추후 계속된 장비개발의 계기가 됐다.
이후 그는 74년 현재 노벨상수상후보의 이유로 꼽히는 PET를 개발하게 되고 이어 국내에 잠시 들어와 MRI를 개발한다.
"과학자는 열심히 연구하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언제든, 어디서든 꼭 알아줍니다"라는 조 박사. 하지만 그가 과학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하려 할 때 같은 분야 과학자들의 반대"를 꼽는 것을 보면 그의 도전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 또한 이것이다. 과학분야의 연구는 항상 첫째여야 한다는 것.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결코 과학강국이 될 수 없다는 그의 말이 그리 쉽게 들리지 않는 건 그의 삶에 그 말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의 도전정신이 대표적으로 잘 녹아 있는 분야가 바로 동양의학의 보고라는 '침'이다.
 |  | | | ▲ 98년 Discover지에서 주목 받은 조 박사 침 논문 | | | ⓒ 장래혁 | 조 박사는 지난 10여 년 침의 기전을 연구한 결과를 최근 집대성했다. 침술효과를 뇌과학으로 풀려는 선봉에 선 조 박사는 미국 UC어바인 교수로 재직시절 뇌영상을 통해 침이 결국 뇌를 자극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냈다.
그래서 조 박사는 동양의 '침'과 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개척해 동양의학의 신비를 서양과학으로 밝힌 과학자로도 유명하다. 침은 바로 우리의 자산인 의학을 서양에서 대대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조 박사의 안타까움이 큰 부분. 미국 국립보건원이 침술을 비롯해 대체의학연구에 투자하는 연구비는 이미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미국 내 생화학자들을 중심으로 침의 원리연구가 한창이다.
"최근 뇌의 잠재능력분야 HSP(고등감각인지) 기전규명 나서"
조 박사의 뇌 분야의 도전정신은 최근 뇌의 잠재능력분야로까지 확대됐다. 지난 3월 조 박사는 뇌호흡의 창시자로 유명한 이승헌 박사(한국뇌과학연구원 원장)와 손잡고 뇌의 잠재능력의 하나로 알려진 'HSP' 현상에 관한 공동연구협정을 맺으며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HSP(Heightened Sensory Perception)란 뇌의 정보처리 능력이 고도로 발달하여 눈을 감고도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두뇌의 잠재능력. 선천적 능력이 아니라 두뇌개발을 통해 그러한 능력이 발현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ESP(Extrasensory Perception: 초감각인지)와는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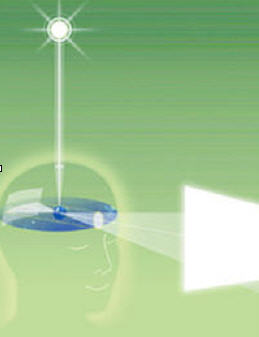 |  | | | ▲ HSP(고등감각인지) | | | ⓒ KIBS | 다소 특별한 연구에 대해 조 박사는 "초과학이란 것은 없다. 침이든 HSP 현상이든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낼 수 있다면 모두 의미가 있다. 또 2년여 동안 HSP능력을 보이는 많은 아이들과 연구원과 공동검증과정을 거쳤다"라 말했다. 조 박사의 도전정신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뇌의 고등인지기능의 기전이 밝혀진다면, 멘델이 현상을 증명하여 유전학의 시대를 열었듯 이러한 HSP에 대한 연구가 뇌의 새로운 인지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조 박사는 지난 3월 공동연구협정 이후 현재 한국뇌과학연구원(www.kibs.re.kr)과 지속적인 연구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본격 공동연구에 들어갔다. 올 7월에 들어올 7.0 T세기의 MRI장비와 8월로 예정된 PET장비가 셋업이 되면 연구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PET 라는 새로운 뇌영상장치 개발을 시작으로 침의 기전연구 그리고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HSP'라는 새로운 뇌의 기전연구에 나선 조장희 박사. 40여년 외국생활을 뒤로 한 채 영구 귀국한 그의 업적을 인정해, 정부는 지난 4월 과학의 달에 국내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의 최고등급인 창조장을 수여했다.
이제 그에게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의 영예가 안기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이는 평생을 식지 않는 열정과 도전하는 과학자의 삶을 살아온 그의 인생에 대한 축복인 동시에 40년 넘은 대부분의 해외체류 동안에도 지금껏 한국국적을 지니고 살아온 노(老) 과학자가 대한민국에 보내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는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타임즈(ScienceTimes)>에 기고한 내용이며, 필자는 이곳의 객원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