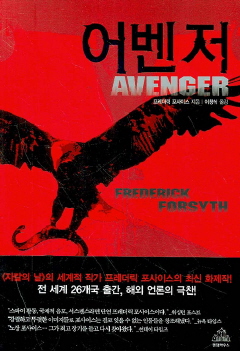
▲<어벤저> ⓒ 랜덤하우스
추리소설, 그중에서도 스파이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프레더릭 포사이스의 <자칼의 날>을 기억할 것이다. 1971년에 발표한 첫 작품인 <자칼의 날>을 통해서, 프레더릭 포사이스는 단번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얻게 된다.
<자칼의 날>은 여러가지로 독창적인 작품이었다. 역사적인 사건인 프랑스의 드골 암살 미수 사건을 소재로 한 데다가, 주요 등장인물들도 대부분 실존인물들이었다.
작품을 읽다보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허구인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자칼의 날>은 요즘 용어로 팩션(Fact+Fiction)의 모범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프레더릭 포사이스는 <자칼의 날>을 통해서 '킬러'의 전형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강인한 육체와 냉철한 성격의 '자칼'은 의뢰자의 신분이나 동기 따위는 모두 무시하고 오직 계약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칼은 돈을 목적으로 의뢰자와 계약하지만, 한 번 계약을 하고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는다. 설사 의뢰자가 '위험하니 그만두자'라고 주문 하더라도.
<자칼의 날>은 존 르 카레의 <추운나라에서 온 스파이>와 함께 스파이소설의 초기 걸작으로 분류되는 작품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하자면 '암살'을 다룬 추리물 중에서 <자칼의 날>을 능가하는 작품이 있을까 하는 느낌마저 생겨나기도 하다.
커다란 스케일과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
그 프레더릭 포사이스가 또다시 암살을 모티브로 독자에게 돌아왔다. <자칼의 날>로 부터 30여 년 이후, 2003년에 발표한 작품 <어벤저>가 바로 그것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벤저>는 단순하게 암살을 다룬 작품이 아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작가인만큼, 프레더릭 포사이스는 그 만큼의 세월을 <어벤저>에 응축하고 있다.
<어벤저>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 인물들의 사연도 모두 제각각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여러 개의 훈장을 받은 미국인, 폴 포트와 그의 군대 크메르 루즈에 밀려서 조국을 등진 캄보디아인, 2차대전 당시 히틀러와 맞서 싸웠고 지금은 광산재벌이 된 캐나다인까지.
많은 등장인물에 걸맞게 포사이스가 이끄는 무대도 광범위하다. 베트남의 땅굴 속부터 살벌한 보스니아의 내전현장 그리고 중동의 테러리스트들과 대치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까지 종횡무진한다.
작품의 시작은 2001년 5월 13일의 미국이다. 9·11 테러가 약 4개월 가량 남은 시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테러에는 관심도 없이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다만 CIA에서 특수임무를 맡고있는 몇몇 요원들만이 테러의 위험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요원들은 중동의 무더위 속에서 아랍 테러리스트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모종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비슷한 시간에 중동의 반대편에서는 한 젊은 미국인의 행방이 문제가 된다. 그 젊은이는 보스니아에서 자원봉사하던 중에 실종된 인물이다. 가족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행방과 생사여부를 알려고 한다. 그리고 '어벤저'라는 암호명을 가진 해결사가 혼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보스니아에서 실종된 미국인과 아랍 테러세력을 저지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냉정하면서 대담한 청부업자 '어벤저'
<어벤저>를 통해서 포사이스는 '자칼'을 능가할 만한 또 한 명의 인상적인 청부업자 '어벤저'를 등장시켰다. 어벤저는 전쟁터에서 겪은 지옥같은 경험을 통해서 위험한 재능을 연마한 인물이다. 침묵, 인내, 신출귀몰한 행동, 노련한 사냥기술, 타고난 추적자의 근성 등이 그것이다.
어벤저는 목표물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여권을 위조하고 수많은 신분을 사칭한다. 자신의 고통을 날려버리려고 평소에도 무자비한 훈련으로 육체와 정신을 갈고 닦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듯이, 어벤저도 자신이 의뢰받은 임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무를 위해서 대담하게 침투하고 교묘하게 추적자를 속인다. 어벤저는 여러가지 면에서 자칼과 비슷한 인물이다.
하지만 자칼과는 다른다. 단지 돈을 위해서만 움직였던 자칼과는 달리, 어벤저는 자신이 경험했던 비극적인 사건때문에 해결사로 변한 인물이다. 때문에 그는 의뢰인의 동기와 사연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범죄자를 추적해서 결국에는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야 만다.
그때마다 연방 보안관실을 놀라게 만들고도 어벤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명인으로 돌아간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수께끼의 인물이었던 자칼과는 달리, 어벤저에게는 과거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지켜야 할 가치관도 있다. 어찌보면 자칼을 입체적으로 만든 현대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프레더릭 포사이스는 1938년 생이다. 작품활동을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포사이스는 결코 다작형의 작가가 아니다. 로버트 러들럼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작품을 토해내는 스타일의 작가도 아니다. 하긴 <어벤저>처럼 꼼꼼하게 취재하고 치밀하게 구성하다보면 다작형이 될래야 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벤저>가 잊혀질때 쯤이면 이 작가는 또다른 작품을 들고 독자들 앞에 나타날지 모르겠다. 프레더릭 포사이스의 영광의 날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어벤저> 프레더릭 포사이스 지음 / 이창식 옮김. 랜덤하우스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