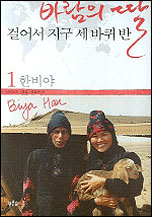
▲한비야의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 ⓒ 푸른숲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을 읽고 나서 한비야의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을 읽었다. 전자는 포근한 카페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진득하니 앉아서 본 것이고, 후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두 책은 용도마저 다르다. 알랭 드 보통의 책은 주변의 사물에 대해 깊고 꼼꼼하게 고찰할 기회를 주는 반면, 한비야의 책은 각양각색의 경험과 감각적인 언어로 점철돼있어 그야말로 '재미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기술>보다는 한비야의 <지구 세 바퀴 반>을 좋아하고, 또 한비야가 그보다는 훨씬 많이 알려져 있다. 당연하다. 전자는 머리가 아픈데, 후자는 누가 봐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재미있는 경험들뿐이니까. 필자 역시 한비야의 책을 보면서 지하철에서 혼자 키득거릴 정도로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난다.
보통은 알랭 드 보통처럼 머리 아픈 철학을 좋아하지도 않고, 여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전자에 더 의미를 두려 한다. 왜? 그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기 때문이다.
한비야의 여행담은 확실히 기이하고, 무지막지하며, 닮고 싶을 만하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값이 높아지고, 수많은 평범한 젊은이로부터 추앙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기상천외함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담력 그리고 적극성에 대해서 말이다.
한비야가 추앙받는 것은 그녀가 본받을 대상이어서가 아니다. 다만 그녀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슈퍼우먼'에 가깝다. 또한 오직 새롭고 기이한 경험과 모험심이 그녀의 여행의 전부였던 만큼 내용 자체도 재미있다. 그 점이 '직접 행동'과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요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한비야에 열광하는 모두가 그녀를 닮아가고 있는 것일까? 답은 No다. 실제로 여행을 좋아한다는 왠만한 사람도 모험심도 없이 그저 유명소에 들렀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하고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을 버리고 여행을 시작했으며, 그것이 오래 되었고, 이제는 오지만을 찾아 여행하고 싶다'는 사람이 '특이하다'는 평을 받는, 현재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부터 유추 가능하다.
한비야의 책을 읽고 여행을 좋아하게 됐다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단지 '해외여행'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됐을 뿐, 그녀가 몸소 실천한 '사서 고생'이라든지, '오지 탐험'을 몸소 실현하려는 경우는 드물다.
한비야는 적극적인 여성상과 풍부한 인생경력의 '트레이드 마크'이지, '진정한 여행가'로서 '진짜 여행'에 대한 진정 어린 울림을 선사하진 못했다. 그녀 자신 또한 그러한 점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아마도 경험을 머릿속에서 살려내고, 진지한 감상과 생각보다는 재담꾼답게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더 신경쓴 흔적이 책에도 역력하다. 그렇기에 정작 노련한 여행가들은 그녀를 '배낭여행족의 사부' 내지는 '기이한 탐험 경력의 소유자' 정도로 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애초에 그녀를 숭앙하는 많은 사람들의 여행하는 방식은 실제로 그녀와는 많이 다르다.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 ⓒ 이레
그렇다면 여기서 알랭 드 보통의 책이 어떤 의의를 지닐 수 있을까? 그의 책은 사소하고 평범한 경험에서부터 쓰여졌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깔끔한 숙소에서 묵으며,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펼쳐진 곳에서 햇빛을 받으며 책을 읽는다.
프로방스에서 사이프러스 나무를 보며 고흐를 떠올리고 또 거기서 예술에 관한 고찰을 시작한다. 그의 책은 실제 경험한 것에 비해 매우 풍부한 연상과 감수성 그리고 사유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사실은 '재미있는 한비야'보다 '머리 아픈 알랭 드 보통'이 더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여행의 실제 범위는 알랭 드 보통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여행방식은 실제 동선이 '유명소'와 '휴양지'에 국한되는 우리에게, 한비야처럼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아도 그 여행이 다채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많은 이들이 여행경험을 '교양' 정도로 간주하는데(나 시드니 갔다왔다, 나 뉴욕 가봤는데~ 등등) 남들이 알아줄 만한 고전과 철학에 대한 교양적인 지식 또한 알랭 드 보통의 책에 차라리 더 풍부하게 담겨 있다.
여행의 수준을 넘어 그 나라의 진국까지 맛볼 '탐험가'라면 한비야에 열광하라, 그녀를 따르라. 그러나 여행의 이유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 한비야가 오지탐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턱대고 그녀에게 열광하기보다는 '알랭 드 보통'식의 얌전한 여행기에도 눈을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
부러워하면 어떠냐고, 인생 좀 단순하게 살자고, 재미있는 한비야를 좋아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묻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의 말도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말라위 같은 오지가 아닌, 최소한 문화선진국을 꿈꾸는 국민으로 이뤄진 나라라면 그 자신들이 이상으로 삼는 '교양 있는 삶'을 위해 생각의 차원을 높일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가 해외여행으로 다 빠져나가는 만큼, 우리 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은 쉽고, 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대장금>을 보고 찾아온다는 덕수궁은 겨울 내내 공사중이라고 흉한 골조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명소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좀 있다는 사람은 대개 해외로 빠져나갈 궁리부터 한다. 여행수지는 당연히 적자다.
그 이유가, 어쩌면 우리에게 여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동네의 풍경마저 때로는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같은 것-알랭 드 보통식[式]), 그리고 진정성(단순히 다녀왔음을 자랑하려는 허영심이 아닌 그 나라에 완전히 녹아들어 경험하려는 마음가짐-한비야식[式])이 결여됐다는 증거 아닐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여행이 흔해질수록 우리가 왜 여행에 열광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하겠다. 알랭 드 보통, 그리고 한비야라는 극단적인 두 여행가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