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 년 전에 축구를 하다가 얼굴을 다친 적이 있었다. 공중에 떠서 헤딩을 하고 내려오는 내 얼굴을 상대편 선수가 이마로 들이받아 버린 것이었다. 나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실신했고, 앰뷸런스에 실려 경희대병원으로 갔다.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가 흔들렸다.
그 후로 오랫동안 잊고 지냈는데, 한 십년 지내다 보니 앞니가 까맣게 변색되기 시작했다. 앞니를 빼고 다시 심든 코팅을 하든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기에 치과에 갔다. 의사의 진단으로는 이미 앞니 신경이 죽은 지 오래고, 점점 더 변색이 심해질 것이므로 어서 신경치료와 미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단 누워 입을 벌렸더니 웬걸 사랑니를 하나 빼야겠다고 한다. 사랑니들이 많이 상해서 언젠가는 빼야할 줄 알고 있었지만 느닷없이 이를 빼고 묵언수행까지 하고 있자니 별 잡다한 생각이 다 든다.
에피소드 1- 어릴 적 읽은 대통령 전기일제 시대쯤 경남 합천의 어느 시골집 아주머니가 탁발을 오신 스님께 시주를 좀 했는데 스님이 아주머니께 살며시 귀띔을 했더란다. 물론 이런 얘기가 늘 그렇듯이 첫머리는 꼭 이런 상투적인 단서가 붙는다.
"이건 천기누설이라 원래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 집안 자식이 장차 큰 용이 될 재목이긴 한데, 그 용의 앞길을 아주머니 앞니 두 개가 가로막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스님이 돌아간 후 그 아주머니는 초가집 기둥을 들이받아 앞니를 몽땅 분질러 버렸단다.
그리하여 그 집 아들은 과연 훗날 용이 되었더란다. 그런데 그 용이 누굴까? 경남 합천 땅이라고 힌트까지 줬다.
그렇다. 재산이 29만원밖에 없으시다는 그 분, 백담사에 기념관까지 가지고 계신 골목대장 그 분이시다.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이 황당한 에피소드는 집권과 동시에 출간된 그의 전기문 <황강에서 북악까지>라는 책에 나온 얘기다.
한때 우리집에는 선명한 다이아몬드형 로고가 박힌 '민정당 평생동지' 보자기와 접시, 벽시계 등이 흔했다. 그것으로 보아 우리 아버지께서도 아마 그분과 '평생동지'였던 모양인데, 아버지 가시는 길을 어찌 아들이 모른 척할 수 있으랴. 중학생 무렵이었던 나도 집에 꽂혀 있던 위대하신 현직 대통령의 전기문을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이다.
내용이야 뭐 너무 오래 전 얘기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분의 선친께서 민족적 울분을 참지 못하시고 왜놈 순사를 자전거째 들어서 합천을 가로질러 흐르는 황강의 푸른 강물 속에 처박아 버렸다는 둥, 용비어천가 패러디 류의 그런 얘기들이 가득했던 것 같다. 오죽 어이가 없었으면 내가 25년 전에 읽은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겠는가.
에피소드 2- 포로수용소에서 생니 뽑은 김수영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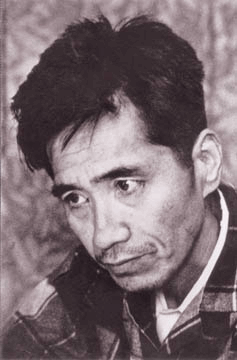
|
| ▲ 김수영 한국 현대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인 김수영(자료사진) |
내 윗세대 사람들 중에 시인 '김수영'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이다. 그의 시를 읽고 문학도를 꿈꾸었다는 분도 많으시다. 실제로 호나우지뉴가 인터밀란 시절의 호나우두를 모델로 삼아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었듯이, 김수영의 시를 읽고 용맹 정진하여 시인이 됐다는 분들도 꽤 많다.
한국전쟁 당시 김수영은 북쪽으로 끌려가 노동을 하다가 탈출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일이 꼬이려고 그랬는지 남쪽에서는 그를 북괴군 포로로 분류해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보내버렸다.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포로들끼리 '반공', '친공'으로 편을 갈라 싸우느라 하룻밤 지나고 나면 시체가 수두룩하게 발견되는 잔인한 무법지대였다.
김수영은 그곳에서 매일 밤마다 반복되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방편으로 자신의 생니를 몇 개나 뽑았다고 한다. 즉 공포를 견디기 위해 그보다 더한 극한의 고통, 마취도 없이 스스로 생니를 뽑는 엄청난 통증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스스로 그랬다는데 더 할 말이 뭐 있으랴.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로도 그는 평생 '빨갱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물론 거제도에 수용됐던 포로의 전력 때문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현실 참여적, 비판적 시풍도 그러한 의심에 빌미를 제공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목마와 숙녀>로 유명한 박인환은 현실을 외면하고 허공에 떠서 날개짓을 하는 듯한 낭만주의적 시를 썼다. 반면 김수영은 이승만 독재를 증오하고, 4·19를 찬양하고, 또다시 등장한 군부독재를 규탄하는 등 항상 현실에 뿌리를 둔 시를 썼던 것이었다.
여유가 좀 있으신 분께서는 김수영의 시를 검색해서 몇 편 읽어보시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달나라의 장난', 일반적으로 대표작이라 불리는 '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 등 참으로 주옥같은 시들을 많이 쓰신 분이다.
풀이 눕는다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풀이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날이 흐르고 풀이 눕는다발목까지발밑까지 눕는다바람보다 늦게 누워도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바람보다 늦게 울어도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날이 흐르고 풀뿌리가 눕는다풀 /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