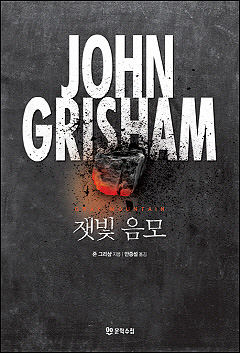
▲<잿빛 음모>겉표지 ⓒ 문학수첩
탄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보자.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갱도를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일반 탄광이다. 다른 하나는 지상에서 작업하는 노천 탄광이다.
어느 곳이건 간에 탄광에서 광부로 일을 하다보면 석탄 분진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이 석탄 분진은 체내에 들어가면 분해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폐 속에 쌓인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질병을 '흑폐증(진폐증)'이라고 부른다. 이 병으로 사망할 경우, 죽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느리고 고통스럽게 병이 진행된다.
광부가 이 병에 걸려서 사망한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 광부 자신? 석탄회사? 아니면 작업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국가일까?
환경 파괴 현장에 뛰어든 젊은 여변호사존 그리샴은 자신의 2014년 작품 <잿빛 음모>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29세의 여성 변호사 서맨사. 그녀는 뉴욕에서 잘 나가는 법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투자회사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소위 말하는 '리먼 사태'가 발생하자 회사에서 일종의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된 그녀가 향한 곳은 버지니아 주의 작은 마을이다. 그곳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그 법률사무소는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문제는 지역의 최대고용주가 석탄회사라는 점이다. 서맨사와 만난 지역의 변호사 도너번은 이런 석탄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물론 양심적인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석탄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직원들의 건강문제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너번은 오래 전부터 석탄회사들과의 법적싸움을 벌여왔고 그 결과로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서맨사는 이 지역에서 당분간 활동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석탄회사와의 싸움에 휘말려간다. 어쩌면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작가가 고발하는 석탄 재벌의 횡포존 그리샴은 '법정소설의 대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 소설에 법정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변호사가 대형 석탄회사를 상대로 싸우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기 전에 다른 형태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대신에 변호사들은 현장을 뛰어다닌다. 애팔래치아의 숲속과 노천탄광을, 등산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돌아다닌다. 그 과정에서 총성을 듣기도 한다. 마치 법정소설과 하드보일드가 뒤섞인 듯한 느낌이다.
'탄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나라의 사북 탄광이 떠오른다. 동시에 오래전에 독일로 떠났던 광부들도 함께 생각난다. 그런만큼 작품에 나오는 흑폐증의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달에도 강원도 태백에서 나이든 광부들과 흑폐증 환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기도 했을 정도다.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흑폐증 환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있다. 은퇴한 광부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려고 힘을 기울이는 여러 단체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잿빛 음모>을 읽다보면 그런 현실을 더욱 느끼게 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탄광 노동자들의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덧붙이는 글 | <잿빛 음모> 존 그리샴 지음 / 안종설 옮김. 문학수첩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