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책이 나왔습니다'는 저자가 된 시민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된 시민기자라면 누구나 출간 후기를 쓸 수 있습니다.[편집자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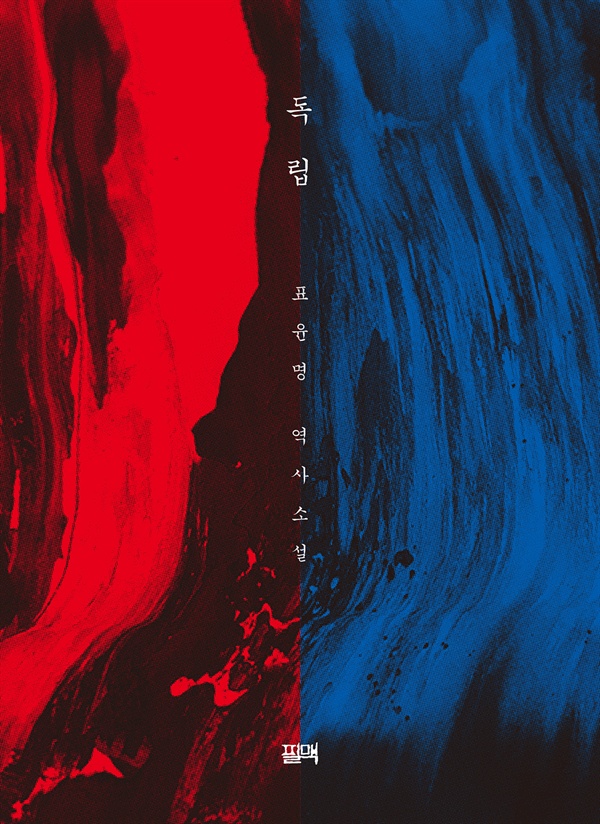
▲독립 표지독립 표지 ⓒ 표윤명
올해는 참으로 뜻깊은 해다. 2.8독립선언을 시작으로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았다. 11월 10일은 또 의열단이 창단된 날이다. 의열단 창단도 올 해로 100주년을 맞는 것이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독립지사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많은 기념행사가 준비되었다고 한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도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다.
글 쓰는 입장에서 나 또한 준비를 해 왔다. 임시정부 수립일인 지난 4월 11일, 또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제목은 <독립(獨立)>. 해방부터 김구 주석 암살까지를 다룬 이야기다.
해방이 되고 광주에 은신해 있던 박헌영이 상경하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수많은 정당 단체들이 난립하는 해방정국에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과 여운형의 건준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회주의, 그것은 지식인들에게 있어 새로운 세상을 위한 이상향이었다.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때문에 그들은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것도 독립에 우선할 수는 없었다. 독립을 위한 한 방편으로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는 그들에 의해 선택되어졌다. 약산 김원봉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경우였다.
미군정이 들어오고 그들은 환국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현대사가 크게 뒤틀리게 되는 원인이다. 저들은 일제 경찰과 관료들을 그대로 끌어안았고 새로운 주인을 모신 그들은 빨갱이라는 틀에 자신들의 과오를 묻으려 했다.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그 틀에 갇혀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 하고 있다.
일제에 의해 김구 주석보다도 많은 현상금이 걸렸던 약산 김원봉은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노덕술에게 잡혀가 뺨을 올려 맞고 갖은 수모를 당했다. 잠자리를 한 곳에서 할 수 없을 지경으로 테러에 시달리기도 했다. 몽양 여운형도 그러다가는 결국 암살을 당한 상황이었다.
그 몽양 여운형의 장례위원장을 약산 김원봉이 맡았다. 남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기에 그는 결국 월북을 선택하고 만다. 혼란한 정국은 4.3과 여순항쟁, 그리고 반민특위 해체와 주석 김구의 암살로 이어진다. 우리 역사의 아픔이자 불행이었다.
이야기는 추사 난정서라는 위작과 윤봉길의 상해의거를 넘나들며 과거와 현재를 오간다. 우당 이회영이 만주로 건너가며 추사 난정서를 가져가고 이를 원세개에게 건넨다.
이 난정서는 상해로 흘러들어가 시라카와 육군대장과 헌병대 산하 밀정회의 슌케이 사이를 갈라놓는다. 둘은 난정서를 차지하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이고 이들 사이에서 슌케이의 수양딸인 료코는 임시정부의 양휘보와 사랑을 이루어간다. 료코의 일제에 대한 충성과 양휘보의 조국 독립 사이에서 사랑은 갈등을 겪으면서 무르익어간다. 난정서는 결국 료코가 양휘보에게 양보하며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그러나 임시정부 환국 후 따라 들어온 일제의 밀정회는 난정서를 훔쳐내 자신들의 그림자를 해방된 대한민국에 심어놓으려 했다. 난정서를 노덕술에게 주어 고위관료의 환심을 사게 하고 그를 이용해 경찰이 되게 했던 것이다. 노덕술을 비롯한 일제 경찰과 관료들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빨갱이라는 틀을 만들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하는 데 혈안이 된다.
광복군이었던 양휘보와 신태무 등의 회상으로 이야기는 과거로 넘나든다. 상해 홍구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 상해의거를 생생히 재현해내는 것이다. 거사가 있기 하루 전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거사 장소를 김홍일과 함께 찾아 계획을 세우고 이튿날 의화단의 후신인 권비문의 도움으로 공원에 입장해 거사를 성공시킨다. 이야기는 상상으로 이어져 일본으로 이송되기 전 남화한인연맹의 유자명, 백정기, 정화암 등이 권비문 그리고 임시정부 한인애국단의 요인이었던 양휘보 이희도 등과 함께 윤봉길을 구출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 소설을 역사의 뒤안길에서 움츠리고 있을 그분들을 위해서 썼다. 이제 그림자처럼 뒷전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그분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그분들도 숨통을 트여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회영, 김원봉, 여운형, 유자명, 백정기 등.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본다. 불러서 역사의 평가를 다시 받게 하고자 한다. 그게 내 소설의 뜻이다. 내 이야기의 의미다. 이제 역사를 역사로만 바라보자! 이념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자. 그럴 때가 되었다.
매헌(梅軒) 윤봉길, 몸을 어디에 두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었다. 저한당(抯韓堂)에 있으나, 도중도(島中島)에 있으나, 상해에 있으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조국독립이라는 한결같은 마음에 있었다.
나는 저한당 툇마루를 자주 찾았다. 볕 바른 봄날에도, 빛깔 고운 가을날에도, 툇마루는 한갓졌다. 도중도의 광현당(光顯堂)도 자주 찾는 곳이었다. 비바람 몰아치는 여름과 눈보라 휘날리는 그날에도 나는 그곳을 찾았었다. 그곳에 그 분이 있을 듯싶었다. 도중도를 거닐며 그 분이 생각했을 몸과 마음을 생각했다.
독립(獨立)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그분들의 이야기가 먼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왔다. 소중히 마음을 다해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