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책은 '배려의 말들'이에요. 100가지 배려의 문장과 그에 대한 작가의 단상이 짝을 이룬, 유유 출판사의 문장 시리즈입니다."
편집자로부터 출간 제안을 받고 "오호호홋~" 하며 웃었다. 배려라니…. 나에게 딱 어울리는 주제 아닌가. 남편은 늘 나더러 '싸움 잘하게 생긴 얼굴'이라고 놀리지만 사실 난 싸움은커녕 여린 마음에 늘 타인을 배려하며 사는, 능히 친절하다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던가.
"옛썰. 잘 써보겠습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난 쓸 말이 엄청 많아 후딱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웬걸. 쓰면 쓸수록 벽에 부딪혔다. '절약의 말들'이나 '청소의 말들' '다이어트의 말들'이라면 내가 취약한 분야이니 애를 먹어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번 주제는 배려다.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내가 애먹을 주제가 아니란 말이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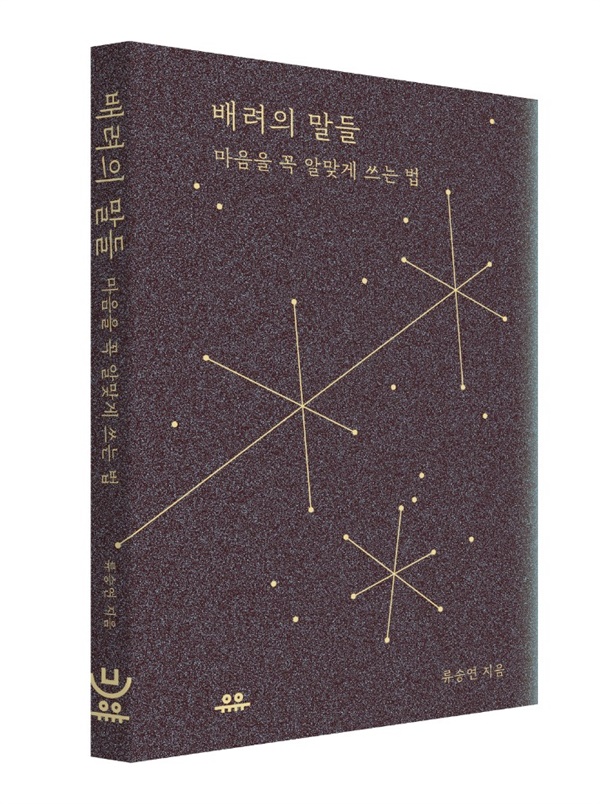
▲유유출판사 문장 시리즈 신간 '배려의 말들' ⓒ 류승연
배려를 주고받은 상황들을 쭉 생각해보는데 오고간 배려 속에 웃음과 희망이 싹트는 이상적인 그림이 떠오르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할 때마다 실수를 연발했던 일이 먼저 떠올랐다. 상대는 마음이 상했고 나는 민망해졌으며 가끔은 화가 나기도 했다.
"내가 배려했는데 왜 자기가 화를 내?"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배려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며 많은 이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배려를 받았다. 나를 위해 건넨 배려의 말에 오히려 피가 솟구치기도 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했던 건 그들의 선한 의도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왜 이런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상대에게 관심이 있어 돕거나 보살피려 마음을 썼더니 정작 반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생긴다. 나는 배려한 건데 상대방은 무시당했거나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고 오해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이러면 억울하다. 괘씸한 기분도 든다. '다시는 배려하나 봐라. 흥!" - <배려의 말들 > 21p
배려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했다. 무엇이 배려인가? 배려는 무엇이 배려인지 알아야 잘 할 수 있다. 상황을 이해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나 자신까지도 살피고 나서야 적재적소에 맞는 배려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존중, 태도, 차별, 혐오, 평등, 배제와 같은 우리 삶을 단단하게 하는 가치를 민감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배려를 주고받고 나서도 서로 낯뜨거워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시스템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로는 시스템을 볼 수 없다. 매트릭스 안에서는 매트릭스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구조화의 시각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구조를 볼 줄 알아야 개인에 대한 비난을 멈출 수 있다. 네 탓이 아니라고 다독일 수 있다. 각자의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
- <배려의 말들 > 55p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게 배려가 아니었다. 쉽게 쓸 줄 알고 "오오호홋" 웃었다가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질 만큼 많은 고민을 거듭해 책이 나왔다. 내 전 생애를 거슬러 올라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이들과의 관계를 재소환해야 했다. 고비마다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재정립해서 글로 풀어내야 했다. 그것도 하나의 글이 아닌 100개의 글을.
책 '배려의 말들'은 이 책을 기획한 유유출판사의 대표적인 문장시리즈 중 한 권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문장시리즈란 페이지를 펼쳤을 때 왼쪽에는 권위를 담당하는 좋은 글귀, 오른쪽엔 그 글귀를 뒷받침하는 작가의 단상이 수록되어 있다. 은유 작가의 '쓰기의 말들', 엄지혜 작가의 '태도의 말들', 김은경 작가의 '습관의 말들' 등이 문장시리즈로 구성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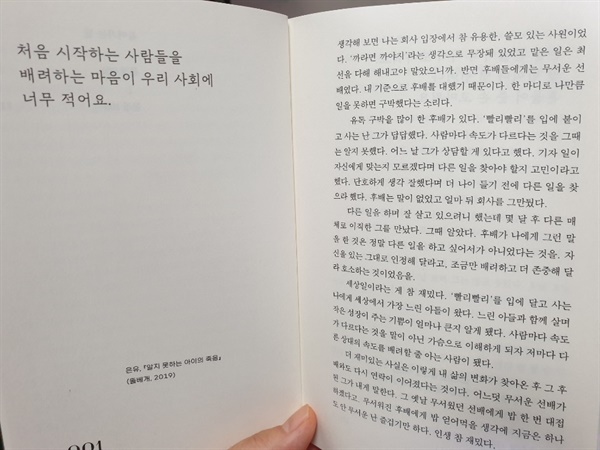
▲배려의말들 첫 페이지 ⓒ 류승연
늘려 쓰는 건 차라리 쉬운 일이다. 100개의 메시지를 짧은 글 안에 제각각 담아내기 위해 수십 번씩 고민하고 수정했다. 개인적으로는 2년쯤 노화가 촉진된 듯한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책은 쉽게 잘 읽히게 말랑말랑하고 재미있게 잘 나왔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일단 읽혀야 독자의 가슴에 가 닿는 법이다. 좋은 얘기 백 만 개를 잔뜩 써놓아도 아무도 읽지 않아 출판사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면 그건 슬픈 일이다. 무엇보다 재미가 없는 책은 나조차도 읽고 싶지 않으니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쉽고 재미있고 잘 읽히게 쓴 글 속에 숨어 있는 자간의 의미랄까, 내 노화를 2년 더 촉진시킨 어떤 고민의 흔적을 찾아내 그것까지 읽어주는 독자가 있다면 나는 너무나 기쁠 것 같다. 원고를 쓰면서 잔뜩 생겨난 흰머리, 늘어난 주름과 뱃살 따윈 아무렇지도 않을 듯하다. 그때야 비로소 "오호호홋" 하며 큰소리로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세 번째 출간하는 책이다. 기존에 냈던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과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는 발달장애 아들이 있는 엄마의 정체성으로 글을 썼다. 스스로도 '글 쓰는 엄마'로 자신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엔 '엄마'가 아닌 나 자신, 류승연의 정체성으로 글을 썼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다.
아.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책엔 상대와 주고받는 배려의 상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나는 스스로에 대한 배려에도 큰 비중을 뒀다. 내가 나조차 배려하지 않으면서 타인만을 위한 배려의 삶을 산다면 그건 공허할 뿐더러 슬프기까지 한 일이다. 나에게 있는 것이어야 남에게도 줄 수 있는 법이다. 그것이 사랑이든, 행복이든, 배려든 말이다.
"지금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스펙이라는 계급장을 뗀 알맹이로서의 개인, 그 고유성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려 노력한다. 그러고나자 삶이 훨씬 편해졌다. '스펙 대 스펙'의 만남이 아닌 '알멩이 대 알멩이'의 만남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덕이다. 나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배려하기 시작한 덕이다." - <배려의 말들> 4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