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를 낳고 2주간 머문 산후조리원에 산모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다. 지방 소도시에 소재한 작고 오래된 조리원 마사지실에서는 항상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부은 내 몸을 마사지하면서 마사지사는 매번 똑같은 말을 했다.
"나는 사실 피아노를 전공했어.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마사지사의 자조 섞인 말에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드레스 대신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피아노 대신 산모들의 몸을 능숙하게 마사지하는 그녀의 손은 그동안의 녹록지 않은 삶을 짐작게 했다.
마사지를 받고 난 후, 몸은 한결 편안해졌지만 마음은 전보다 더 무거웠다. 갓 아이를 낳고 감정이 예민해져 있었던 탓인지, 조리원에 있는 동안은 그녀를 생각하며 우는 날이 많았다.
현재의 시간을 견딜 수 없는 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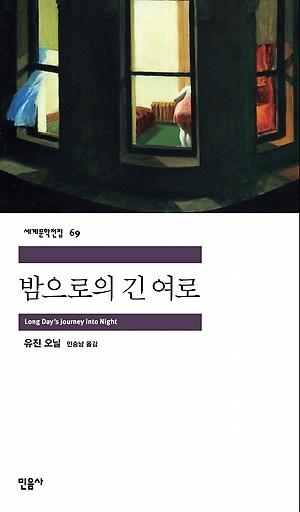
▲<밤으로의 긴 여로>, 유진 오닐 지음, 민승남 옮김, 민음사(2002) ⓒ 민음사
메리 : 내 손! 넌 못 믿겠지만 예전엔 이 손이 내 매력 가운데 하나였지. 머리랑 눈이랑 함께. 몸매도 예뻤고. 음악가의 손이었지. 난 피아노를 좋아했거든. (…) 그이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유학을 갔을지도 몰라. 오랫동안 피아노에 손도 안 댔어.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계속 음악을 하려고 했었지. 하지만 가망이 없었어. 순회공연에, 싸구려 호텔에, 구질구질한 기차에, 집도 없이 아이들도 내팽개치고…… 봐, 캐슬린. 얼마나 흉한지! 완전히 병신 손이 됐어! 누가 보면 끔찍한 사고라도 당한 줄 알 거야! 사고라면 사고지. (123~124쪽)
첫아이를 낳고 5년이 지난 지금, 새삼스레 그때 만난 마사지사를 떠올린 이유는 유진 오닐의 희곡 <밤으로의 긴 여로>에 등장하는 '메리' 때문이었다. 수녀원에서 피아노를 치던 메리는 연극배우 티론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
그녀는 세 아들을 낳았지만 둘째 아들을 홍역으로 잃고, 셋째 아들 에드먼드를 낳고는 손에 지독한 관절염이 생겨 진통제에 의지하다가 모르핀에 중독되어 요양원 신세까지 지게 된다.
퇴원 후 한적한 바닷가에 있는 여름 별장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남편은 투자 가치도 없는 땅들을 계속 사들이느라 진 빚을 갚지 못하고 있고, 첫째 아들은 돈 한 푼 벌지 못하면서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술집 여자들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다. 그나마 말썽 없이 얌전한 셋째 아들은 폐결핵을 앓고 있어, 메리는 또다시 아들을 잃게 될까 불안하고 무섭다.
메리뿐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의 삶도 괴롭긴 마찬가지다. 집으로 돌아온 메리가 또다시 약물에 손을 댈까 봐 온 가족이 그녀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한다. "어깨를 눌러 땅바닥에 짓이기는" 각자의 현실이 너무나 버거워 도무지 서로를 돌볼 여력이 없는 그들은 원망과 증오, 죄책감을 안은 채,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무참히 망가져간다.
무엇 하나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의 유일한 숨구멍은 약물과 술이다. 술과 모르핀에 취해 좋았던 과거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지켜보는 것조차 힘이 든다.
현재의 시간을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다. 의미 없는 가정법을 잔뜩 끌어안은 채.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후회되고 그리워도 과거를 다시 살 수는 없다. 가정법을 끌어안고 과거를 헤매는 동안 나와 내 가족의 현재는 계속 망가져만 간다. 지금의 삶이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대로 견딜만하다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잘 살아내는 데에 집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밤으로의 긴 여로>에 등장하는 티론 가족의 삶은 도무지 견딜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살아서 최고의 극작가가 된 가족의 이야기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는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괴로웠던 그때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했다. ⓒ Pixabay
<밤으로의 긴 여로>는 부서져가는 가족의 이야기다. 등장인물의 이름만 다를 뿐 작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그대로 그린 작품이다. 극 중 셋째 아들 에드먼드가 곧 유진 오닐, 작가 자신이다. 부인 칼로타 몬트레이의 말에 따르면 유진 오닐은 이 작품을 쓰는 동안 "들어갈 때보다 십 년은 늙은 듯한 수척한 모습으로, 때로는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은 채로" 작업실에서 나오곤 했다고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절망에 빠뜨렸던 가족의 모습을 다시 불러내는 일은 간신히 봉합한 상처를 다시 찢어서 헤집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랑하고 증오했던 그의 부모와 형제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살아서 최고의 극작가가 되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는 펜과 종이를 들고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괴로웠던 그때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했다. 스스로 그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의 형이 되어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 시간을 살았을지 정확하게 글로 옮기는 것. "내 묵은 슬픔을 눈물로, 피로 쓴 작품"이라고 했던 <밤으로의 긴 여로>는 그가 세상을 떠난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자 위로였던 것이다.
애증. 가족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단어도 없을 것이다. 나를 가장 오래 지켜봤지만 정작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 나의 치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 아프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버리고 도망가고 싶다가도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은 존재.
내 가족의 문제를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 한 번 상처받을 용기, 가족들의 상처까지도 끌어안을 용기.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바쳐 진실하게 써 내려간 글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은 괴롭다. 애써 모른 척했던 상처를 들쑤시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학은 우리를 혼자 아파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진실된 공감과 뜨거운 위로만큼은 늘 건네주지 않던가. 1956년 초연된 유진 오닐의 작품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연극 무대에 오르고 있는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