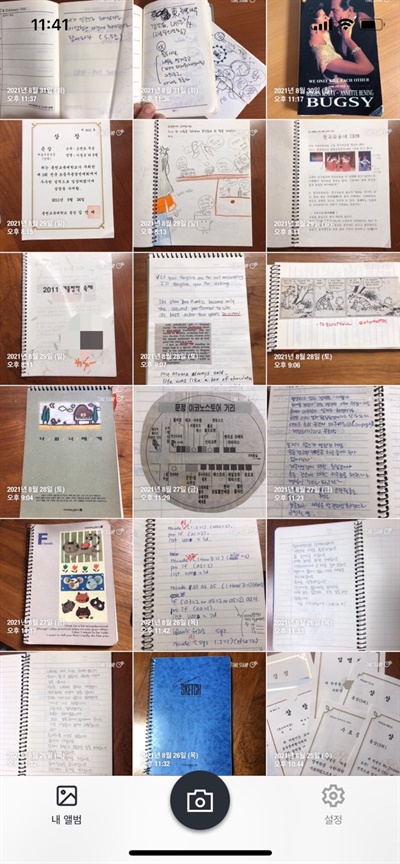
▲디지털화한 자료들. ⓒ 전윤정
7월 한 달간 '1일1폐'(매일 하나씩 버리기) 인증모임을 하며 '비우는 즐거움'을 알게 된 후, 나는 혼자서 '1일1폐'를 진행해보기로 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 비워내는 내 의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 쉰 살에 들인 새 버릇도 여든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버려두었던 내 블로그에 '1일1폐'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하루라도 빠지면 커피를 사겠다고 친구와 약속했다.
추억을 디지털화하다
지난 6월, 대학생인 두 딸이 유치원생일 때부터 모아둔 그림, 독후감, 상장 등등을 나는 사진으로 남기고 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1일1폐'의 몸풀기였던 셈이다. 그런데 베란다 수납장 한편에서 다른 물건에 섞여 또 한 뭉치 나왔다.
지난번엔 학교 상장을 버리기가 힘들더니, 한 번 버려봤다고 사진 찍고 버리는데 별 감흥이 없다. 초등학교 그림대회 상장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는지 웃음이 났다. 잠깐의 기쁨과 만족일 뿐 시간이 지나면 종이 한 장에 불과한데 말이다.
헌 이를 새 이로 바꿔준다는 '이빨 요정(tooth fairy)'에게 쓴 옛 편지도 나왔다. 유치를 뺀 날에 아이들이 이와 편지를 넣은 주머니를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면, 나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와 답장 편지로 바꿔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좋아하며 500원을 들고 문방구에 가던 시절이 생각났다. 우연히 '이빨 요정'이 아닌 엄마가 답장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된 날,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추억을 생각하며 한 장 한 장 찍는데 이번에는 내가 눈물이 났다. 마냥 해맑았던 아이들의 시간이여, 이제 안녕!
추억의 디지털화는 내 물건으로 이어졌다. 옛날 편지, 수첩, 일기장이 들어 있는 커다란 판도라의 상자를 드디어 열었다. 일단 수첩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중요한 메모는 글이니까 사진보다는 워드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 작업을 마친 수첩을 날마다 하나씩 버렸다.
1994년 이전 대학생 때 수첩을 다시 보니 나는 '명언 채집자'였다. 광고회사를 취업 목표로 했기 때문인지 "광고는 과학이 아니라 설득이다", "팔리지 않는 것은 크레이티브가 아니다"와 같이 광고와 관련된 명언이 특히 많았다.
신문에 실린 <오늘의 명언>을 오려 붙인 스크랩도 있었는데 -당시 신문에 한자를 혼용해서 썼던 것이 새삼 기억났다- '독창적 작가란 누구의 모방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그를 모방할 수 없는 사람이다(샤토 브리앙)'에만 형광펜이 덧칠해져 있었다. 올해 첫 책을 내고, 30여 년 전 낡은 신문 속 문장을 들여다보니 기분이 묘하다.
1995년부터는 방송작가 시절이라 기획 아이디어, 다른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 메모가 많았다. 노래나 영화 제목도 눈에 자주 띄는데, 노래(앨범) 옆 기호와 숫자는 방송국 자료실 CD 번호인 듯하다. 예전에는 라디오 생방송에서 '즉석 신청곡'을 받으면, CD를 가지러 피디나 작가가 자료실로 뛰어가곤 했었다. 요즘은 라디오에서는 음원(파일)으로 틀어주니 그런 수고로움도 없어졌겠지.
옛날 수첩을 버리고 시심(詩心)을 찾다

▲옛날 수첩을 다시 펼쳐 보며 가장 놀란 것은 필사한 시(詩)가 무척 많았다는 것이다. ⓒ pixabay
나의 옛날 수첩을 다시 펼쳐 보며 가장 놀란 것은 필사한 시(詩)가 무척 많았다는 것이다. 김광섭 시인의 '밤'은 2개의 수첩에 각각 적혀 있었다. 93년에도 95년에도. 나는 이 시를 많이 좋아했었나 보다. 어느 시 구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어두운 공허에/네 모습 차라'였을까. '그대 없는 밤 비인 잔/ 외로움 모여든다'였을까. 별다른 메모가 없으니 이유 또한 알 수 없다.
시를 가만히 낭독해 본다. 좋구나. 나는 시를 좋아했었나? 그렇다. 시를 쓰지 않았지만, 신춘문예 당선 시 모음집을 따로 사서 모았던 기억이 났다(심사평에 실린 낙선된 사람 중에 같이 일하던 방송국 PD 이름이 있어 아는 척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내가 20년 넘게 시를 잊고 살았다. 수첩에 베껴 쓴 시를 읽다 보니 내 마음에 시심(詩心)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마침 동네서점 도화북스에서 진행한 동네 배움터 '그림책과 시, 도시생활자를 만나다' 강의를 들었다. 수업 중에 소개받은 오사다 히로시 시집 <세상은 아름답다고>를 요즘 읽고 또 읽는다. 매일 영양제 먹듯이 매일 시를 읽다 보니 원문이 궁금해 원서도 샀다. 시집을 교재 삼아 한동안 멈췄던 일본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물건을 비운 곳에 새로운 호기심으로 채워진다. 멈췄던 것이 다시 시작된다.
지나온 시간에 미련을 갖지 않기를
아이들의 물건은 '추억 상자'라고 이름 붙인 폴더 밑에 구분되어 저장되었다. 내 수첩 12권은 워드로 35쪽, 80KB짜리 파일 1개로 정리되었다. 마음이 가뿐하면서도 한편, 지금까지 잘 간직한 생생한 추억까지 버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과 아쉬움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때 영화 <와일드>의 한 장면이 생각났다.
폭력과 가난, 외도와 약물로 삶이 엉망인 셰릴 스트레이트는 거리가 4300Km에 달하는 미국의 악명 높은 도보여행 코스 'PCT(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에 도전한다. 길을 떠난 지 2주 만에 처음 도착한 야영지에서 만난 터줏대감 애드는 물집과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발을 본다. 그는 셰릴에게 짐을 줄여야 한다며 함께 점검해주다가 트래킹 가이드북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부분을 죽 찢어 버린다. 되돌아가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 아이들의 어릴 때 물건이나 나의 옛날 수첩 또한 지나온 길이다. 더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미련을 툭툭 털어본다. 추억은 물건에 머물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전된 기술이 기억과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간편하게 사진 찍고, 간단하게 간직하며, 언제든지 다시 꺼내 볼 수 있다. 과거의 물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