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이야기가 끌리는 계절이 있다. 읽고 나면 체온을 1도쯤은 내려주는 이야기를 찾게 되는 때다. 몸을 웅크리면서도 계속 얘기해 달라고 조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옛날옛적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전래동화로부터 <전설의 고향>과 <심야괴담회>에 이르는 TV프로그램까지 사람들 곁을 맴돌고 있다.
무엇이나 제대로 즐기면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어진다. 그럴 때 집어 드는 게 책이다. 1990년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읽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도 그런 책이었다. 풍문에 실린 괴담을 글 솜씨 좋은 김혁씨가 엮은 것으로, 한번 쯤 들어보았을 무서운 이야기가 기승전결을 갖춰 한 편의 손색없는 단편으로 모여 있다.
그러나 그 시절 아주 많은 것들이 그렇듯 괴담 역시 본래의 우리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터가 알고 보니 공동묘지라거나 과학실이나 음악실 같은 학교 특별실습실에서 귀신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것이 죄다 그렇다. '빨간휴지 파란휴지'로 유명한 괴담 역시 1930년대 일본 관서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학교 동상(이순신, 유관순, 세종대왕 등)이 자정이 되면 움직인다는 얘기는 니노미야 긴지로 동상 괴담에서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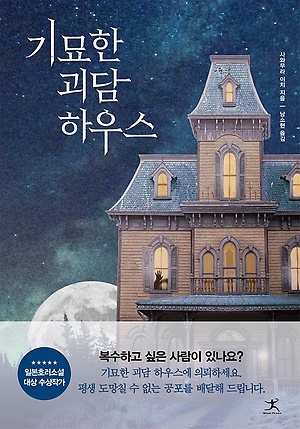
▲기묘한 괴담 하우스책 표지 ⓒ 북플라자
일본 호러소설의 기수, 사와무라 이치 단편선
괴담의 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호러문학도 발달했다. <보기왕이 온다>로 일본호러소설 대상을 수상하며 등장한 사와무라 이치는 일본 호러소설의 기수로 손꼽히는 작가다. 한국에도 적잖은 팬을 둔 그의 소설은 읽는 이의 예상을 깨는 반전과 현실 사회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소재로 재미는 물론 작품성까지 갖췄다.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도 이치의 소설이 연달아 소개됐다. 8월 한 달 동안 아르테가 <예언의 섬>을, 북플라자가 <기묘한 괴담 하우스>를 출간한 것이다. 둘 모두 장르소설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웹소설 생태계 속에서 예비작가를 꿈꾸는 이들은 이치의 작품을 하나의 교본으로 돌려보는 경향까지 발견되고 있다.
<기묘한 괴담 하우스>는 이치가 써낸 괴담 모음집이다. 300페이지 남짓의 작은 책에 일곱 편의 괴담이 실렸다. 이야기별로 편차는 있지만 대개 일상을 파고들어 독자의 허를 찌르는 유의 괴담이다. 귀신인지 인간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출현하여 법과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진실을 깨우고 뒤집는다. 무책임한 공포의 나열 대신 현실을 서늘하게 짚어내는 솜씨가 일품이다.
경기침체 속 범람하는 사이비를 소재로
내겐 이중 두 편 정도가 인상적이었다. 미혼모와 그 딸이 등장하는 '구원과 공포'는 두 번째 순서로 실린 작품이다. 책은 두 개의 시점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이고, 다른 하나는 미조구치 츠요시라는 중년 사내를 중심으로 하는 전지적 작가다.
나의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며 나를 키운다. 도움을 주는 이가 없는 어머니의 삶은 모든 것이 힘겹다. 어머니는 중고제품을 파는 곳에서 '파워스톤'이라 불리는 액세서리를 구입한다. 심령술사가 오라를 주입해 판다는 조악한 액세서리지만 어머니는 이걸 산 다음날 의외의 횡재를 하게 된다. 모처럼 평소와 다른 길을 걷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 길에서 복권 하나를 주웠으며, 그 복권이 10만엔에 당첨된 것이다. 어머니는 '파워스톤이 이끌어 준 거야'라고 말한다. 파워스톤을 파는 마나 리가야에 뻔질나게 드나들게 된 것도 그 이후부터다.
츠요시는 마나 리가야의 실질적 운영자다. 보이스피싱 따위를 하던 그는 삼류 심령술사인 쿠시나다 세이라를 스카웃해 마나 리가야의 대표로 앉힌다. 외국에서 싸구려 물건을 사들여서는 심령술사의 오라를 주입했다고 팔아치우는 게 그의 일이다. 가난뱅이들이 효과가 있다고 믿기만 하면 윈윈이 아닌가, 그렇게 그는 제 사기를 정당화한다. 마나 리가야에 중독된 이들은 이곳에서 파는 물을 마시고 세이라에게 돈을 갖다 바치며 영적인 교육을 받기에 이른다. 그중엔 나의 어머니도 있다.
현실과 상상의 공포적 결합
소설은 현실에 얼마든지 존재하는 사이비와 비합리적 다단계 업체의 모습에서 모델을 따왔다. 늙고 가난하고 인간관계가 별로 없으며 분별력이 부족한 이들을 타깃으로 삼아 몸집을 키운다. 이미 한국에서도 비슷한 모델이 수두룩하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대 사기를 치는 조직을 일류 로펌이 변호하는 경우도 흔하게 마주한다.
이치가 이 같은 문제를 공포의 소설로 활용하는 솜씨는 상당히 세련되었다. 사이비의 범람과 학교폭력 같은 문제를 공포의 소재로 삼는 가운데 사회외 외면과 독자의 몰이해를 꼬집는 역량이 대단하다.
특히 한 두 개의 단편은 깐깐한 독자라도 박수를 칠 수밖에 없을 만큼 완성도가 높다. 그저 앉아서 흘려보내기엔 아까운 책이란 뜻이다. 이치의 소설을 읽은 뒤라면 그의 책을 다른 이에게 권하고 싶어 안달이 날지 모르겠다. 내게 이 책을 소개한 이도 그랬으니.
덧붙이는 글 | 김성호 시민기자의 브런치(https://brunch.co.kr/@goldstarsky)에도 함께 실립니다. '김성호의 독서만세'를 검색하면 더 많은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