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것이 서글프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도 없다지만 한때 있었던 무엇이 아무렇지 않게 제 자리를 잃어가는 모습은 어딘지 씁쓸함을 남기곤 하는 것이다. 태어나고 마침내 죽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어서, 그리하여 정든 무엇을 거듭 잃어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만 언어 또한 변하고 사라진다. 어제 쓰지 않던 말을 오늘 쓰게 되듯, 오늘까지 있었던 말이 내일은 사라지는 일 또한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언어의 소멸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세상이 가까워진 오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사투리는 설 곳을 잃어가는 언어의 대표주자라 해도 좋다. 산과 하천을 넘을 때마다 조금씩 달랐을 우리네 언어는 어느덧 시와 도의 경계를 넘어서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비슷해져 버렸다. 온갖 것을 규격화하고 표준화하는 근대 이후 세계가 언어마저 표준화한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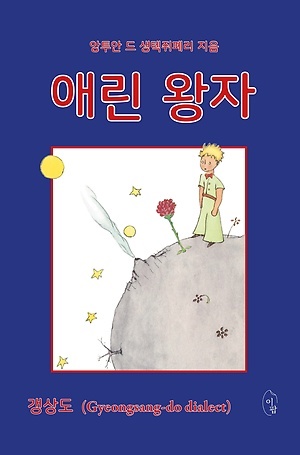
▲애린 왕자책 표지 ⓒ 도서출판 이팝
사라지는 언어, 그대로 좋으냐 묻는다
한때는 표준화 작업의 의의가 컸던 때도 있었다. 한 동네의 말이 다른 동네의 말과 크게 달라 서로 만나면 소통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같은 물건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허다하여 손짓 발짓을 동원해서야 겨우 이해하는 경우까지 적지 않았다. 독립 이후 급격하게 발전을 거듭한 문자체계와 맞물려 언어의 표준화는 한국의 지적체계를 빠르게 발전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전국 팔도 누구를 만나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오늘에 이르러, 표준어 아닌 말들의 급격한 쇠퇴는 한국의 언어자산을 얄팍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쓰는 말씨가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가 다시 정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지의 사투리가 빠르게 사라져가는 오늘의 상황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는 것이다.
2020년 출간된 <애린 왕자>란 책이 있다. 입소문을 타고 출간 3년이 지나도록 꾸준히 읽히는 이 책은 흔히 <어린 왕자>라 알려진 앙투안 생텍쥐페리의 소설과 같은 작품이다. 제목이 조금 다른 것은 이 책을 통상의 표준어가 아닌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경상도 방언으로 읽는 맛은 '다르다'
말하자면 <애린 왕자>는 <어린 왕자>의 경상도 판본이다. 말 그대로 모든 문장을 경상도 방언으로 써내려가서 이 지역 말에 익숙한 이들에겐 쉽게 읽히는 책이 되었다. 방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 읽기가 까다로울 수 있겠으나, 그래서 더욱 방언이 가진 특징이며 힘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얻기도 한다.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큰 차이가 있겠느냐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란 오묘하고 섬세한 것이어서 약간의 다름이 큰 차이를 빚어내기도 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통상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로 번역되는 <어린 왕자>의 그 유명한 대사를 <애린 왕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기레도."
"뭐라카노."
"양 한 마리만 기레달라켔는데."
-<애린왕자> 중에서
단어 몇 개의 차이만으로 <애린 왕자>의 독자는 <어린 왕자>와는 전혀 다른 감흥을 받는다. 심지어는 주인공과 그가 만난 어린 왕자의 성격이며 분위기, 인상까지가 전혀 다르게 그려지는 것이다. 이를 보다보면 아마도 프랑스와 한국, 미국과 일본, 독일과 체코에서 소설 속 인물을 전혀 다른 성격으로 상상할 수 있겠구나, 아마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언어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애린 왕자>가 가진 가장 큰 미덕이다. 같은 작품임에도 전혀 다른 감상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언어가 가진 힘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 읽기 전엔 다다르지 못했던 감상을 겪는다는 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다는 뜻이니, 이 짧은 소설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그저 생텍쥐페리가 의도한 것 그 이상이라 해도 좋겠다.
덧붙이는 글 | 김성호 서평가의 얼룩소(https://alook.so/users/LZt0JM)에도 함께 실립니다. '김성호의 독서만세'를 검색하면 더 많은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