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은 총총한 별들이 있어 아름답다. 그러나 하늘의 별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유할 수 없다.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를 비유할 때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속담을 쓴다.
하늘의 별 따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의 별을 따고자 했다. 보다 정확하게는 그런 표현을 해오고 있다. 대중가요에도 이런 사례가 여럿 나타난다. 그 중 이장희가 1974년에 발표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의 경우를 보자.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이장희 작사 작곡,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1974.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겠다고 했다. 가슴 터질 듯한 사랑의 열망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자 '하늘의 별 따기'라는 불가능을 끌어들인 것이다. 대중가요에 유사 사례는 적지 않다. 양정승의 '밤하늘의 별을', 유리상자의 '하늘에서 별을 따다', 신혜성의 '별을 따다' 등이 그런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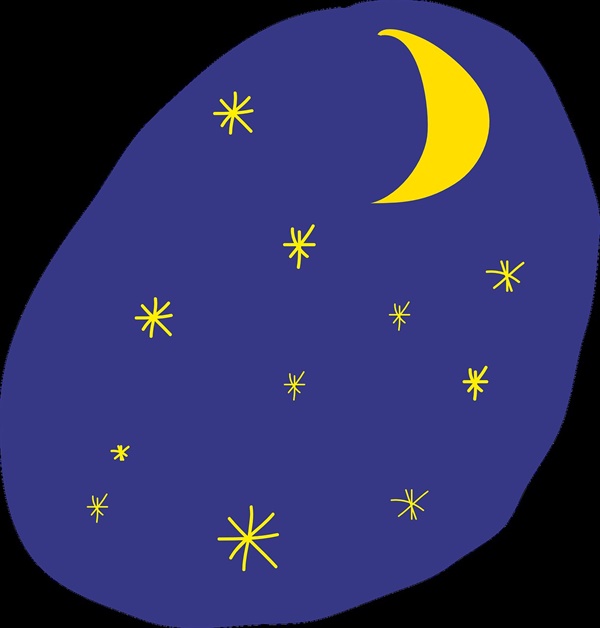
▲밤하늘의 보석달과 별은 밤하늘의 보석이다. pixabay 제공 부료이미지. ⓒ cat6719
구전동요에도 별을 따는 노래가 있다. 구전동요의 별노래는 '별하나 나하나 별둘 나둘 별셋 나셋 ---' 하면서 별을 헤는 '별하나 나하나'가 알려져 있지만, 다음의 '별하나 따서'도 이에 못지않게 널리 불러왔다.
별하나 똑따
겻불에 구어
툭툭 털어
망태에 넣어
동문에 걸고
(이하 서문, 남문, 북문)
-김소운, <조선구전민요집>, 1933, 울산.
별을 따서 겻불에 구웠다. 겻불은 쌀겨를 태우는 불을 말하며, 불기운이 미미한 약불이다. 약불에 무엇을 구울 때는 태우지 않고 충분히 열을 가해 속까지 익히려 함이다. 이렇게 하늘의 별은 지상에서 가공되었다. 환언하면 지상의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나 가공된 별은 지상의 여느 것들과 다른 존재이다. 별이 우주의 기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별을 약불로 가공한 것도 그 신성한 기운을 손실 없이 그대로 지켜내기 위함이다. 겻불에서 별을 꺼내 재를 털고 망태기에 담았다. 그리고 동문을 비롯한 사대문에 내다 걸었다. 이로써 하늘의 신성한 기운이 사대문에 놓였다.
동서남북의 사대문은 성문이다. 도성을 지키고 방어하는 문이며, 또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문이다. 그러므로 사대문에 별을 따다 건 것은 그 신성한 기운으로 도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적, 또는 전염병 같은 나쁜 것들로부터 도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우리는 '별하나 따서'가 국태민안, 곧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기를 소망하는 주술적 성격이 있음을 알게 된다. 버전에 따라서는 가공된 별을 탱자나무에 걸기도 하는데, 민간에서는 탱자나무가 나쁜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이 경우 역시 별을 따서 방역과 방어를 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어서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
시대에 따라 문화가 달라짐은 자연스럽다. 별 따기 모티프도 노래에 따라 쓰임이 달랐다. 대중가요는 그것을 물리적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켜 그 효과를 노리는 사랑의 표현기술로 활용하였고, 구전동요는 삶의 평안을 소망하는 주술적 표현으로 그 모티프를 활용했다.
지금 우리는 불통 정치의 답답함, 고물가의 경제적 짓누름, 의정 대치의 불편함과 불안함 등을 겪으며 살고 있다. 여기에 미중 갈등, 북유럽과 중동의 전쟁 등으로 국제적 환경 또한 시끌시끌하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필자에게는 별 따기 모티프도 구전동요의 것이 더욱 눈에 들어온다. 별을 따다 겻불에 구워 망태기에 넣어 사대문에 걸고 싶다. 국태민안의 소망을 기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