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네 삶을 두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다'는 말을 한다. 하루하루가 같진 않지만, 결국은 거기서 거기 가는, 또는 그것이 그것인 삶을 반복하며 지낸다. 눈 비비고 일어나 서둘러 출근하고, 일터에서는 어제고 그제고 해오던 업무를 수행하다 돌아오곤 한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따지고 보면 가사, 사교, 취미 등 온갖 삶의 내용들이 사이클만 다를 뿐 거듭 반복된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다르지 않은가보다. 의미와 시각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에 '쳇바퀴 인생'을 거론한 글들이 수두룩한 것도 기본적으로 삶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일 것이다.
쳇바퀴 도는 삶이다 보니 우리 일상은 일정한 패턴이 되어 있다. 누군가 나를 한동안 관찰한다면 그 이후에도 그는 내가 어느 시간대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프리랜서인 나는 오전 10시쯤 커피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뒤 노트북을 켠다. 거의 예외없이 반복되는 일상이다.

▲쳇바퀴 도는 일상출산과 육아는 하루하루가 비슷한 일로 분주하게 한다. 그런 중에 아이는 어느덧 무럭무럭 자란다.(공유마당 제공 이미지) ⓒ 한국저작권위원회
아이들 눈에는 어른들의 일상이 어떻게 들어올까? 구전동요 중에 당시 아이들이 바라본 어른들의 일상을 노래한 것이 있다. '노리개 노래'가 그것인데, 이 노래는 1926년에 엄필진이 낸 <조선동요집>에 실려 있다. 오래된 것이어서 편의상 현대어로 바꾸고 다소 다듬어 적는다.
울아버지 노리개는 담뱃대가 노리갤네
울어머니 노리개는 막내딸이 노리갤네
오라버니 노리개는 이야기책이 노리갤네
우리형님 노리개는 바늘골무가 노리갤네
우리머슴 노리개는 쟁기소가 노리갤네
우리어멈 노리개는 함박쪽박이 노리갤네
- 엄필진, <조선동요집>, 1926, 전남 나주
아이는 집안 사람들의 일상을 무언가 가지고 노는 놀이로 인식했다. 아버지는 담뱃대를 수시로 입에 대며 놀고, 어머니는 틈만 나면 막내딸을 데리고 논다.
오빠는 이야기책(소설책)을 끼고 놀고, 올케는 바느질거리를 손에 들고 논다. 그리고 머슴은 쟁기와 소를 데리고 놀고, 어멈은 함박과 쪽박의 살림살이를 매만지며 논다(가사 속 이 '어멈'은 남의 일을 해주는 나이든 여인을 뜻한다).
집안사람들의 일상을 놀이로 바라본 아이의 발상이 흥미롭다. 자신의 일상이 노는 일인 것처럼 세상도 그리 바라본 것일까?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이 일상적으로 다루는 물건들을 노리개로 여겼다.
덩달아 막내딸도 어머니의 노리개가 되었다. 노리개는 심심풀이로 가지고 노는 물건이다. 자신도 집안의 이런저런 물건을 갖고 그러저러한 놀이를 하는 일이 있기에 그런 생각이 가능했겠다.
그러나 세상일이 어디 놀이일 수 있겠는가? 아이들의 천진함이 예뻐 보인다. 그 시각대로 세상일을 굳이 놀이에 빗댄다면 그것은 게임에 해당할 것이다. 놀이 중에도 경쟁을 하며 승부를 내는 것이 게임이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쳇바퀴 삶의 본질적 성격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이다. 좀처럼 멈출 수 없는 일상이다. 위의 노래에서 머슴과 어멈의 일상이 그런 것이다.
경제활동은 쉼없이 경쟁과 긴장을 유발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대로 정말 세상일이 놀이라면 좋겠다. 놀이는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의 일상도 그만큼 가벼워질 것이다. 요즘처럼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고, 또 사회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그런 소망은 더욱 절실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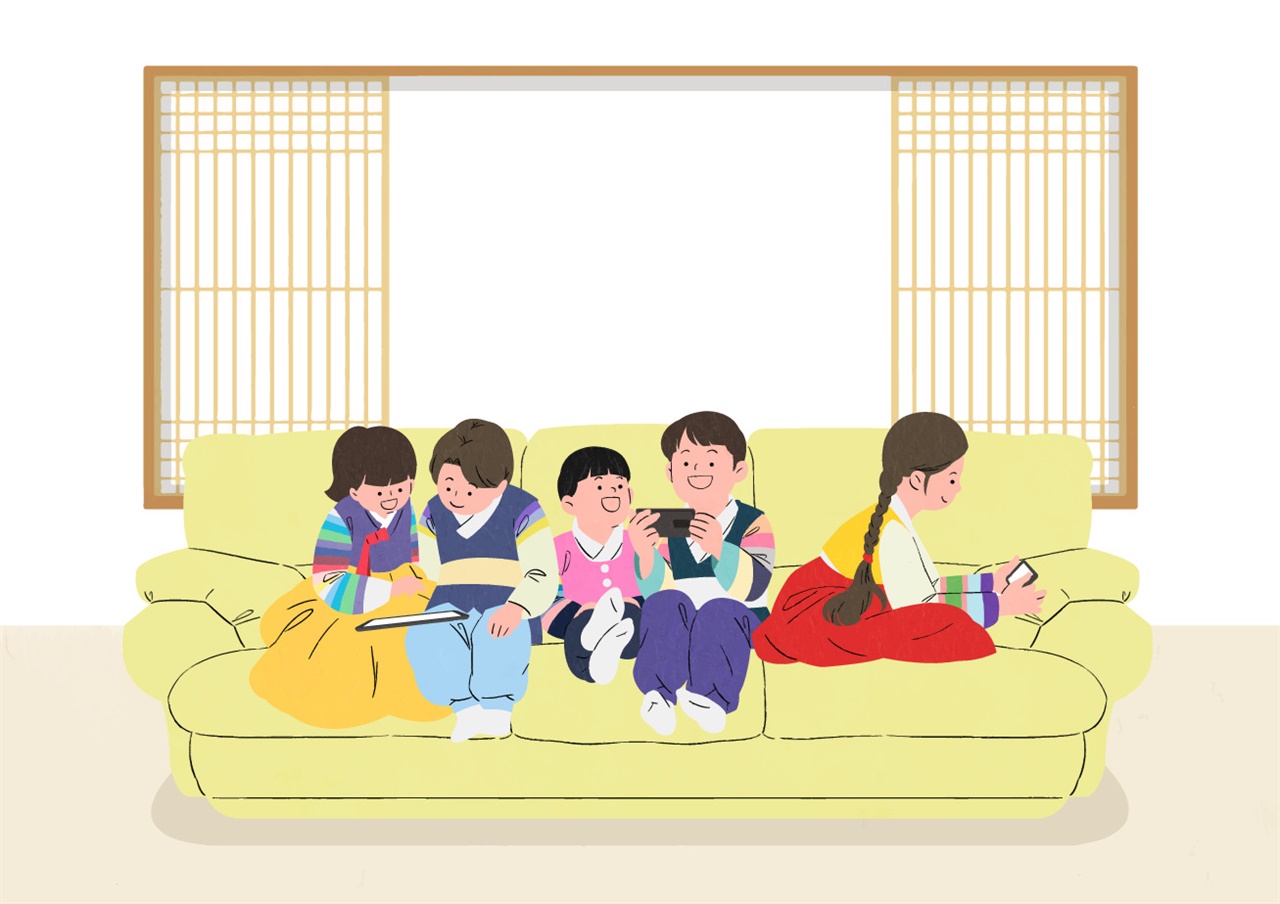
▲명절은 아이들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명절은 긴장 이완을 위한 시간이다. 아이들의 놀이정서와 마음으로 온가족이 행복해지는 시간이다.(공유마당 제공 무료이미지) ⓒ 한국저작권위원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어른들도 아이들의 천진한 생각처럼 세상일이 놀이인 양, 그런 마음과 정서로 '쳇바퀴 인생'의 노고를 다소라도 달래야 하지 않을까? 문득 이해인 수녀의 시 '달빛기도–한가위에'가 떠올라 그 마무리 부분을 아래에 적는다.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