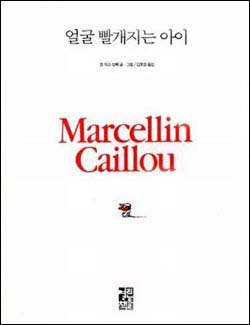
▲<얼굴 빨개지는 아이> 책표지 ⓒ 열린책들
21세기는 개성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매력을 내뿜고 있다. 또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어느 정도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사회의 다양성이라는 말은 통계학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남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분명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다. 개성이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틀 안에서 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원초적으로는 같은데, 거기서 조금씩 빗겨나간 것을 개성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남과 다름의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한다.
심지어 남과 다름을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 말과 행동 등 여러 가지를 스스로 제약해버려 가두어버린다. 이것이 과연 개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어떤 아이는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빨개져서 고민이란다. 그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기로 하자. 다름이 아니라 장 자끄 상뻬의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이다.
이 책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으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좀머씨 이야기> <꼬마 니콜라>의 삽화가로 유명한 저자는 개성과 색깔을 주장하면서도 극도로 다름을 꺼려하는 현대인들의 문제점을 재미있으면서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 책의 주인공 꼬마 마르슬랭에게는 큰 고민이 있다. 바로 시도 때로 없이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이다.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늘 혼자 놀아야 하고, 창피한 마음에 고통이라 생각하는 마르슬랭.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갛냐는 똑같은 질문을 듣는다. 반복되는 그 질문에 답하는 데 지쳐 마르슬랭은 혼자 다닌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재채기 소리. 얘기 도중 계속해서 재채기를 해대는, 그래서 마르슬랭과 똑같이 남들과 '구별'되는 아픔을 안고 사는 르네를 만나게 된다. 서로는 특유의 연대감으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다. 둘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을" 만큼 친해진다.
"그들은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 그들은 짓궂은 장난을 하며 놀기도 했지만, 또 전혀 놀지 않고도, 전혀 말하지 않고도 같이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전혀 지루한 줄 몰랐기 때문이다" (본문 중)
남들은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그들에게 그것은 특유의 연대감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문제가 되는 장애가 아니다.
이렇게 이 책의 주인공들은 남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얼굴 빨개지는 아이와 재채기 하는 아이. 이들의 우정이야기로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의 자화상을 볼 수 있다.
특히 평범한 이야기를 좀 더 인상깊게 만드는 것은 저자의 그림 덕분이다. 저자는 캐릭터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러스트로 잘 표현하고 있으며 에피소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림을 보면 작은 동작과 모습이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마르슬랭이 외톨이가 되어 가는 모습을 그린 장면이나, 르네와 함께 즐거운 시절을 보내는 정경과, 장년이 되어서 다정하게 풀밭에 앉아 있는 광경을 보면 저자의 그림이 글을 이끌어 가는 중심축임을 알 수 있다.
분명 텍스트만으로는 불충분한 감동을 그림이 대신해주고 있다. 평면에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는 그림이고, 글과 함께 어우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우리들의 편견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주변을 잠시 돌아보면 마르슬랭과 르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쉽게 말이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는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벌레 보듯 보거나,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유심히 관찰을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센스. 참으로 우리는 편견덩어리임에 틀림없다.
추운 겨울 조금이나마 이 책을 보며 우리의 편견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길 바란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 남과의 다름을 꺼려하지 말길, 오히려 그 다름을 즐겨보시길 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