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  | | | ▲ 하늘이의 신문지 여우꼬리 | | | ⓒ 정학윤 | 우리 집 아이들 딸 셋의 이름은 '밝음' '푸름' '하늘'이다.
원래는 '밝고 푸른 하늘 (같은) 우리'까지 4명을 생각했으나, 유전유학 무전무학(有錢有學 無錢無學)의 대물림이 겁나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 '우리'는 생산하지 못했다. 당연하게도 막내인 하늘이는 늦둥이다. 첫째 밝음이가 고1인데 녀석은 이제 다섯 살이니 언제 다 키울까 싶다. 그러나 늦둥이와 함께 하는 재미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바가 없으리라.
하늘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다. 첫째를 유치원에 보냈을 때나 둘째를 유치원에 보냈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에 배워온 말이 '내꺼야'라는 단어여서, 그도 집단에 속한 처음의 경험을 '내꺼야'라는 말로 시작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으로 보나 집단의 질서유지 필요성이라는 측면으로 보나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 어찌 흉이 될까마는, 때로는 친구에게 양보하고 친구를 토닥일 줄 아는 아이의 넉넉함이 집단에 편입되면서 자기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해나가는 것에 정작 부모인 우리가 적응하기 쉽지 않았던 탓이다.
하늘이는 유치원 대신에 '공동육아'를 통하여 그 나이에 필요한 사회성이나 또래들과 어울리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기초를 배우고 있다. 공동육아란 몇 집의 엄마가 가세하여 역할을 분장하고, 아이들의 모임장소를 매일 각 집으로 순회하며 해당 집 아이의 엄마가 일일교사가 되어 가르치는 형태이다. 일종의 홈스쿨 같은 것이다. 아이의 성장과정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는 날도 있고, 교육일지를 적어 돌려보면서 아이집단의 문제점이나 제안을 공유해 나가기도 한다. 그들에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온화한 시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자부심 같은 것이 있을 거다.
맞벌이 부부에겐 뜬소리 같은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그 역시 대안은 있다. 약간 큰 규모의 '공동육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극성스런(?) 엄마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순회하는 형태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장소를 지정하여 공동육아를 하는 모임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불합리한 세태가 못마땅하다. 우리는 내 아이가 다른 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여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라는 주문서를 낼 마음이 없다. 내 아이가 항상 넉넉하고 항상 빛나지는 못하더라도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만을 고집하지 않는 인간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다. 아이에게 쥐어주는 이런 시간과 계기가 그것을 잉태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시대에 동떨어진 부모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묵묵하게 이를 지켜갈 것이다.
아이들은 태어난 것만으로 부모에게 해야 할 평생의 효도를 다했다고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더 이상 얻어야 할 것은 없는 셈이다. 아이를 아이답게 두어야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답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역시 여느 집의 막내들처럼 소란하고 어리광투성이의 아이다. 늦둥이 키우기는 첫째와 둘째를 키우는 재미와는 또 다른 맛이 있다. 그의 기발한 놀이를 선보이고자 한다. 신문지를 뒤춤에 집어놓고 여우꼬리라고 하며 폴짝거리거나, 국수를 두 가닥을 입에 물고 곤충의 더듬이라고 하며 고개를 흔들며 뛰어다니거나, 장난감 블록으로 스케이트 놀이하기, 엄마의 등 뒤에 숨어서 '누구게?' 반복하기 등등이다.
 | | | ▲ 국수 두 가닥을 입에 물고 곤충의 더듬이라고 합니다 | | | ⓒ 정학윤 | |
 | | | ▲ 자그만한 블럭으로 롤러를 타지요. 넘어지는 것 걱정. 애구~ | | | ⓒ 정학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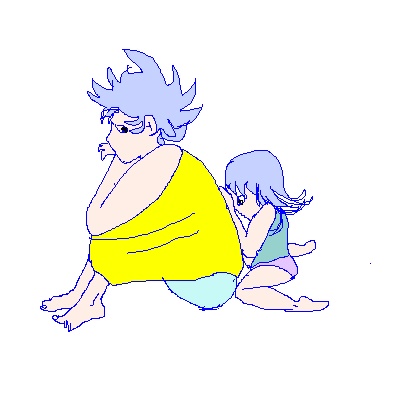 | | | ▲ 누구게? | | | ⓒ 정학윤 | |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