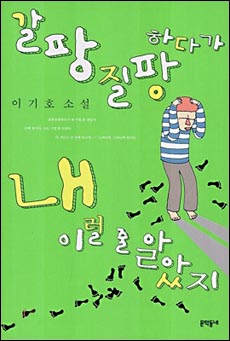
▲겉표지 ⓒ 문학동네
이기호의 소설집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의 '그'는 갈팡질팡한단다. 무엇을 그리 헤매는가? 우선, 소설의 제목을 정하는 일이다. 남들은 소설 쓰기 전에 제목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는 그런 일이 어렵다. 소설을 쓰고 제목을 정하는데 여기서 갈팡질팡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설이라는 것 자체이다.
소설의 세계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이른바 문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우연'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소설은 필연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복선도 있어야 하고 고래 힘줄보다 단단한 서사구조가 잡혀 있어야 한다. '그'도 그것을 안다. 하지만 '그'의 느낌은 그것을 거부한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이, 또한 '너'와 '내'가 만나고 어울리는 일이 반드시 필연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우연하게 벌어지는 일이 많다. 그런데 소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떡해야 하는가? 갈팡질팡할 따름이다.
첫 번째 소설집 <최순덕 성령 충만기>로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던 저자가 두 번째 소설집에서는 극적인 파문을 만들고 있다. 기존의 소설을 우회해서 독자를 만나는 것이다. 저자는 낯익은 한국 소설의 지형도를 벗어나 뚜벅뚜벅 걸어왔다. 오른손에 든 것은 '허물어진 서사'다.
소설집의 여러 소설들에서, 서사는 깡그리 뭉개진다. 표제작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만 하더라도 '그'는 많이도 맞고 다닌다. 그런데 이유는 무엇인가? 없다. 굳이 찾아보면, 폭력서클이 만들어진 날에 눈에 띄었다는 이유 등이 있기는 하다. 필연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예감'이나 '전조'가 없는, 우연적인 일이다.
'국기게양대 로망스 - 당신이 잠든 밤에2'는 더 심각하다. 등장하는 세 명의 남자는 국기게양대에 매달려 있다. 한 명은 돈을 벌기 위해, 또 한 명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은 집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왜 국기게양대인가? 돈을 벌자면 경제비용을 계산해볼 때, 우유배달이 더 낫다. 아내를 찾는 것도 차라리 경찰서에 가서 들어 눕는 편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웅웅 소리가 나는 국기게양대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순간, 소설은 끝이 난다. 동시에 기존의 소설 문법은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만다.
저자가 갖고 온 건 그것만이 아니다. 왼손도 있다. 그 손에 들린 것은 '소설의 효용성'이다. 이것은 '허물어진 서사'와 맥을 같이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연/필연'의 마찰에서 빚어지고 있다. '나쁜 소설 - 누군가 누군가에게 소리내어 읽는 이야기'의 화자는 윤대녕의 소설을 좋아한다. 그런데 우연히 윤대녕의 소설과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자 똑같은 말을 입에 담는다. 그 결과는?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그 화자는 누군가에게 소리 내어 소설을 읽어주고 싶어진다. 그런데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 어느 누가, 문득 전화를 걸어온 누군가가 "소설을 읽어 주고 싶어"라고 한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노골적인 말이겠지만, 그럴 바에는 수다를 떠는 편이 그들에게 더욱 유익할 것이다. 읽어줄 사람을 찾지 못한 화자가 결국 택한 것은, 여관에서 불러준 아가씨다.
화자는 어이없어하는 아가씨를 간신히 설득해서 소설을 읽어주려 한다. 소설처럼 허리띠도 풀고, 바지 지퍼도 좀 내리고, 엄지발가락이 얼굴을 향하도록 쭉 당기게 해보고, 배에 힘을 주게 하고 소설을 읽어주려 한다. 그래서 소원성취를 하는가? 소설은 나쁜 소설이 되고, 그것은 먼 곳 어딘가에 띄엄띄엄 사라지고 만다. 어이없게도, 혹은 당연하게도.
저자의 소설은 여러모로 낯설다. 하지만 당황스럽지는 않다. 비록 과거의 것에 비하면, 확연히 다르지만, 이것 또한 소설을 향한 하나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정식 야채볶음흙', '당신이 잠든 밤에', '수인' 등에서 나타나듯 저자는 소설이 말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소설이 아니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잘 나가는 사람들과 거리가 먼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한 존재들을 위한 향연으로써 소설의 효용성을 알고 있는 것이다.
기실 저자에게 소설의 형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소설의 많은 규칙들은 갈팡질팡하게 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소설이 현실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저자는 그것을 위해 과감하게 우회하여 돌아온 것이다. 치열한 고민 의식이 보이기 때문인가.
저자의 소설은 농담 같지만, 돌아선 뒤에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다. 찰리 채플린의 쇼를 보는 것처럼 가볍지만 묵직하고, '구라'가 만발해도 진실함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신인 작가의 패기가 묻어났던 첫 작품이 '직선'이라면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는 '곡선'에 가깝다. 처음에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내 여유가 묻어나 큼지막한 원을 그리기 위한 곡선을, 새침하고 발랄하고 때로는 우습게 휙휙 그려가고 있다. 덕분에 <최순덕 성령 충만기>의 여운과는 다르지만, 그것만큼 인상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알라딘 개인 블로그에도 게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