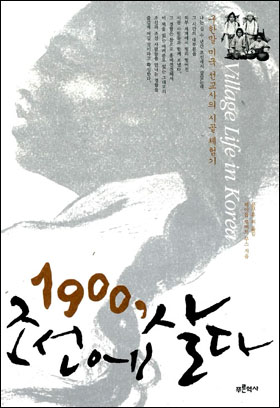
▲<1900, 조선에 살다-구한말 미국 선교사의 시골 체험기>겉그림. 제이콥 로버트 무스(한국명 무야곱) 지음. ⓒ 푸른역사
지금 한국이 서울을 수도로 삼고 있기에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를 떠올릴 때 자연스레 서울을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수도를 보는 기대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일부러 시선을 주지 않는 한 그 나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시골을 발견하는 이들이 결코 많지 않을 게다.
도시, 우리가 도시를 본 게 얼마나 되었나. 몇 천 년, 아니 몇 백 년도 아니고 딱 100년만 되밟아 보아도 도시라는 말 자체가 너무도 생소했던 시대를 만날 수 있다. 온 나라가 사실상 시골이었고, 시골이 없다면 나라가 서 있을 땅 자체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던 시대가 딱 100년 전까지도 있었다. 아니, 지금도 시골이 없다 여기는 순간 우리는 허공에 떠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도 그런 시골을 참 많이도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사는 것만 같다. 분명히 있고 또 분명히 중요한 우리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시골은 참 서글픔이 많이 배어있는 곳이다. 그러나 서글픔이 오래도록 깊숙이 배일수록 그만큼 해학도 넘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나 싶다.
찢어지게 가난해도 오히려 더 입이 찢어지도록 호탕하게 웃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시보다는 시골과 더 잘 어우러지는 이들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도 고향이라면 누구랄 것 없이 시골을 떠올리는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도시가 시골을 잡아먹는 시대에도 여전히 시골을 고향과 같은 말로 여기고, 그러면서도 도시 문명을 더 선호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뒤섞이는 틈 사이로 한 '푸른 눈'이 우리보다 더 진한 호기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골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100여년 전, 이 나라 시골이 지금보다는 더 온전하고 더 자연스럽던 시절에 그 시골들을 참 진지하게 담았던 사람이다. 이름이 제이콥 로버트 무스(이하, 무스)인 그는 선교사였다. 그가 바라본 우리나라 시골은 어떤 풍경이었고, 그 속에서 살던 우리 시골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문득 그의 낯선 시선을 따라 '조선의 뿌리'를 본다.
"조선은 시골 마을들로 이루어진 나라"옮긴이 문무홍은 지난 2005년 7월 미국방문 중, 오하이오 주의 클리블랜드에서 그 주를 대표하는 한 가문의 미국인 지인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다. 그것은 오래 전 우리나라에서 살다 간 어느 선교사 이야기였다. 그리고 선교사 이야기의 중심은 흥미롭게도 시골이었다.
선교사는 그 미국인 지인의 외증조부이며 1890년 중반부터 20여 년간 한국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 기간 선교사는 조선 시골을 다니며 여간해서는 기록에 남을 수 없는 이들을 참 정성스레 역사에 남겼다. 그 기록이 지금 <1900, 조선에 살다>(제이콥 로버트 무스 지음/푸른 역사 펴냄)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 원제는 <Village Life in Korea>인데 그가 우리나라 시골을 깊이 마음에 두고 유심히 관찰했음이 제목에 잘 드러났다.
무스(1864~1928, 한국명 무야곱)가 우리나라 시골을 얼마나 진심어린 자세로 관찰했는지는 책 곳곳에서 드러난다. 물론 그가 선교사였다는 사실도 거의 예외 없이 자연스레 드러나곤 한다. 하긴 그는 자신이 받은 '좋은 소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먼 나라를 찾아왔다. 그런 배경들을 최대한 독자들과 나누려했는지 옮긴이 설명도 자못 넉살좋게 책 본문 여기저기 퍼져있다.
그는 '좋은 소식'이 시골의 그 많은 '이름 없는 이'들에게도 충분히 전해지기를 바랐다. 그는 온 나라 곳곳에서 나라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음에도 지나치다싶을 만큼 역사의 시선에서 외면 받는 시골을 그만큼 더 사랑했다. 그가 조선 말기 시골 구석구석을 누비며 기록으로 남긴 것은 선교사의 본분에 충실히 하려는 이유 외에도 이처럼 조선의 시골 마을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벼가 익어 수확할 때가 되면, 농부는 즐겁게 논에 와서 문자 그대로 낫을 댄다. 아마도 보아즈의 수확꾼들이 황금 곡식을 수확한 후 모압의 미인들에게 흩어진 이삭줍기가 허락되었을 때[<룻기> 2장 1~9절의 내용-옮긴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연장일 것이다. 낫은 대략 30센티미터 길이의 약간 굽은 날을 지니고 있으며, 손으로 단단히 잡을 수 있을 만한 나무 손잡이가 달려 있다. 농부는 한 손에 낫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볏단을 움켜쥐고는 땅 바로 윗부분을 빠른 속도로 베어낸다. 그러고는 보통의 밀 짚단 크기로 묶은 다음, 소와 사람의 등에 실어 탈곡장으로 볏단을 옮긴다."(<1900, 조선에 살다>, 178)무스는 조선에 살던 시기 대부분을 "외부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사람들과 함께 보냈다"고 고백할 만큼 이 나라 시골을 사랑했고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가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시골에 대한 것 외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한 기본 정보 상당수는 헐버트H. B. Hullbert의 <조선의 역사History of Korea>와 기포트D. L. Gifford의 <조선의 풍속과 선교Everyday life in Korea>에서 도움을 받았다. 어쨌든 그의 관심은 분명 "대지 위에 발을 붙인 채 제도와 인습에 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현장"이었다.
외부자 아닌 내부자로서 조선을 바라본 무스이 책이 우리나라 옛 모습을 담은 여느 서양인들의 기록들과 다른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무스는 외부자가 아닌 내부자로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았다. 그런 그가 본 조선은 서울 도성이 아닌 논과 밭 그리고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농부와 생활력 강한 아낙네들의 고달픈 웃음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그곳은 시골이었다.
선교사였던 그가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만큼이나 조선 시골을 아끼고 사랑한 이유는 그곳이 나라의 근간이라는 점이기에 '기쁜 소식'도 당연히 시골에 더 깊이 퍼져야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선은 시골 마을들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표현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조선 시골을 정말 사랑했고 진심으로 역사에 남기고자 했다. 말하자면 그는 시골이 조선의 진짜 역사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Seoul'이라 부른 서울을 'soul'(영혼)과 연관시켜 '조선의 영혼'이라 불렀던 무스는 어찌 보면 수많은 시골들을 진정한 '조선의 영혼'으로 여겼는지 모른다. 그만큼 그는 우리 시골을 아꼈다. 그는 '여행객들의 쉼터, 주막'을 그려내기도 했고 '불공평한 삶으로 태어난 소녀들'과 '속박의 굴레에 갇힌 여인들'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조선의 뿌리, 농민'을 담기도 했고 '팔려가는 신부, 혼사'에 관해 기록하기도 했다. 물론 그는 선교사답게 '주님의 참 일꾼, 조선의 신도들'을 찾아서 시골 곳곳을 누비는 사이 자연스레 '조선의 미래, 마을 교회'를 상상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조선의 시골들을 마음에 담고 품은 기대는 다른 선교사들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선교사라는 위치가 아니었더라도 그는 조선 시골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게 분명하다. 그리고 1952년에 생을 마감한 그의 부인 메리 매그놀리아 더함 무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게다.
"조선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지금 기독교가 마을 사람들의 삶에 불어넣고 있는 힘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교회가 시골 사람들의 교회라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도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거나 도시인들의 생활을 변모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은 대다수 사람들이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나라이다."(319쪽)조선의 영혼이요, 뿌리인 '시골'이외에도 무스는 설날 풍경, 상투 튼 남자와 댕기머리 남자의 묘한 차이 등 생활 속 장면들을 세심하게 바라보았다. 집 짓는 목수들 외에도 도기, 곰방대, 짚신 등 생활물품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깊이가 있다. "조선의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큰 장터에는 모두 나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만큼 그는 땀과 노력으로 조선을 기록했다. 이렇듯 그는 '조선의 영혼'이요 '조선의 뿌리'인 시골을 정성껏 기록했다.
옮긴이는 온 몸으로 기록한 무스의 조선 시골 체험기에 간간이 설명을 달았다. 그가 잘못알았거나 독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옥에 티' 같은 그런 것들이 땀 흘린 정성이 듬뿍 담긴 이 책의 진가를 반감시키지는 않는다.
'구한말 미국 선교사의 시골 체험기'(부제)를 따라 우리 옛 시골 풍경을 살피다보면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래서 잊고 지낸 많은 우리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게다. 그리고, 무스 선교사가 본 그 때 그 시골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아니어도 분명 기꺼이 참여할 만한 의미 있는 시간 여행임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당시 조선을 노리던 일본의 야심도 틈틈히 엿볼 수 있는 이 책을 보는 일에 무심한 마음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지하고 따뜻한 마음을 애써 준비해주었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1900, 조선에 살다> 제이콥 로버트 무스 지음. 문무홍 외 옮김. 푸른역사, 2008. 1만5000원.
책 앞 부분에는 옮긴이의 말, 지은이의 외증손자인 제프리 폴 제이콥스의 한국어판 서문, 지은이 소개글, 지은이의 서문(1909년 8월 20일 조선의 춘천에서 제이콥 로버트 무스), '이 책에 대하여'(1911년 3월 2일 테네시 주 내슈빌에서 월터 R. 램버스Walter R. Lambuth)등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