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번쯤 '문학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가'라는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 자본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결코 자본에 대해 혹은 자본주의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고자 함은 아니다. 여기 '자본'에 의해 '고용'된 문학가가 써 내려간 가장 자본주의적인 에세이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알랭 드 보통의 <공항에서 일주일을>이란 에세이가 그것이다. 부제 '히드로 다이어리'가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명쾌한 사실은 이 책이 프랑스의 공항 터미널 히드로의 소유주가 이 시대 명망 있는 에세이스트를 고용하여 이 책을 쓰게 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자본에 의해 고용된 문학인이 창작한 '생산물'이다.
혹 문학과 자본은 별개의 것이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한국의 문인들 가운데 이상(李箱, 본명 김해경)을 떠올려보길 권한다. 다방에 딸린 골방에서 나름의 문학 세계만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상, 그러나 식민지의 땅에서조차 찻집을 개업하며 생계를 걱정했던 이가 이상의 다른 이름 김해경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려볼 수 있다. 문학의 운명, 글쟁이의 운명이란 본디 그런 것이 아닐까.
나는 문학인의 운명이란, 자본주의에서 한 걸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는다. 설사 어느 글쟁이가 홀로 글을 쓰고, 홀로 글을 소비(?)한다고 하여도, 그가 글을 쓸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자본의 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라는 작가의 앞에서 '펜을 잡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자본의 은총입니다!'라고 바뀌어야만 한다.
자본주의에 가려진 감정을 살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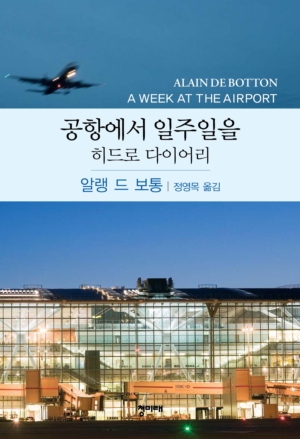
▲알랭 드 보통의 <공항에서 일주일을>저자는 2009년 여름, 공항 터미널 소유주의 초청을 받는다. 그리고 공항의 첫 '상주작가'가 되어 여행, 일,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 다룬 이 책을 쓰게 된다. ⓒ 청미래
<공항에서 일주일을>은 이토록 자본주의적인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이 저자를 '고용'한 터미널의 소유자에게 '매수되지 않은' 까닭,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마땅히 읽어야만 하는 까닭은 우리의 감정조차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모순되는 말이지만, 이 책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책이며 동시에 가장 반자본주의적인 책이다. 이 책은 공항 터미널을 기점으로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기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관통하는 명제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감정조차도 자본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혹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자본이 감정을 '응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적어도 이 책이 자본에 의해 고용된 문학인이 응시한 감정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접근-출발-게이트 너머-도착의 순으로 이루어진 이 에세이집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출몰한다. 때론 당황이, 때론 사랑이, 때론 기쁨이, 때론 분노가. 이 모든 것들을 감정이라 부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것을 감정이라 말할 수 있다면 이 책은 감정에 대한 관찰의 기록이라 할만하다. 물로 그 감정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공간 터미널 히드로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인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 그들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감정들이다.
이 책의 저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낙관하여, 존재에 풍토병처럼 따라다니는 좌절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한다.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공황에서 발길을 돌려야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열쇠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여행계획이 늘 확실하게 이행되는 세계에 대한 믿음,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무모할 정도로 순진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57~59쪽)어느 연인이 키스하는 한 장의 사진이 가운데 놓여있는 저 문장들을 읽으며 나는 제일 먼저 '감정' 그 자체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감정들 특히 '분노'가 '문학은 자본에 저항한다'라고 믿는 순진한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문학은 자본에 저항하는가. 자본주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인식되었던 문학인들, 과연 정말 그은 자본(주의)에서 자유로웠을까? 나는 이러한 물음 대신, 문학이 자본주의에서 거리가 있다는 암묵적 합의가 누가 만들어낸 신화인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토록 자본과 감정은 항상 뒤얽혀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단 한 순간도 감정은 자본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하루를 보내며 갖게 되는 변화무쌍한 감정들, 이를테면 근대적 감정들은 결코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내 주위에 있는 손님들은 부자의 상투적인 틀에 전혀 들어맞지 않았"(127쪽)다는 저자의 진단이 혹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무조건적으로 자본에 저항하고자 외치는 이들이 있다면, 그리고 문학이 자본과 동떨어져있다고 믿는 순진한 이들에게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라 권하고 싶다. 누군가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본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대인이 자본주의에 날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대지에 뿌리박고 하늘을 지향하나, 땅의 자양분이 없인 곧 소멸할 나무와 같다'라고 말이다.
이러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본에 대해,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는 '근대적인 감정'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며, 어느 한 순간도 자본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닐까. 설사 우리 삶의 터전이 히드로가 아니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