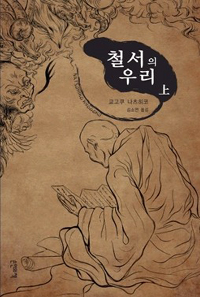
▲<철서의 우리>上권 표지 ⓒ 손안의책
1950년대 도쿄 인근의 하코네. 이곳의 여관에는 수수께끼의 절 명혜사를 취재하기 위한 사람들과 명혜사의 승려를 만나기 위해 골동품상이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왜일까? 절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심란하다. 산 속 어딘가에서 요괴를 연상시키는 소녀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세상과 단절된 명혜사라는 절이 흐르는 시간마저 거부할 정도로 완고하기 때문일까? 그들은 모른다. 그들이 알 수 있는 건 하나다. 갑자기 승려의 시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황한다. 시체를 발견하면 당황하는 것이야 사람 이치라고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시체는 말 그대로 급작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바둑을 두거나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었는데 시체가 좌선하는 자세로 앉아있다. 황당한 건 시체 주변에는 발자국이 없다는 점이다. 도대체 시체는 어떻게 그곳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
황당한 일은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명혜사에 다다른 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한다. 어떤 승려가 변소에 머리를 박힌 채 발견되는가 하면 또 다른 승려는 누군가에 얻어맞아 살해당하기도 한다. 사건을 듣고 출동한 경찰들이 있음에도 명혜사의 승려들이 차례로 살해당하는 것이다. 그곳을 찾아간 사람들도 당황하고 경찰도 당황한다. 어떤 극악한 연쇄살인마의 범죄라는 생각보다는 마치 '산'이, 그리고 '절'이 승려들을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기야 사건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들 투성이었다. 요괴를 연상시키는 노래 부르는 소녀가 나타나는가 하면 명혜사라는 절 자체도 세상에 알려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명혜사에 있는 승려들의 종파도 다들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사건이 미궁에 빠지고 있는 그때, 경찰은 이곳에 찾아온 이방인들을 의심한다. 취재하러 온 사람들 등을 용의자로 여긴 것인데 그 중에는 소설가이자 '교고쿠도 시리즈'의 주인공 중 한명인 '세키구치'도 있다. 그렇게 하여 이야기가 전해진다. 교고쿠 나츠히코의 '교고쿠도 시리즈'의 네 번째 소설인 <철서의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교고쿠 나츠히코만큼 독특한 미스터리 시리즈를 구축한 작가가 있을까? <우부메의 여름>, <망량의 상자>, <광골의 꿈>으로 이어지는 '교고쿠도 시리즈'는 지적이면서도 기담적인 미스터리로 그만의 개성을 구축했다. 소설의 어느 장을 펼쳐지더라도 작가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네 번째 소설 <철서의 우리>도 마찬가지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번 작품은 교고쿠도 특유의 지적이면서도 시니컬한 장광설을 바탕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분위기로 똘똘 뭉쳤다.
눈에 띄는 건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철서'다. 철서란 무엇인가. 일본의 요괴다. 그런 요괴가 명혜사의 승려들은 물론이고 명혜사를 찾은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 승려 살인사건도 그것에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요괴는 어찌 잡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소설의 주인공인 교고쿠도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철서를 만든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가? 그것이 <철서의 우리>가 보여주려는 것이고 그것을 찾는 것이 <철서의 우리>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하다.
'절'이 '우리'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시간마저 포박한 것 같은 명혜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교고쿠도 시리즈'의 장점을 두루 담은 <철서의 우리>, 작가의 다른 작품이 그랬듯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달래주고 있다. 시원하게 혹은 섬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