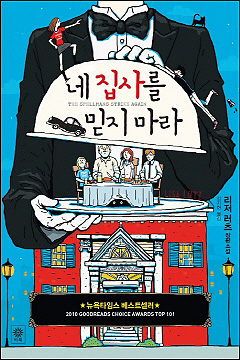
▲<네 집사를 믿지 마라>겉표지 ⓒ 비채
'집사(執事)'라는 단어를 들으면 익숙하면서도 왠지 거리감이 느껴진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교회 집사가 아니라 일반 가정집의 집사다.
서양이 배경인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대저택에서 근무하는 집사가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집사라는 직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집사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비서실장 정도가 될텐데 일반 가정집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고용할 정도라면 그 집은 꽤나 부유한 편에 속할 것이다.
하는 일은 비슷할지 몰라도 집사와 비서는 어감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 비서에 비해서 집사는 좀 더 개인적이고 친근감있게 들리는 것이다. 자신을 고용한 사람에 대한 충성심도 집사가 더 강할 것만 같다. 고용주가 이런 집사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고향으로 내려간 집사리저 러츠가 2010년에 발표한 <네 집사를 믿지 마라>는 제목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믿지 못할 집사를 둘러싸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작품이다. 그 집사는 샌프란시스코의 대저택에서 근무하는 메이슨 그레이브스라는 인물이다. 대저택의 주인은 초기 치매증상을 보이는 프랭클린 윈슬로라는 노인이다.
메이슨은 이 저택에서 8년째 근무 중이다. 문제는 메이슨의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몇 달 예정으로 고향으로 떠났다는 점이다. 윈슬로는 '메이슨이 없으니 집이 엉망진창이야'라면서 임시 집사를 구하려고 한다. 그것도 단순한 집사 역할뿐 아니라 다른 하인들이 윈슬로를 골탕먹일 음모를 꾸미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집사를 원하는 것이다.
결국 윈슬로는 사립탐정인 31세의 노처녀 이자벨 스펠만에게 이 일을 의뢰한다. 학창시절 비행청소년이었고 현재는 고집쟁이에다가 결점투성이인 이자벨은 자신의 친구인 배우지망생 레너드에게 이 일을 제안한다.
보수는 시간당 50달러고 밤에는 퇴근할 수 있다. 하지만 집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내지는 못할 것만 같다. 언제 고용주가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취하는 것도 상상이 안 된다. 하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일 수도 있겠다.
레너드의 임무는 두 가지. 윈슬로가 불편을 느끼지 못하게 정성껏 시중을 들고, 다른 하인들을 감시하는 것이다. 비서로서의 경력이 전무한 레너드지만 배우지망생이니만큼 집사와 스파이 역할을 동시에 '연기'하는 것도 큰 경험이 될 것이다. 레너드는 이자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윈슬로의 집으로 향한다.
유쾌한 스펠만 가족들<네 집사를 믿지 마라>는 '스펠만 가족 시리즈'의 네 번째 편이다. 이자벨 스펠만은 혼자 독립해서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직 경찰이었던 이자벨의 아버지 역시 사립탐정이었다.
'가족 시리즈'인 만큼 작품에서는 집사를 둘러싼 음모보다 스펠만 가족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자벨도 평범한 여성은 아니지만 그녀의 오빠와 여동생도 마찬가지다. 오빠는 한때 잘나가던 변호사였지만 현재는 백수로 전락했고, 고등학생인 여동생은 죄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티격태격한다. 우스꽝스러운 말 싸움이 끊이지 않고 서로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기도 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 자체는 진지하고 심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볍고 때로는 경박하다.
한편으로는 사립탐정의 가족이라면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심각한 범죄를 다루면서 그 인물들까지 진지해진다면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질테니까. 범죄 수사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가벼운 농담 또는 허튼 소리로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일이다. '스펠만 가족 시리즈'는 범죄 소설이라기보다는 한편의 즐거운 시트콤 같은 작품이다.
덧붙이는 글 | <네 집사를 믿지마라> 리저 러츠 지음 / 김지현 옮김. 비채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