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하게 말하겠다. 대학생이면서 강의 교재도 사지 않고 수업에 들어간 적이 두 번 있다. 두 번 다 심지어 독후감도 써 냈다(기보다 '지어냈다'). 두 강의의 공통점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야만 졸업하는 '필수교양' 수업이었다는 것. 그리고 문제의 교재가 교수님 본인의 저서였다는 것이다.
관심도 없는 주제인데다, '나를 책 판매에 이용하나?'라는 의혹에 반항심이 들었다. 당연히 학점은 형편없었다. 그래도 책을 구매하지 않은 것에 후회는 없었다.
물론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모교에서 비슷한 일이 논란이 되어 경험담부터 꺼내보았다. 논란은 연세대학교 마광수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본인의 저서이기도 한) 수업 교재를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불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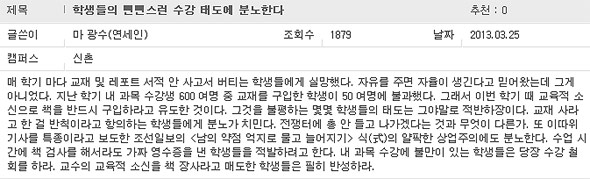
▲마광수 교수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 ⓒ 연세대학교 자유게시판
'저서 강매'가 아니냐는 논지의 기사에 분노한 마 교수님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뻔뻔한 수업태도에 분노한다"라는 제목의 반박글을 올렸다. "지난 학기 수강생 600여 명 중 교재를 구입한 학생이 50여 명에 불과"해 교재 지참을 유도한 것이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성토했다. "전쟁터에 총 안 들고 나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표현도 썼다.
다른 매체에서도 연달아 마광수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다. 기사마다 교수님의 한탄과 분노가 담겨있었다. 본인 저서라서 문제가 아니었냐는 지적에는 "교수가 저서 없이 강의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학술서적이라 1000~2000권 찍는데 내가 인세를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는가"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vs "심정은 이해하나 방법이 문제"

▲마광수 연세대 교수(자료사진). ⓒ 남소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먼저 대다수는 교수님의 심정에 공감했다. 어쨌든 교수가 대학생에게 수업 교재를 '가급적' 구매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권당 약 1만 원 정도면 대학 교재 치고는 딱히 비싼 편도 아니다. 마광수 교수님은 한 인터뷰에서 "빌리거나 물려받은 책도 받아줄 생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방법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많았다. 역시 해당 수업을 수강했던 한 친구는 "취지는 알겠지만, 굳이 영수증까지 내라고 한 건 '오버'였다"고 했다. "그럼 이제 책이 아니라 영수증을 빌려야 하나?"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의도가 학생들의 책 구매가 아닌, 독서를 유도하는 데 있는데 왜 책 검사가 아닌 영수증 검사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면서 "당시 (교수님) 책을 사서 봤는데, 솔직히 두 번 읽고 싶은 책은 아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소장하고 싶은 책을 사는 건 자신의 자유가 아니겠냐는 뜻이다.
또 다른 친구는 "영수증 제출 대신 '오픈북 시험'(교재를 지참하고 보는 시험)을 내거나, 책이 없으면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강의를 했다면 모두 책을 읽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다.
나는 교수님 말마따나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간' 적이 있는 한심한 학생으로, 결국 '한심한 학점'을 받아 본 입장이라 이런 논란이 남일 같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렇게 치사하게 감정싸움을 할 만한 일인가?"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교수님과 학생들의 논쟁... 아쉬움이 남는다일단 마 교수님의 방법은 확실히 '무리수'였다. 친구의 말처럼 '영수증 제출'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책을 '사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애초에 영수증 받으려고 책을 살 학생들이라면 교수님의 '교육적 목적'이 과연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까? 여러 모로 오해와 반발을 부를 여지가 있었다.
그렇다고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등의 대응으로 교수님을 화나게 만든 일부 학생들도 치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마 교수님의 방침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다른 강의를 들었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심지어 나처럼 필수교양 학점도 '쿨하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물론 낮은 학점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지만).
마 교수님의 방법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한평생 '소비자'로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90년생인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라면 태어날 때부터 TV광고에 익숙한 '소비사회'를 살아왔을 것이다.
소비사회를 살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유란 대부분 '소비자로서의 선택의 자유'뿐이다. 그런 우리의 감각이 "지정된 책을 반드시 사고,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마 교수님의 지시를 '자유에 대한 침해'로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이 글에서는 일단 마광수 교수님이 '저서 판매'로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은 접어두겠다. 마 교수님이 그간 저서판매로 인세, 실적 등 분명한 사익을 취해왔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글머리에 교재를 사지 않은 경험담을 말했지만, 나 역시 마냥 불성실한 학생은 아니었다. 작년에는 세계문학 관련 강의 하나를 위해서만 한 학기에 총 20만 원 상당의 책을 산 적도 있다. 교재 구입은 내게 수업 준비일 뿐 아니라 '만족스러운 소비'이기도 했다.
강의를 함께 들었던 70여 명의 학우 중 그 누구도 책을 너무 많이 사야 한다고 불평하지 않았다(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우도 있었겠지만). 학점을 위해서라면 빌릴 수도 있었던 책들을 전부 구입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교수님의 '책 소개' 때문이었다. 교수님의 책 소개를 듣자면 자연히 한 권 한 권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광수 교수님도 학생들도 한 발 물러날 수 있었던 사소한 '해프닝'이 언론보도를 거치며 과열됐다. 서로가 너무 '쪼잔했던' 감정싸움이기에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