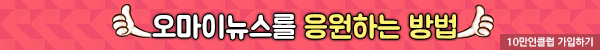▲10만인클럽 회원 이은영씨는 지체장애 아동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이다. ⓒ 박형숙
교육의 본질을 다룬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한 국가의 학교교육이 인간(아동)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를 위한 자원으로 인간(아동)을 취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교육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활동이라고 전제했을 때 성립하는 얘기다. 그렇다면, 장애를 지닌 아동에게서 무엇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 매번의 좌절을 넘어서는 과정에 있는 특수교육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에 가장 닿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소개하는 10만인클럽 회원은 그와 관련한 분이다. 전주의 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28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 이은영 회원(52). 무엇보다 궁금했다. 어떻게 그토록 오래 그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는 그냥 웃으며 답했다.
"제 친한 친구도 절더러 그러더라구요. 한 학교에서 30년 가까이 있었다는 게 좋은 의미만은 아니라고. 워낙 능수능란하거나 반대로 너무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웃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세월이 흘러간 것 같아요."왜 특수교육이어야 했냐고 다시 물었다. 하지만 그는 또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때 진학상담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 드렸어요. '저는 특수교육과가 아니면 안 가겠다'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특수교육과에 진학한 사례가 없어서 선생님도 당락이 불안하니까 난감해 하시더라구요. 저는 '떨어져도 좋다'고 했지요.아마 신앙의 힘(기독교)이 컸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막연히 사회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왠지 '사회사업'이라고 하면 내려다보는 입장인 것 같아서…. (군산 집에서) 서울에 올라와 교보문고엘 갔죠. 그 큰 서점에도 특수교육 부스가 구석진 곳에, 아주 작게 마련되어 있더라구요."그렇게 대학에 진학해 이은영 회원은 장애아동들을 '돌보는 것'과 '교육하는 것'의 차이를 배웠다.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고아원 원장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교육자다.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이 한 몸 불살라 보겠다는 각오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교육은 장애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 주는 것이다.' 신변처리(대소변 가리기, 식사하기 등)가 안 되는 아이들을 우선은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지만 교사는 '그 다음 과정'에 대한 준비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돌봄과 교육의 차이교사 생활 초반, 부랑아들을 주로 돌보았다는 이은영 회원. 장애 정도가 약한 아이들 중에는 자신들이 버려졌다는 걸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꿈'을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이래서 교육이 필요하구나'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단다. "아이들이 자기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할 때 가장 뭉클하죠"라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사진도 가르쳐요. 초점은 잘 맞지 않아도 대상을 보는 시각이 드러나요. 그렇게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익힙니다. 영화도 만들어요. 동영상을 이어붙이면 작품이 됩니다. 여가를 즐길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나요." 저녁에는 평생교육원에서 특수교육지도사(특수보조원)가 되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한다. 아이들의 신변처리를 돕고 교사를 보조해주는 이들을 위한 교육이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내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28년 동안 겪은 경험, 좌절, 고민을 주로 공유하려고 합니다."10만인클럽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바로 여기. 전북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오연호의 행복특강> 홍보물을 접하고 참석하고 싶었지만, 날짜가 평생교육원 강의와 겹쳤던 것. "저보다 더 훌륭한 강사가 있는데 함께 들어보실래요?"라고 수강생들에게 동참을 제안했다가 성사되었다. 그날 특강을 듣고 나서 현장에서 바로 10만인클럽 회원 가입서도 썼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세상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살았어요. 근데 갈수록 답답하더라구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싶었죠.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요. 근데 뭐라도 해야겠더라구요. 큰 돈 보다 단돈 1만 원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둘 모여서 점을 찍는다면.... 그런 점들이 모여서.... 이름도 빛도 없이 꾸준히 함께 하는 분들이 소중하다는 걸 살면서 배웠거든요."끝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사실 그런 말도 못하겠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거... 특수교육에 대해 모르는 분들에게 최소한 특수장애가 뭔지 알리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장애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듯이 장애도 단지 그런 것이라고...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은 세상이었으면... 어휴 잘 모르겠어요.(웃음)"그는 쑥스러움이 많았다. 비장애인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