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은 오마이뉴스 에디터의 사는이야기입니다.[편집자말] |
다른 매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기사가 있다. 바로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겪은 일들을 기사로 쓴 것. 오직 <오마이뉴스>, 사는이야기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다.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리는 재미가 쏠쏠하던 어느 날, 스마트폰에 모르는 번호 하나가 떴다. "여기 오마이뉴스인데요. 기자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전화했습니다." 기사를 편집하는 에디터는 내가 '짜장면'을 주제로 쓴 글을 읽고 연락했다며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으니 그런 소재를 많이 발굴해 보라"고 격려해줬다. - 강대호 시민기자
글만 있는 기사를 송고했더니 편집기자가 사진을 넣어준 거다.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난다. 내가 쓴 글이 사진과 함께 SNS에 게재되는 것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가 아닌 SNS에서도 내 기사가 공유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 책 읽는 것을 좋아하니 책과 관련된 기사나 서평도 쓰기로 했다. 첫 서평 기사를 쓴 후 편집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존중받는 기분이 들었다. 이것이 3년간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동력이 되었다. - 최종인 시민기자
<오마이뉴스> 사이트를 찾아 첫 기사를 올렸다. 52권 프로젝트의 프롤로그였다. 담당 기자님의 격려 전화를 받아 기운이 났다. 그런데 첫 번째 책부터 무려 다섯 개의 글이 연속으로 실시간글(비채택)이 됐다. '기사'라는 글의 특성을 망각한 결과였다. 두서없고 필요 이상으로 긴 글을 누가 읽겠는가.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 이용준 시민기자
최종인 시민기자가 3년 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기사를 읽었을 때 내심 뿌듯했다. 기사 본문에 내 이름 석 자가 있었지만, 민망해서 뺐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일, 속으로 혼자만 좋아했다.
강대호 시민기자가 쓴, '시민기자 도전기'라는 부제가 붙은 기사(
"모든 시민은 기자"인데... 나는 왜 채택 안 됐을까)를 보고 이주영 편집기자는 '이 맛에 일한다'며 '읽으며 코끝이 찡해지고, 많이 반성하고 배우게 된 글'이라고 편집 소견을 적었다(모든 기사에는 검토한 편집기자의 편집소견이 짧게 달린다, 이건 내부 직원들만 볼 수 있다).
강대호 시민기자는 이 글에서 <오마이뉴스>에 글을 쓸 때 기본으로 삼는 몇 가지 원칙을 말했다. 첫째, 문장이 기본이다. 둘째, 본인이 잘 알고, 친숙해서 잘 쓸 수 있는 분야의 글을 쓴다. 셋째, 글에 '시의성'을 담는다. 특히 '내 개인적인 경험과 성찰을 소재로 기사를 쓰더라도, 대중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결론으로 글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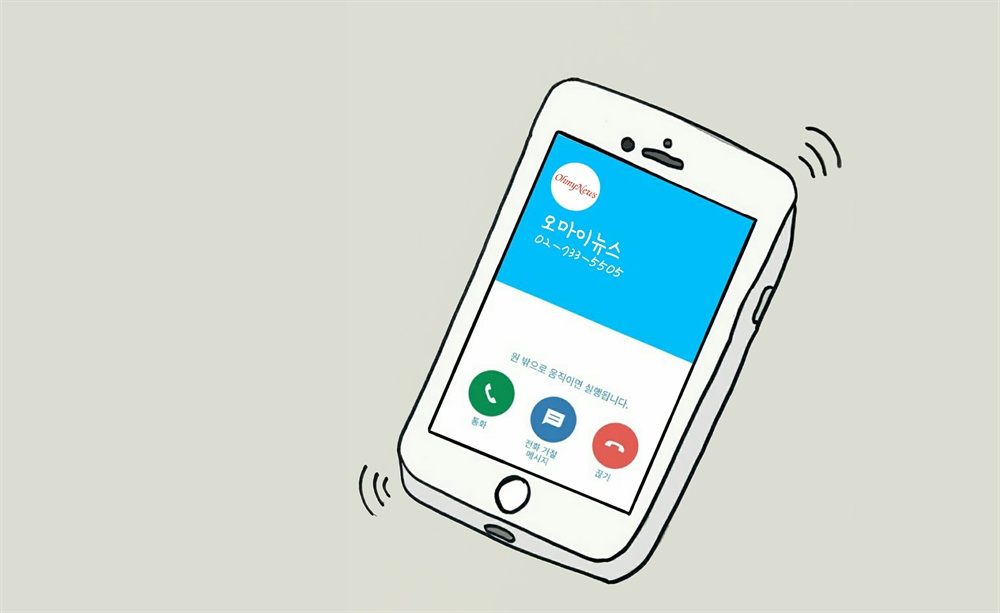
▲주요하게 활동하는 시민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었다. 편집기자가 연락을 해 '이런 방향으로 기사를 써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는 것이 글 쓰는데 자극이 되었다는 거였다. ⓒ 손그림 금경희, 채색 이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내 눈을 의심하며 읽었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고, 편집기자만큼 <오마이뉴스>라는 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데 놀랐다. 또 다른 기사를 분석하고 자신의 기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며 기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또 놀랐다.
그런데 가만 보니 강대호 시민기자뿐만 아니라, 주요하게 활동하는 시민기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었다. 편집기자가 연락을 해 '이런 방향으로 기사를 써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는 것이 글 쓰는 데 자극이 됐다는 거였다.
힘들지만 편집기자가 피드백하는 이유다. 모든 시민기자에게 이런 피드백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대표님, 사람 좀 뽑아주세요!). 그래도 가능하면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에게는 피드백을 주려고 한다(갑자기 전화해도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떨려요).
이런 피드백은 요새 한창 뜨고 있는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는 없다. 오직 <오마이뉴스>에만 있다. 그것도 무려 19년째 하고 있다. 그 최전선에 편집기자가 있다. 참고로 기사를 어떤 방향으로 쓰면 좋을지 짚어주는 역할은 이주영 편집기자가 참 잘한다. 옆에서 나도 보고 배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