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른들이 '속시끄럽다'는 말을 쓰시곤 했었다. 어릴 적에는 '왜 속이 시끄럽지?' '그게 무슨 뜻이지?'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그 말이 자연스레 이해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상념들이 달려든다. 간밤의 꿈인지 기억나지도 않지만 여운만은 개운치 않게 남아 맴돈다.
거기에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까지, 아침부터 가슴이 묵직한 경우가 많다. 독일 발도로프 교육 이론에서는 밤 사이 영혼이 우주로 갔다 잠이 깨면서 다시 '합체'가 되는데,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면 그 '합체'가 원활치 않아 아침이 힘들다더니. 우주를 헤맨 건지 과거를 헤맨 건지 늘 아침이 무겁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루 종일 말 그대로 '속 시끄럽게' 이런 저런 생각들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인사이드 아웃 2 ⓒ 디즈니
마음 속에서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며 하루 종일 떠들어 대는 생각과 그로 인해 부추겨지는 감정들에 지쳐버린 날이면, 내가 못살겠다 싶기도 하다. 그러다 문득 이 시끌벅적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 떠올랐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 1>은 우리 안에 여러 감정이 공존함을 '시인'했다. 그 중에서도 슬픔이를 각인시켰다.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어른들이 더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영화, 사람들은 <인사이드 아웃 1>으로 부터 자기 안의 슬픔에, 나아가 자신의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 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슬픔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기쁨이라는 긍정적 감정과 힘을 합쳐 상황을 해결해 나가며 우리 안의 슬픔이라는 감정에 '긍정적 메타포'를 부여했다. 꼭 <인사이드 아웃>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다.
그로부터 십 여년이 흐르고 기쁨이와 슬픔이로 대변되는 감정들은 보다 세분화되어 돌아왔다. 이번 <인사이드 아웃2>에서 가장 주목 받은 건 '불안', 그 밖에 부럽이, 따분이, 당황이, 추억 등이 더해졌다. 술픔이라는 어찌 보면 담백한 감정이 불안, 당황 등 보다 복잡한 요소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2024년의 시대, 기쁘고 슬프다는 단순한 감정적 상태를 넘어 불안과 우울이 더 시대적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영화는 잘 반영해낸 것이다.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던 감정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머리 속에 다양한 감정들이 공존하여 산다는 설정은 나를 지배하는 지금의 이 감정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2021년부터 방영된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시즌 1,2 역시 김고은의 머릿 속에 10 명도 넘는 '이성, 감성, 응큼, 불안' 등의 세포가 아웅다웅하며 유미의 일상사를 이끌어 간다.
심리 상담사 야나가와 유미코가 쓴 <불안한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는 작은 습관>에 보면 실제로 내 안에 많은 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유미코 씨는 여러 마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생각하라고 한다. 꼭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의견', 흑백 논리를 따지는 '비판견', 난 이것도 못해하는 '패자견', 어쩌지 하는 '걱정견', 모든 일은 내 탓이오 하는 '사과견', 잘 될리가 하는 '포기견', 마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무관심견' 등이다.
<인사이드 아웃>이나, <유미의 세포들>, 그리고 <불안한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는 작은 습관> 등을 보며 그러면 나도 '속 시끄러운 내 안의 마음들에 이름을 붙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저 작품들 속 캐릭터들을 보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등장 인물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어릴 적 라일리와 사춘기의 라일리가 다르고, 성인이 되어 연애사에 고심하는 유미가 또 다르다. 심리적 기제에 방점을 둔 <불안한 사람도~>의 강아지들도 또 다르다. 그래도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귀여움'이 아닐까? 내 안의 다크한 마음들도 귀여운 캐릭터나 강아지가 되어 불러주면 얼마간 그 '시름'이 희석되어 지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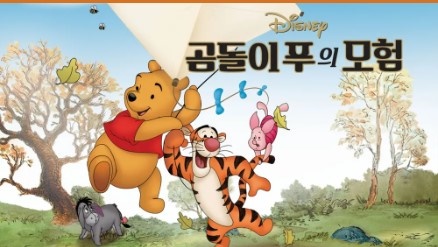
▲곰돌이 푸 ⓒ 디즈니
내 안의 마음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 어떨까
그래서 엉뚱하지만 나 역시 내 안에 오고 가는 감정과 생각들에 어울리는 캐릭터가 무엇이 있을까 고심해 보았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곰돌이 푸>는 어떨까? 소심하지만 사랑 받고 싶어 하는 피글렛과 부정적이지만 알고 보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당나귀 인형 이요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낙천적인, 그래서 사고뭉치가 되는 티거, 이런 곰돌이 푸 속 캐릭터들이 내 맘 속에서 오가는 마음들을 대변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또 내 사주명식에서 등장하는 동물들을 소환하면 어떨까도 생각해 보았다. 내 안에서 때로는 날뛰고, 때로는 침잠하며, 종종 외로워하는 마음들을 그 동물들의 이름으로 불러주면 어떨까 싶었다. 검은 쥐는 한없는 우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레오 리오니의 그림책 <프레데릭>의 쥐처럼 세상의 생각을 모으고 또 모아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몽상가 시인' 쥐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신없이 날뛰는 내 안의 말에게는 <손오공>속 삼장법사의 백마를 떠올리며 너는 이제 늙은 말이야 하며 달래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 마음과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재해석을 곁들여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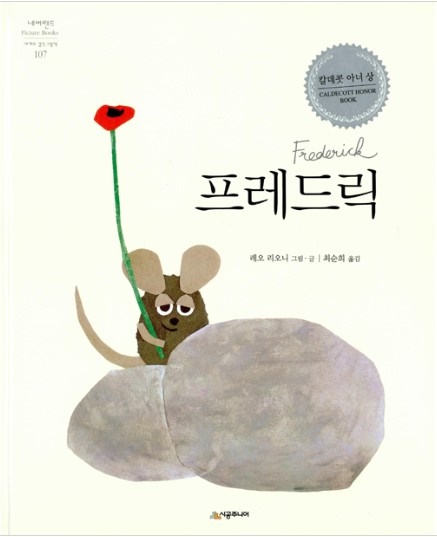
▲프레드릭 ⓒ 시공주니어
읽다보면 이게 다 뭔가 싶기도 하겠다. 하지만 얼핏 우스운 해프닝을 통해 내 안의 마음에 캐릭터를 찾아주는 과정은 그래도 꽤 쓸만하다.
무엇보다 우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해 요동치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질풍노도를 겪는 내 마음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정의 내리지 못한 채 혼돈에 빠지기도 하니까. 잠깐은 불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잘 살펴보니 갈망이나 열망이요, 또는 조급함인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또한 저렇게 내 안의 우후죽순 솟아나는 마음들에 이름 붙여주기를 하게 되면 어느 새 그 감정과 나 사이에 '여유'가 생겨난다. 이름을 붙여주려면 들여다 보고 살펴보아야 하니, 그 감정에 휘말려 어쩔 줄 몰라하던 마음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게 늘 성공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애써본다는 게 중요하다. 이름을 불러주고, 갸륵한 그 마음을 보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내 안에 너무도 많은 나와 사이좋게 지내는 길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