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나뭇잎 없이 매달린 매실꽃이 눈물 같다고 합니다.송성영
햇살 좋은 봄기운에 빨래를 널던 아내가 잠시 손을 놓고 말했습니다.
"꽃이 눈물 같네…."
"뭐가?
"저기, 매실 나무에 핀 꽃."
"……."
"잎도 없이 나뭇가지에 달랑 매달려 있어 그런가. 눈물 같어."
얼마 전 처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낭암 말기로 고생하던 처형이 돌아갔습니다. 쉰 두 해를 살다가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처형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처형이 떠난 곳이 바로 그곳이라 믿고 있습니다.
처형이 믿었던 종교에서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곳이 천국이든 어디든 간에 본래 왔던 곳이라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왔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났으니 본래 왔던 그곳이 그곳이라 할 수밖에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그렇게 떠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가깝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넷이나 떠났습니다. 대부분 말기 암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젊다면 젊은 나이들이었습니다. 세상살이에 모질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진 세상을 아프게 껴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빼앗고자 하기보다는 뭔가를 주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형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를 받으면 열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형의 임종 소식을 듣고도 아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모르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는데 더 이상 힘겹게 숨쉴 필요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홀가분하겠어…."
아내는 처형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날까지 처형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처형이 사경을 헤매던 일주일 내내 곁에 있었기에 그토록 담담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이미 처형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그 아픔을 조금씩 녹여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암 말기 선고를 받았던 1년 전부터 아픔을 덜어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생각을 깊게 합니다. 죽음 저편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내는 빨래 줄에 축 늘어진 옷가지들을 집게로 고정시켜 놓으며 생사에 도가 튼 사람처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산다는 게 얼마나 잘 죽을 수 있는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죽을 때 편하게 죽는 것도 복이지."
아내 말대로 '잘 죽는 것'이야말로 복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고 또한 죽을 때 편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함께 하다보면 '잘 사는 것'보다는 '잘 죽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상상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움이 앞을 가립니다. 누구는 그 죽음이 두려워 부질없는 세상 실컷 즐기고 살자는 식으로 좀 더 욕망에 휘어 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손아귀에 쥐고 있던 부질없는 욕심 덩어리들을 놓기도 합니다.
"염할 때 언니 손목을 만져 보니까, 체온이 남아 있는 거 같더라."
"안 이상혀?"
"언니 시신 옆에서 잠자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더라."
언니의 죽음을 홀가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아내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처형이 그러했듯이 쥐고 있던 욕심덩어리들을 하나 둘씩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고정 돈벌이에서 손을 떼고 싶어하는 남편인 나에게 언제든지 손 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아이들 교육이며 생활비 걱정을 했던 아내였는데 처형의 죽음과 함께 다시 예전처럼 걱정 없는 얼굴로 되돌아왔습니다. 한달 생활비조차 간당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롭게 풀꽃 그림을 그렸던 예전의 그 '철없는 아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집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핀 풀꽃들송성영
처형은 생사를 넘나들며 성경 구절을 깨알 같은 글씨체로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남은 시간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쌓아두었던 욕심덩어리를 하나씩 둘씩 비워 나갔을 것입니다. 그 비워진 마음이 아내에게 온전히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홀가분해져 생활비 걱정조차 접어뒀는지도 모릅니다.
처형뿐만 아니라 대부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욕심 부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욕심을 놔 버리는 순간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온 나날들을 참회한다고 합니다. 참회를 하다보면 참된 마음이 스며듭니다. 참된 마음은 화를 내거나 속이거나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그 '참된 마음'을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처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에게 '참된 마음'이라는 일생일대의 큰 선물을 주고 떠났던 것입니다.
아내는 처형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설령 그 깨달음이 오래 가지 못하는 잠시 잠깐 빤짝하는 빛이라 할지라도 한동안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처형이 세상을 떠나자 예전보다 얼굴빛이 많이도 맑아졌습니다. 아내를 위로하는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한창 슬퍼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밝은 표정으로 희희낙락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눈총까지 보냅니다.
슬픔이 하도 고통스러워 즐거운 표정을 지을 것이라는 식의 미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맑은 표정은 고통으로 사무친 그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 여기 있던 꽃 어디 갔어?"
"별꽃? 그거 내가 뽑아서 닭 줬는디?"
우리는 처마 끝에 만들어 놓은 작은 화단에서 매년 수세미를 심고 있습니다. 그 화단에 야생초들이 거름발을 죄 빨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야생초 몇 포기를 남기고 죄다 뽑았습니다.
"이쁘던데 그 별꽃…."
"거기에 수세미 씨 뿌리려고. 다 뽑은 건 아니구 멫 포기 냄겨 놨어…."
"그것도 생명인데…."
처음 시골에 와서는 잡초라고 불렀고 최근에 와서는 풀꽃이라 불렀던 아내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야생초들을 그냥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내는 그 별꽃을 단순히 감상용 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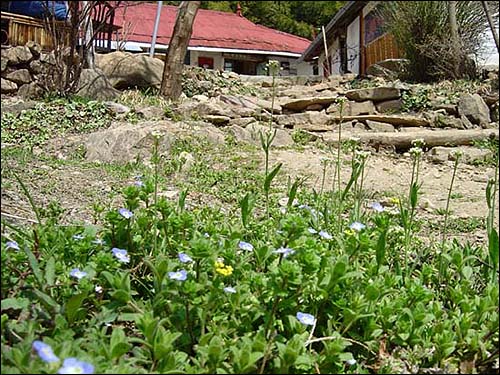
▲대문없는 우리집 앞에 핀 들꽃들송성영
요즘 우리 집 주변에는 세상을 떠난 처형에 대한 아내의 눈물 같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마당에도 피었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도 길거리에도 산에도 들에도 소리 소문 없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꽃들이 피었습니다. 어떤 꽃은 흔히 불리는 화초였고, 또 어떤 꽃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생초, 풀꽃들입니다. 이름과는 상관없이 한 몸에서 수많은 꽃을 피웁니다.
사람이라 하여 단 한 사람이 전부가 아니 듯 나무나 풀 역시 어떤 종류의 나무이든 단 한 그루, 단 한 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나무와 수많은 풀이 있고, 매실나무가 그러하듯이 그 수많은 나무에서 또한 수많은 꽃들을 피웁니다. 별꽃에도 역시 별꽃 한 송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포기에서 무수한 별꽃들을 피워냅니다.
봄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의 참회의 눈물로 지천에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방 컴퓨터 앞에 앉아 대충 원고를 마무리하고 뒤늦게 저녁 밥상머리로 다가가자 아내가 그럽니다.
"뭐 했어?"
"오마이 원고 썼지? 뭐 썼는데…?"
"당신 얘기. 아까 그랬잖어 꽃이 눈물 같다구…."
"그 얘기 들으니…."
아내가 갑자기 목이 메는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에이그, 우는겨?"
"꽃피는 거 보면 슬퍼, 상상만 해도 슬퍼"
"왜…."
"그냥 슬퍼, 꽃이."
아내가 말한 '꽃'을 나는 잔머리를 굴려 문학적 감성 따위로 '참회의 눈물'이나 그 어떤 순수한 생명덩어리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해석하고 있을 때 아내의 가슴속에는 이미 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는 적게 벌어 적게 먹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평생 화두로 삼고 있음. 수필집 '거봐,비우니까 채워지잖아' '촌놈, 쉼표를 찍다' '모두가 기적 같은 일' 인도여행기 '끈 풀린 개처럼 혼자서 가라' '여행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