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오모리현 도와다 호반 가마쿠라(눈집)에서 제자 김자경(일본관광진흥청 정보계장)씨와 함께박도
그러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낮에는 문서기록보관청에서 일(주로 사진 고르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기사 작성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만 많은 독자들이 댓글로 격려를 해주셔서 피로한 줄도 몰랐다.
언저리 분들은 내가 기사를 매우 쉽게 쓰는 줄로 아신다. 그런데 나는 어느 한 기사도 쉽게 쓴 적은 없었다.
아무리 빨라야 서너 시간이고, 어떤 기사는 2,3일 걸리기도 한다. 또 한 기사는 보통 20~30번, 심한 경우는 50~60번의 손이 간다. 이렇게 다듬고 확인해도 오류가 나와서 독자들의 따가운 지적을 받을 때는 쥐구멍을 찾고 싶도록 부끄러웠다.
현대인의 한 특징이요, 사이버 공간의 큰 단점인 메마른 인간 관계를 복원하는 뜻에서 나는 기사 행간 곳곳에 사랑과 인정을 담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비록 내가 쓴 기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글일지언정, 그래도 마치 졸업생에게나 까마득한 후배에게 들려 주는 이야기처럼 진솔하고 정성을 담아 띄우려고 노력했다.
인터넷신문은 쌍방 의사소통에 특성과 매력이 있다
인터넷 기사의 특성은 기자와 독자간의 쌍방 의사소통에 그 특성과 매력이 있다. 필자가 심혈을 기울여 고심해서 쓴 기사는 용케 독자들이 알아주고 과분하게 격려를 보내주기에 보람을 느낄 때가 많다. 그와 반면에 어떤 기사에는 온갖 비난이 쏟아져서 괜히 썼다고 후회할 때도 더러 있었다.
비난이 쏟아지는 기사를 잘 분석해 보면 기자에게 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사 내용이 부실하거나 은연 중 기자가 제 자랑을 하거나 고루한 생각을 드러내면 독자들은 강한 질타를 한다.
2003년 2월 2일자 '유럽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기사에서 "여자 특히, 아내는 부드럽고 상냥하며 순종해야 한다. 남편에게 매사 이론적으로 꼬치꼬치 따지고 대들면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 아닌 지옥일 테다"라는 문장에 발끈한 몇몇 독자들은 댓글을 달았다.
인터넷 신문의 독자는 시공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다. 기자는 기사를 쓸 때 전문성과 정확성을 갖춰 써야지 적당하게 쓰다가는 망신당하게 된다.
한 번은 일본기행을 연재할 때 "기장은 '지금 아키타행 대한항공 769편은 1만피트 상공을 시속 895km로 공해 상을 날고 있습니다'라고 기내 방송을 했다"라고 썼더니 "동해 상공 고도 1만 피트? 1만 미터? 확인 바람"이라는 '조종사'의 댓글을 받았다.
곧장 대한항공 조종실에 확인해 본 결과 독자의 의견이 맞아서 '1만 미터 동해 상공'으로 정정하기도 했고, 일본 교토의 니조조에 은각사 사진을 잘못 올려 현지 동포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아 얼굴을 붉히며 수정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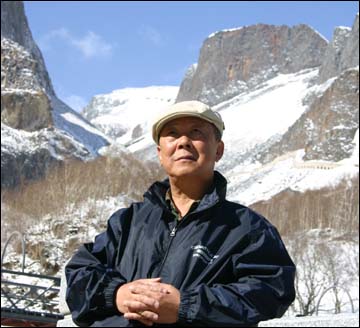
▲백두산 장백(비룡)폭포에서박도
그 후로는 기사를 송고하기 전에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지만 그래도 잘못을 저지른다. 그럴 때 아주 고마운 독자는 댓글로 호되게 꾸짖지 않고 쪽지보내기로 넌지시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그동안 필자의 경험으로는 네티즌들은 잘난 척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많이 아는 체하거나 고루한 훈계조 기사에는 대침으로 망신을 시키니 앞으로 기사를 쓰고자 하는 분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된 지 2년여, 400꼭지의 기사를 쓰면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참 주책없이 많이 썼다는 자괴감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보람을 느낀다.
이제는 드문드문 나이에 걸맞게 지난 삶을 성찰하는 좀더 깊이 있는 기사를 써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일이란 내 맘대로 되지 않기에 독자에게 약속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걸로 마무리 말로 삼아야겠다.
네티즌 여러분! 그동안 사랑과 채찍을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