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불쑥 찾아오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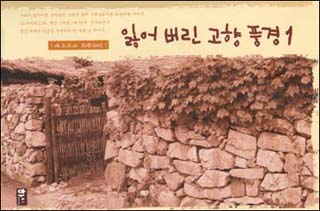
▲ <잃어버린 고향 풍경1> 하이미디어 刊 ⓒ 박도
반갑지 않은 불청객 태풍 '차바'가 다행히 한반도를 비켜 일본열도로 상륙한다는 8월 마지막 일요일, 뙤약볕이 유난히 좋았다. 오곡백과가 한창 여무는 이 귀중한 철에 그동안 찌푸려진 날씨로 농사꾼 얼굴에는 얼마나 주름살이 갔을까?
하늘도 그 점이 미안했음인지 오늘 날씨는 매우 쾌청했다. 간밤에 온 손님을 떠나보내고 막 한숨 돌리고 책을 보다가 낮잠에 막 취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선생님, 저 김규환입니다. 지금 새말 휴게소에서 전화 거는 겁니다. 댁이 어디시죠?”
“아, 그래요. 거기서 안흥 방면 국도를 타고 오다가 안흥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다시 전화하세요.”
언젠가 <오마이뉴스> 기사 댓글에 한 번 찾아뵙겠다고 하더니, 뜬금없이 불쑥 찾을 줄이야. 벽시계를 보자 12시를 막 넘고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점심은 드셨나요?”
“아닙니다. 일부러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잡숫던 찬밥 한 그릇 주십시오.”
당신이나 나나 아직도 영락없는 촌놈이다. 그건 당신과 내 마음이지 어디 여자들은 그런가, 김규환씨. 어찌 먼 길을 찾아온 사람에게 찬 밥을 줄 수 있으랴. 양말을 얼른 찾아 신고 안흥중고등학교 정문으로 갔더니 그가 부인과 두 아이를 데리고 막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마침 학교 앞 도토리 막국수를 일전에 먹어보았더니 별미였다. 거기서 점심을 대접한 후 내 집으로 모셔왔다. 그가 나를 찾은 이유는 엊그제 나온 신간을 나에게 전할겸 일요일 시간을 내서 가족나들이를 나왔다고 했다.
a

▲ 내 집 마당 평상에 앉은 김규환씨의 가족, 네 사람 모두 닮은 꼴이었다. ⓒ 박도
그는 내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자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카메라로 여기저기를 담았다. 차를 한 잔 마신 후 텃밭을 둘러보고 싶다고 해서 안내했더니 그는 ‘태평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낯선 용어를 가르쳐줬다.
태평농법이란, 잡초와 적당히 어울려 짓는 농사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텃밭은 김이 적어서 태평농법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잡초 때문에 다소 부끄러운 내 마음을 편케 해주었다.
그러면서 태평농법으로 지은 작물들이 병충해도 농약피해도 없다면서 친환경적인 바른 농사라고 얼치기 농사꾼을 치켜세웠다. 마침 고추농사가 무척 잘 돼서 풋고추를 마음껏 따가라고 했더니 식구가 많지 않다면서 한 봉지만 땄다.
백아 김규환, 나는 사람보다 그의 글을 먼저 봤다. 나도 촌놈이라 웬만큼 시골생활을 아는데 그는 나보다 더 잘 알았다. 그뿐 아니라 구석구석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어쩌면 그리고 감칠 맛 나게 잘 쓰는지 얄밉기도 하고, 그를 잘 몰랐을 때는 라이벌 의식까지 생기면서 한편으로는 경외심까지 생겼다.
그러던 중, 지난 해 한 모임에서 그를 만났다. 인사를 나누고 나이를 물었더니 연상은커녕 나보다 22세나 연하인데 깜짝 놀랐다. 어쩌면 젊은 그가 이토록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샅샅이도 꿰뚫을 수가 있을까. 나는 그의 글을 대할 때마다 큰 이야기꾼을 만난 듯 반갑기 그지 없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가 남도의 걸쭉한 소리꾼으로 대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천일야화>의 샤라자드와 같은 이야기꾼
a

▲ 내 집 텃밭에서 고추를 따는 김규환씨 ⓒ 박도
이제 알맹이로 들어간다. 그가 두고 간, 아직 잉크냄새가 지워지지 않은 따끈따끈한 책을 앞에 두고 책장을 넘기며 소감 몇 마디를 덧붙이고자 한다. 이미 대부분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로 본 글이지만 활자로 된 글에서는 또 다른 맛이 났다.
<잃어버린 고향 풍경1> (하이미디어 刊 335쪽 9000원), 우선 단색 표지화부터 잃어버린 시골집을 연상케 한다. 돌담은 담쟁이로 덮여있고 사립문은 열려 있다. 여기 실린 글들은 ‘라면봉지에 그려진 대파랑 달걀은 어딨을까’를 비롯해 모두 47개의 글이 실려 있다.
그의 글을 읽으면 나는 어느 새 타임머신을 타고 40~5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눈 내리는 날 겨울참새를 잡다’에서는 영호남으로 고향만 다를 뿐, 내 어린 시절과 똑같은 풍경이고, ‘모처럼 작정한 봉숭아 서리 허탕 친 날’을 읽고 있노라면, 나는 검은 팬티만 입고 경부선 철길 옆 봉숭아 밭에 들어가서 한 바구니 서리를 해온 후 시냇가에서 배가 아프도록 먹었던 악동 시절의 추억이 어제 같이 떠오른다.
또 ‘처녀 돼지 시집간 날 이야기’는 우리 집 암퇘지가 제 몸보다 배나 되는 수퇘지에 눌려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하고, '우산 대신 토란잎 오동잎 쓰고 집으로!'에서는 삿갓이나 마부대를 뒤집어쓰고 학교 다녔던 추억에 젖는다. ‘동무들과 꼴 베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에서는 아무리 꼴을 베도 한 망태가 차지 않아 남의 집 보리밭의 보리를 베다가 주인에게 혼났던 악동 시절이 어김없이 떠올라 여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한다.
a

▲ "선배님 한 방 찍읍시다"에 못이겨(왼쪽 필자) ⓒ 박도
이밖에도 1970년대의 가을대운동회 풍경, 헌 바리캉을 든 아버지에게 머리를 깎이며 눈물 질금거리는 대목에서 나는 그 역할을 대신했던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또 과연 지금 ‘달걀 껍데기에 쌀 넣어 만든 고소한 달걀밥’맛을 알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난했던 시절, 달걀 반찬은 아무나 먹을 수 없었던 귀한 것이었다. 어른들이 잡숫고 버린 날달걀 껍데기에 쌀과 물을 넣어 풍로에다 올려두면 잠시 후 달걀밥이 되었다. 그것을 깨트려 먹을 때의 그 고소한 맛은 그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별미였다.
그는 <천일야화>의 샤라자드처럼, 그의 이야기 샘은 마를 줄 모른다. 그의 글은 남도의 걸쩍지근한 육자배기 맛으로, 고향을 잃어 버린 현대인에게 구수한 옛 이야기를 되새겨 준다. 그는 팔자에 타고난 글쟁이다. 그의 이야기가 방방곡곡에 메아리쳐서 메말라 가는 우리 삶이 도타워지기를 바란다.
잃어 버린 고향 풍경 1 - 김규환의 추억여행
김규환 지음,
하이미디어, 2004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