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농장에 거주하고 있는 이숙번의 녹권과 직첩이 회수 되었지만 조정은 조용하지 않았다. 이숙번을 국문에 처하라는 원로대신들의 상소가 빗발치고 삼성(三省)과 형조의 주청이 끊이지 않았다. 이숙번을 중죄로 다스려 엄벌에 처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태종은 애써 외면했다. 침묵을 지키는 임금의 의중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왕심(王心)을 읽어내는 귀재 하륜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금의 속내를 알지 못하여 부심하고 있었다.
'성상께서 이숙번을 지키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혁명동지들과의 약속? 하지만 삽혈맹세는 이미 깨지지 않았는가. 개과천선? 이숙번의 성격이 광포하다고 규정하지 않았는가. 천성이 광포한 자가 교정되기란 나이가 너무 굳어있다. 이용가치? 그것도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용도 폐기하여 팽(烹)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순간,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정답이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최소한 오답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무릎을 치고 싶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하륜이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절대 임금을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정치철학이었다. 반발 뒤따라 가돼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러한 그의 처세술이 그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권세를 누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숨 고르기에 들어간 하륜은 평온했다. 관직을 벗어났으니 백수다. 출사할 일도 없었고 책임져야 할 일도 없었다. 가끔 임금이 부르면 입궐하여 자문에 응할 뿐 그야말로 한가로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그에게 대궐에서 전갈이 왔다. 자문할 일이 있으니 입궁하라는 것이었다. 채비를 갖춰 편전에 나아가니 여러 신하들이 있었다.
신덕왕후 강씨는 계모인가? 서모인가?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 하공을 들라 했소."
"무슨 말씀이온지 하명을 주십시오."
"계모(繼母)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태종이 꼭 풀어야 할 숙제였다. 아버지 태조 이성계에게는 정비 신의왕후와 계비 신덕왕후가 있었다. 신의왕후 한씨는 이방원의 동복형제를 낳은 생모이고 신덕왕후는 이복동생 방번과 방석을 낳은 강씨다.
태종 이방원은 생모 한씨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한 강씨를 미워했다. 정동 양지바른 곳에 잠들어 있던 강씨의 정릉을 파헤쳐 성 밖으로 내보내고 신장석으로 광통교를 만들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묻어 두었던 증오심의 표출이다.
태종 이방원은 신의왕후 한씨만을 어머니로 대접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걸 기정사실화 하여 강씨를 무시했다. 그 연장선에서 신덕왕후 소생 방석과 방번을 서자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일으킨 것이 무인(戊寅) 혁명이다.
이러한 태종의 처사에 일각에서는 예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래도 아버지의 제2 여자 신덕왕후 강씨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아들로서 또는 국왕으로서 이 두 분을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지 고민이었다.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 혼선이 있었고 봉행하는 과정에서 결례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죽은 뒤에 이를 계승하는 자를 계모라고 합니다."
좌의정 유정현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정릉(貞陵)이 내게 계모가 되는가?"
정릉이란 신덕왕후를 이르는 말이다. 적개심이 묻어 있다. 태종은 신덕왕후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를 싫어했다.
"그때에 신의왕후(神懿王后)가 승하하지 않았으니 어찌 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왕후 한씨가 살아있을 때 태조 이성계가 강씨를 취했으니 계모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릉(貞陵)이 내게 조금도 은의(恩義)가 없었다. 내가 어머니 집에서 자라났고 장가를 들어서 따로 살았으니 어찌 은의가 있겠는가? 다만 부왕이 애중(愛重) 하시던 의리를 생각하여 기신(忌晨)의 재제(齋祭)를 어머니와 다름없이 하는 것이다."-<태종실록>
절대로 어머니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그 소생 방석과 방번을 서자라 해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례다.' '법도에 어긋난다.' 이러한 소리를 다시는 하지 말라는 쐐기이기도 했다.
태종이 하륜을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유불선(儒彿仙)에 통달한 당대의 석학 하륜이 입회한 자리에서 논리를 정립하고 재론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전략이었다. 하륜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긍정한다는 얘기다.
관복을 벗은 백수, 산릉고증사가 되다
"하공에게 또 하나의 청이 있소."
"무슨 말씀이온지 하명을 내려주십시오."
"공이 잡아준 수릉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니 진산의 공이 크오. 동북면에 있는 능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오. 하공이 다녀오도록 하시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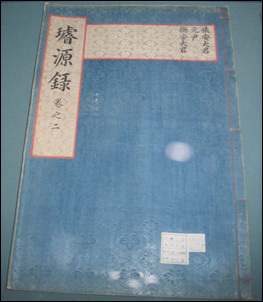
▲ <선원록>. '선원계보기략'이라고도 불리며 태종 때 처음 만들어진 조선왕실 족보다. ⓒ 이정근
조선 왕대의 주역 전주 이씨는 전주의 토호세력이었다. 훗날 목조로 추존된 이안사는 전주 고을 산성별감과 갈등을 빚다 가솔과 식솔 170여호를 이끌고 외가의 고장 강원도 삼척으로 이주했다.
공교롭게도 임지를 따라 부임해 온 안렴사가 전주의 산성별감이었다. 그 관리를 피해 동북면 덕원에 정착한 이안사는 훗날 익조로 추존된 이행리를 경흥에서 낳았다.
이행리는 이춘을 낳고 이춘은 이자춘을 낳았으며 이자춘이 무장으로 성공했다. 동북면을 평정한 이자춘은 부인 이씨와의 사이에서 이원계를 낳고 최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성계다.
여기에서 이씨와 최씨의 위상이 모호하다. 이자춘의 첫 부인은 김씨인데 실록은 '이자춘의 배위(配位)가 정효공(靖孝公) 최한기의 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승자의 냄새가 난다.
태종 이방원의 조부와 증조부 그리고 고조부의 묘가 모두 동북면 함흥에 있었다. 이성계가 등극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묘였으나 조선을 개국하고 왕에 등극한 후 경흥에 있던 이안사의 묘를 함흥으로 천장하면서 능으로 격상하고 관리를 상주하게 하였다. 도참의 대가 하륜으로 하여금 함흥을 방문하여 조상의 묘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명을 받들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륜이 제산릉고증사(諸山陵考證使)가 되었다. 고증사의 위상에 걸맞은 안마(鞍馬)·모구(毛裘)·모관(毛冠)·입(笠)·화(靴)와 유의(襦衣)1습(襲)을 마련해주고 종사관을 붙여 주었다. 최상의 대우다.
"진산이 함길도에 가는데 내가 잔치를 베풀어 전송해주고자 한다. 진산부원군이 술을 마시지 못하니 풍악을 준비도록 하라."
하륜이 동북면으로 떠나던 날, 태종은 몸소 동교 선암(鐥巖)에 나와 하륜을 전송했다. 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임금이 내려준 모관에 하사한 말(馬)을 타고 멀어져 가는 하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태종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태종과 하륜의 마지막 작별이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