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개망초 꽃. 아이들이 개망초 꽃에 예쁜 리본을 달아 내게 생일선물로 주었다. ⓒ 느릿느릿 박철
오늘(6일)은 내 생일이다. 그리고 우리집 늦둥이 은빈이 생일이기도 하다. 아침에 까치가 운다. 내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인가? 아내는 내 성질을 죽이라고 틱낫한 스님의 <화>(anger)를 선물로 사주었다. 어머니는 봉투에 돈을 담아 애들 편에 보내주셨다. 주일 아침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장로 네 분과 대룡리 음식점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냉면을 사 먹었다.
교우들이 내 생일을 알고, 생일상을 차린다는 걸 못하게 했다. 생일이 주일하고 겹쳤으므로 주일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음식점에 가서 시원한 냉면이나 사먹자고 내가 강권하여 그렇게 했다. 네 분 장로님들은 다 형님같이 든든한 분이다. 동생 같은 목사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냉면을 잘 먹고 들어와서 책상 앞에 앉았다. 생일날이면 자꾸 첫 목회시절이 생각난다.
강원도 정선 두메에서 목회하던 시절이다. 한여름 삼복중에 그 찜통 같은 더위에 내 몸은 케이오 직전이었다. 아내와 나는 하릴 없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아내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선풍기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뒷집에서 황소를 키우는 터라, 파리 떼들이 달려들어 낮잠을 성가시게 한다.

▲18년전 정선 덕송교회에 아이들이 선물한 넥타이핀. 지금껏 잘 보관하고 있다. ⓒ 느릿느릿 박철
아내는 큰 아이를 가졌을 때라 몸을 이리저리 뒹굴러도 더위와 갑갑증으로 못견뎌 한다. 그래도 아내는 나보다 더위에 강하고 참을성도 강하다. 나는 더위를 못 참는다. 아내와 나는 연신 파리떼를 부채로 쫒으면서 낮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아이가 찾아와서 우리 집사람을 부르는 것이었다.
“사모님이요, 잠깐 나와 보세요.”
낮잠을 자다 들킨 우리 내외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학교에 다니는 소녀 소년들이 우리 내외를 찾아와 좀 보자는 것이다.
“야. 그럼 이리로 들어와라.”
“아녜요.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예!”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 뭘 그러냐. 이리 들어와서 얘기 해.”
그래도 아이들은 한사코 예배당에서 얘기를 하고 싶단다. 그것도 우리 두 사람과 같이 가자는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얘들이 무슨 긴요한 얘기가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며 예배당을 향했다. 예배당 현관문을 드르럭 하고 열자 갑자기 위에서 물 양동이가 떨어지는데 이건 완전 물벼락이었다. 애들이 짓궂은 장난을 한 것이다.
“야! 이놈들 봐라?”
애들이 평소에도 비슷한 장난을 해오던 터라, 그냥 웃으면서 받아줬다.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 있었다. 초등학교에도 안 다니는 너덧 살 코흘리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까지 스무 명 남짓한 아이들이 우리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무지 무슨 영문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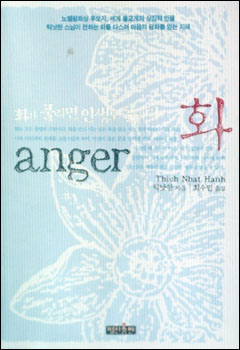
▲아내가 선물한 책이다. 화를 좀 덜 내고 살라고 선물한 모양이다. ⓒ 느릿느릿 박철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나에게 아이들 차례로 줄을 지어 다가와 예쁘게 리본장식을 한 들꽃을 하나씩 하나씩 내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망초, 맨드라미, 메밀꽃, 들국화… 등 흔한 들꽃이었다. 그때서야 감이 잡히는데 오늘이 바로 내 생일이 아니었던가. 아내 말고는 아무도 내 생일 기억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아니 생일을 기억한다는 것도 사치다 싶을 정도로 가난한 마을이었다.
한 달 사례비가 오 만원이었는데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전도사가 미역줄거리 하나 살 만한 돈도 없었고, 또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섭섭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던 것이었다.
아내 목에는 역시 들꽃으로 만든 둥근 꽃다발을 걸어 주었다, 또 자기들끼리 백원 이백원을 모아서 산 것이라며 나에게 넥타이와 넥타이핀을 선물로 주었다. 생일 케잌 대신 제과점에서 사온 둥근 빵에 양초를 꽂고 생일축하 노래를 함께 불렀다.
큰 아이를 가져 만삭이던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파묻고 울었고, 나도 덩달아 아이들 앞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었다. 그때 아이들 표정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웠던지. 한줌의 가식도 없이, 우리 내외를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예배당에 모였던 아이들의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지금도 선하다. 내 생일을 맞으면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난다.
나는 이 해만 넘기면 지천명의 나이에 진입한다.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지났다. 생일이 무슨 대단한 날이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이값도 못하고 살았다. 18년 전 강원도 정선 산골 조무래기들부터 지금 이곳의 80넘은 노인들까지도 내가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게 고개를 수그리신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내 일일진대, 그리고 나이 값을 하는 것일 텐데, 나는 늘 받기만 할 뿐이다. 여전히 미숙하기 짝이 없다. 나는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이다. 그 사랑의 빚을 언제 다 갚는단 말인가? 내가 하느님께로 가는 날, 비로소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18년전 추수감사절 그때는 걸핏하면 애들 앞에서도 잘 울었다. ⓒ 느릿느릿 박철
냉면 한 그릇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간소하게 단아(端雅)하게 살고 싶다. 이것이 생일을 맞는 나의 뉘우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