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23일자 1면 ''이중공문' 이어 또 '이중자세'' 제하 기사. ⓒ 중앙일보 PDF
그러나 총선과 직간접으로 연계돼 있는 탄핵 문제와 관련된 보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포착됐다. 23일 중앙일보가 제1면 왼쪽 머릿기사로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의견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의견 없음'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곧 눈을 끄는 뉴스였다.
선관위는 탄핵 사태를 유발한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방송 기자회견 발언이 위법이라고 기자들에게 발표해서 야당이 탄핵을 요구할 명분을 준 것이 선관위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서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선거에서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완곡하게 대통령이 선거의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썽이 나지 않게 말조심을 해달라는 권고 문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공문을 기초로 법에 위반한 것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고 그것이 야당과 보수 언론을 자극해서 청와대와 야당 보수언론의 대결이 격화됐던 것 아닌가? 문제는 이 사실이 선관위 심의가 끝난 지 8일이 지난 후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공문을 직접 낭독함으로써 비로소 알려진 것이다.
'황희 정승 같은' 선관위의 대답이 탄핵사태 화근
중앙일보가 이보다 며칠 전 선관위가 기자들에게 발표한 것과 청와대에 보낸 공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 대통령 발언의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일은 있다. 선관위가 '2중 플레이를 했다'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선관위는 언론과 민주당에는 대통령의 방송기자회견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하고 청와대에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상반된 견해를 통고했다.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위반했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압력을 가하자 야당과 청와대 사이에 끼어 양쪽에 황희 정승 같은 대답을 해버린 것이 오늘의 화근이 된 것이다.
경위야 어떻든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의에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선관위 ‘의견’을 요구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뉴스이다. 아마 중앙일보의 스쿠프 같다. 23일에는 중앙 외 신문에서 이 기사를 못 보았다.
그러나 24일에는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이 이 기사를 비교적 크게 실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사설까지 실어 선관위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연한 신문 제작 태도이다.
<조선>은 일관되게 '대통령 선거법 위반' 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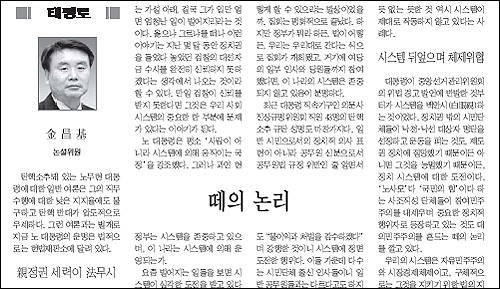
▲<조선일보> 23일자에 실린 '떼의 논리' 칼럼. ⓒ 중앙일보 PDF
하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는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다. 저널리즘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만 조선일보의 경우 24일자 두 번째 사설 '탄핵반대 가담 다음 공직자는 누구냐'에서 "이번 탄핵사태의 발단만 해도 대통령이 선거법을 어겼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관위가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지금까지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공격해 온 조선일보로서는 선관위가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서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통고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추리가 가능할 뿐이다.
조선일보는 김창기 논설위원의 칼럼 '떼의 논리'에서 "노 대통령의 운명은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진짜로 노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것은 바로 어느 재벌 기업의 핵심 인사 한 사람의 입이라는 것이다. 이 재벌이 한나라당에는 몇 백억원의 돈을 갖다 줬으면서 노 대통령 캠프에는 대선 전이든 당선 직후든 뭉치 돈을 갖다 주지 않았을 리 있겠느냐는 가설 아래 결국 그가 입만 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런 이야기가 검찰을 믿지 못하는 풍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가볍게 쓰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소스(정보원)가 말했다는,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는 것은 기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구나 선거를 눈 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는 어느 한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루머성 보도를 더욱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