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욱,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 책세상
얼마 전, 한 중학생이 무심코 인터넷에 공개한 이른바 '왕따 동영상'으로 학교장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휴대 전화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에 공개돼 다시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직접 찍은 사진은 네티즌 사이에서 '직찍사'라고 불리며 다양한 경로로 전파된다.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의 빠른 보급으로 이제 언제, 어떤 장소에든 누구나 타인을 촬영하고, 또 나 역시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촬영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예전에는 대형 서점에 가면 구석에 앉아 열심히 책 내용을 메모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로 필요한 부분을 촬영해 가는 이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된다. 일명 '디카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구입한 어떤 제품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꼼꼼히 기록해 해당 제품 제조사의 안티 사이트에 올린다.
당연히 회사 쪽에서 이들은 주 경계의 대상이 된다. 사건·사고 현장에도 늘 어김없이 디카족이 있고, 언론 매체의 속보보다 더 빨리 블로그나 다른 웹사이트에 사건 사진이 공개되기도 한다. 모 포털사이트는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개인홈페이지에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감시 사회의 상징, 원형 감옥 파놉티콘
감시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학자는 '현대인에게 프라이버시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다. 미셸 푸코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스펙터클(보는 것)' 사회가 감시(보여지는 것) 사회로 바뀌었다고 했다. 푸코가 '감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벤덤이 제안했던 원형 감옥, 파놉티콘(Panopticon)때문이었다.
감옥의 중앙은 어둡게 하고, 죄수가 있는 곳은 밝게 만들어 간수만이 죄수를 볼 수 있는 원형감옥 파놉티콘. 그러나 죄수는 간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 즉, 감시자는 분명 존재하지만, 죄수는 감시자의 존재를 알 수 없다. 누구에게 감시당하는 지 알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죄수를 교화할 목적으로 설계된 벤담의 원형감옥 파놉티콘은 간수가 있는 중앙의 감시 공간을 어둡게 하여 죄수로 하여금 스스로 규율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점차 규율을 '내면화' 하여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든다. 파놉티콘의 이러한 원리에 주목한 푸코는 1960년대부터 부상한 전자 감시나 정보 감시에 대한 우려 속에서, 파놉티콘에 구현된 감시의 원리가 사회 전반으로 스며들어서 규율 사회의 기본원리인 파놉티시즘으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밝혔다. 감옥과 교도소는 물론이요 일상 공간에 만연해 있는 CCTV나 몰래카메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시와 역감시 현상이 모두 이를 증명한다. (홍성욱,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책세상)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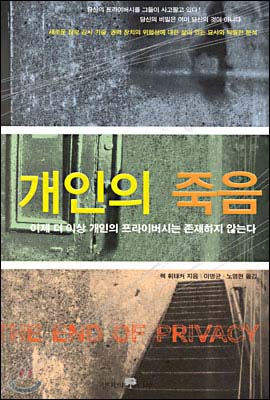
▲렉 휘태커, <개인의 죽음> ⓒ 생각의나무
원형감옥 전체는 그 자체가 일반 대중을 위한 극장 같은 광경이기 때문에, 대중의 일부가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벤담은 감옥 공개의 징계 효과를 굳게 믿은 사람이었다. ) 감시관은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본다.’ 그는 또한 부재하는 존재이며, 죄수는 오로지 그의 시선 안에만 있게 된다. ( 렉 휘태커 저, 이명균 외 역, <개인의 죽음> (생각의나무) 중에서 )
홍성욱 교수는 20세기의 전자 파놉티콘 사회에서는 '스펙터클(보는 것)'과 '감시(보여지는 것)' 사이의 경계가 더 이상 없다고 설명한다. 즉, 20세기 이전까지 이른바 '빅 브라더'로 상징되었던 감시의 중앙 집권화가 주변으로 확대돼, 중앙의 감시 능력을 주변에서 나누어 가지면서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예전에는 감시 기능을 국가 기관에서 일괄 관리했다면, 이제는 시민 누구나 감시자가 되어 감시자와 피 감시자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말이다. 물론 이런 변화가 중앙의 감시 능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일반 시민들까지 감시 행위에 '동원' 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
감시 콘텐츠를 양산하는 인터넷
감시자가 곧 피 감시자가 된 것은 콘텐츠 생산자와 콘텐츠 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진 인터넷 문화와도 같다. '시민 기자'라는 말이 생긴 이유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감시 행위가 곧 콘텐츠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시가 만든 콘텐츠는 다른 종류보다 주목할 만한 스펙터클로서의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스캔들이 옛날보다 부쩍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횟수나 빈도가 전에 비해 병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스캔들이 '감시' 콘텐츠로 재생산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실제로 현실이 그것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감시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역시, 무심코 타인을 감시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감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저 개인적인 목적으로 촬영해 이를 개방 매체에 공개했을 뿐인데 이것이 자칫 감시 콘텐츠로 변질되었다면 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무심코 올린 내용이 감시 콘텐츠가 되어, 타인의 주목을 받고, 자칫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정보 공개 이전에 먼저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은 일종의 차선이며 편법이다.
앞으로 생산하는 신형 휴대전화에는 촬영시 "찰칵" 소리를 내도록 관련 법규를 바꾼다고 해서 감시 사회에서 달라질 건 전혀 없다.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인터넷에도 감시 콘텐츠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네티즌으로서의 개인이 정보 생산자가 된 것은 바람직한 시대의 변화이지만, 그들이 감시 콘텐츠의 주 생산자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불합리하게도 악이었던 감시 행위가 필요악이 돼버렸고, 우리(네티즌)가 그 필요악의 책임과 역할을 떠 안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