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3월 셋째주 지구촌 곳곳에서 특이한 행사가 개최된다. 전 세계 1천여 연구기관과 선진 57개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일반인에게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것. 바로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라는 '뇌(Brain)'이다.
'세계뇌주간(World Brain Awareness Week)'이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1992년 미국에서 시작됐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국은 현재 57개로 늘어났다. 수없이 많은 영역을 가진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 연구기관, 학회 등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척 특이한 현상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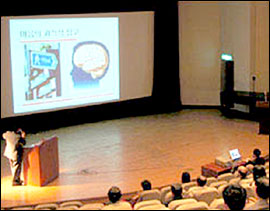 | | | ▲ '2005 세계뇌주간' 일반대중강연 | | | ⓒ 과학문화 | 1997년부터는 유럽에서도 '뇌 주간'이 개최되었다. 1999년부터는 유럽국가들끼리 연합하여 동시에 '뇌 주간'을 개최하고 있다. 또 2000년에는 국제 뇌 연구기구 및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도 참가해 '세계 뇌 주간'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한국뇌학회, 대한뇌기능매핑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인지과학회 등 4개의 학회가 주관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일반인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개최했으며, ▲뇌의 신비와 바이오리듬 ▲한국인에게 반발하는 뇌질환 ▲우리의 일상생활과 뇌 ▲언어, 뇌, 컴퓨터 ▲뇌의 이해와 기능 등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강좌가 펼쳐졌다.
뇌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섰다. 이미 선진국 중심으로 'Human Frontier Project'를 통해 범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뇌가 인간의 총체적인 사고와 기능을 담당하듯, 과학 분야에서의 뇌 과학도 모든 것이 융합된 분야다. 미국에선 '뇌 과학을 통한 과학(Science through Neuroscience)'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학문 영역이 빠르게 그 벽을 허물기 시작하며 하나로 모이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21세기 과학의 특징이다.
왜 21세기를 '뇌의 시대'라고 할까?
 |  | | | ▲ 모든 창조의 근원이자 열쇠인 '뇌' | | | ⓒ 과학문화 | 뉴턴이 물리학의 토대를 만들고 아이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 20세기의 과학이었다.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건축, 토목, 기계분야는 자연을 허물고 수많은 구조물을 건설하게 만들었고, 반도체로 상징되는 전기전자기술의 발전은 지구촌을 하나로 만드는 일등공신이 되었다.
문명의 발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20세기가 끝날 무렵 인류는 공통적으로 지구촌의 '위기'를 느꼈다. 새롭게 생겨나는 각종 바이러스와 그에 따른 질병들, 대규모 기아사태, 지역 및 민족분쟁 등. 문명은 성장했으나 정신적 공허함은 커져 갔고 가족의 가치는 파괴되고 인간성은 상실되어만 갔다.
21세기가 뇌의 시대라고 하는 것에는 '뇌'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물론 주된 것은 뇌과학이 갖는 중요성이지만 인간의 모든 창조활동에 근원이 되는 '뇌'야말로 현재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희망이 숨어있는 셈이다.
| | | 뇌기반교육이란? | | | 21세기 교육의 키워드 | | | |
'뇌기반교육(Brain-based Education)'이란 두뇌개발에 대한 뇌과학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뇌를 이해하고 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이론을 말한다.
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과학교육이 '교육'의 개념에서 '학습'의 개념으로 개편되고, 특히 뇌과학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적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뇌기반학습(BBL: Brain-based Learning) 중심으로 과학교육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21세기 '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인성회복에 교육의 초점이 모아지면서,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코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뇌기반교육여건의 초기 형성단계에 있다. 부분적으로 '뇌'에 초점을 맞춘 학습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 뇌기반교육전문잡지인 '브레인에듀(BrainEdu)'의 탄생이나 뇌호흡교육, 해마컴 등 뇌기반교육에 관련한 시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 | | | |
'뇌'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그 자성을 밑바탕에 깔고서 도전하는 마지막 과학의 영역이라는 아이러니를 가진 셈이다. '뇌'에 대한 관심은 과학을 넘어 예술, 문학, 교육 전반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어쩌면 과학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뇌는 인류가 가진 마지막 자산'이라는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뇌'에 대한 연구가 과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은 뇌과학(Brain Science)이 밝혀내고 있는 뇌의 가치가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뇌의 작용원리와 의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 문화전반에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뇌 연구를 통해 증명해가고 있다. 뇌는 인간성 상실로 대표되는 정신적가치의 회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과학분야에서는 뇌과학, 교육 분야에서는 뇌기반 교육이 코드로 떠오를 만큼 새로운 세기의 화두는 '뇌'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뇌 기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뇌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 연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것은 뇌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보다 뇌가 가진 무한한 창조성을 깨닫고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야 한다.
'뇌'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창조활동의 근본이자 인류가 가진 마지막 자산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매주 오피니언리더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간지 '과학문화' 4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