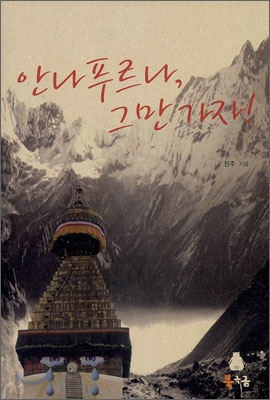
▲책 <안나푸르나, 그만 가자> ⓒ 북극곰
보통 안나푸르나 트레킹이라고 하면 체력 좋은 사람이나 도전해 볼 만한 코스라고 생각한다. 나도 늘 안나푸르나 트레킹 책을 읽어 왔지만, 멋있는 경치에 감탄만 할 뿐 가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안나푸르나, 그만 가자!>를 읽고는 언젠가 꼭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굳이 힘들게 산을 오르지 않더라도 별다른 장비 없이 여자 혼자서도 떠날 수 있는 코스가 있기 때문이다.
트레킹 비용도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 하루에 15달러 정도면 맥주나 간식까지 챙겨 먹을 정도로 넉넉하다고 하니, 여행비용이 부담스러운 배낭 여행객에겐 안성맞춤의 코스가 아닐까 싶다. 여기에 포터와 함께 산행을 한다면 하루 15달러 정도만 더 추가하면 충분하다.
안나푸르나의 생추어리 코스가 가장 평탄한 곳인데, 이곳에서도 아름다운 경치는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다. 트레킹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을 찾자면 10월부터 5월까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10, 11월은 네팔의 장마가 끝난 뒤여서 하늘이며 공기가 더없이 맑고 푸르다. 12월에서 2월까지는 눈으로 뒤덮인 새하얀 안나푸르나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은 그 흔한 안나푸르나 사진 한 장 없는 여행기지만, 저자의 위트 있는 글 솜씨에 푸욱 빠지게 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갑자기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비누칠한 몸을 찬물로 씻는 장면은 괴로운 상태지만 웃음을 유발한다.
"엉뚱한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되는 나의 갸륵한 인내와 끈기. 겁도 없이! 나는 온몸에 슥슥 비누칠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추운 나머지 건전지를 새로 갈아 끼운 전동 칫솔처럼 쉴 새 없이 떨다가 급기야는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겁나게 뛰고 또 뛰었다."여자 혼자 트레킹하려니 힘도 들었을 법한데 그 상황을 즐기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산에서 캠핑을 한 어느 날, 새벽에 날이 밝아 오면서 모습을 드러내는 안나푸르나 남봉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한참을 넋 놓고 보자니 아직 세수도 하지 않은 부스스한 얼굴이 민망스럽다.
사람들이 재빠르게 사진기며 캠코더며 온갖 장비를 들고 나와 여기저기서 셔터를 눌러대고 호들갑을 떨지만 저자는 그냥 아름다운 장면을 멍청히 바라만 봤다고 한다. 혹시나 풍경이 닳을세라 자신의 눈 속에, 마음 속에 온전히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산을 칭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나푸르나라는 거대한 생크림 속의 티스푼처럼 느껴졌다는 표현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으며 이물질 같은 존재인가!
기온이 변화무쌍한 첩첩 산중에서 축축한 옷가지들을 입고 트레킹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달픈 일이다. 힘든 산행 끝에 숙소 식당에 들어와 젖은 빨래를 말리고 있는데, 저자는 갑자기 대각선 방향에 앉아 쩝쩝거리며 라면을 먹는 일본인 부부를 보게 된다.
신라면, 삼양라면, 생생면, 안성탕면 등등 온갖 라면 이름을 떠올리며 '생각만 해도 그리운 이름들이여.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며 김소월의 시 <초혼>을 패러디해 외치는 장면은 미소를 자아낸다.
감히 명시를 라면과 견주다니, 시인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깊은 히말라야 산골짝에 가 보라. 따끈하고 얼큰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의 라면에 대한 그리움은 시인의 떠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에 버금간다. 그럼 히말라야 산중에서 주식으로 적당한 건 무얼까?
정답은 네팔의 전통 음식 달바트다. 다행히도 우리 입맛에 잘 맞고 영양식이며 어디서든 주문이 가능하다. 비록 엄청난 짐 때문에 라면을 갖고 가지 못하더라도 아침저녁으로 따뜻하게 배를 부르게 하는 달바트면 족하지 아니한가.
안나푸르나에서 맑게 흐르는 물을 보고 덜컥 떠서 마시면 십중팔구 배가 아파 고생을 하게 된다. 생수를 사서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 마시고 남은 페트병이 이곳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한다. 생수보다는 로지에서 끓인 차나 끓인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더 편리하게 안전한 물을 마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요오딘이라고 부르는 아이오다인(아이오딘)을 구입하여 소독한 물을 마시는 것이다. 물 1리터당 두 방울씩 떨어트리면 되니 복잡하지도 않고, 30분 후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확실히 사라진다고 한다.
아무리 저자가 유머러스하게 산행을 묘사해도 히말라야가 만만한 곳은 아니다.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에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가려면 늦어도 새벽 네 시에는 출발해야 한다. 피로는 쌓이고 날은 춥고, 추워서 붙인 핫팩은 배에 철썩 달라붙어 화상을 유발하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안나푸르나의 산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저자는 생각한다. 아무리 눈물나게 아름다운 안나푸르나가 항상 곁에 있어 준다고 하더라고 평생 그들처럼 살라고 하면 선뜻 자신이 없다고 말이다. 문명의 세계가 주는 편리함이 달콤한 꿀단지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미 그 꿀단지의 달디 단 맛을 알아버렸고, 문명의 유혹을 저버릴 수 없는 가여운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 적어도 균형을 잃지 말고 꿀단지에 풍덩 빠지지는 말아야지. 이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말이야."책을 읽는 나도 저자의 마음에 공감하게 된다. 문명이 아무리 편하고 좋은 꿀단지일지라도 자연이 주는 수많은 혜택과 그 거대한 위력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결국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 살면서, 커다란 생크림 속의 티스푼에 불과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