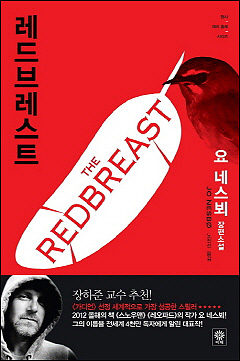
▲<레드브레스트>겉표지 ⓒ 비채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들으면 북유럽의 평화롭고 부유한 복지국가의 이미지가 떠오른다(어쩌면 바이킹이 생각날 수도 있겠다).
이런 나라의 현대사에도 어두운 구석은 있다. 노르웨이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 당한 시절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노르웨이 왕실은 영국으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만 명이 넘는 노르웨이 젊은이들이 독일군에 자원입대해서 동부전선에 배치되어 소련군에 맞서 싸웠다.
이런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히틀러의 추종자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공산주의 또는 스탈린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군이 물러간 이후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반역혐의로 체포되었고 그중 일부는 사형을 선고 받았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신나치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이다. 노르웨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아직도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북유럽의 신나치주의자들요 네스뵈가 2000년에 발표한 장편 <레드브레스트>는 바로 2차대전 시절 노르웨이의 어두운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작품의 무대가 2차대전 시기는 아니다. <레드브레스트>는 현대의 노르웨이와 2차대전 당시 동부전선을 오락가락하면서 시작된다.
작품 속에서 묘사하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도 신나치주의를 추종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닌다.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다. 이들 중 한 명은 식당을 운영하는 베트남인을 야구방망이로 두들겨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만든다. 그렇지만 노르웨이 재판정에서는 재판절차 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를 풀어주고 만다.
주인공인 오슬로 경찰국 소속 형사 해리 홀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좀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무기인 매르클린 라이플 한 정이 밀반입된 것이다. 이 총은 암살범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저격용 무기로 사람이 이 총에 맞으면 맞은 부위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
해리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고, 여러가지 정황상 이 무기를 밀반입한 사람은 2차대전에 참전해서 동부전선에서 싸웠던 전직군인이라고 추측하게 된다. 아직도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으니 그 당사자는 십중팔구 노인일 것이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무기의 사용을 막기 위한 해리의 노력이 시작된다.
작가가 고백하는 가족의 역사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 개인적인 경험을 녹여 넣는 경우가 많다. 그 경험은 즐거운 것일 수도 있고, 우울한 것일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악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작품 속 인물들의 삶에 집어넣는 일은 흥미로운 작업일 테지만, 문제는 그 경험을 어디까지 어떻게 넣을까 하는 점이다.
작가 요 네스뵈는 <레드브레스트>를 가리켜서 자신의 개인적인 가족사라고 말한다. 요 네스뵈의 아버지는 2차대전 당시 독일군에 자원입대해서 레닌그라드 외곽에서 싸웠다. 네스뵈는 열다섯 살 때 아버지가 과거에 나치군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
네스뵈가 받았던 그 충격이 <레드브레스트>를 집필하게 된 동기 중 하나였을 것이다. 가족의 과거를 작품에 삽입하는 것과 그것을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밝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네스뵈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어린시절에 받았던 충격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레드브레스트>는 '해리 홀레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이기도 하다. 해리 홀레는 190cm의 장신에 뛰어난 수사능력을 가졌지만 알코올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는 노르웨이의 수려한 풍광과 함께 잊고 싶은 과거의 역사가 펼쳐진다. 어떤 사람들에게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덧붙이는 글 | <레드브레스트> 요 네스뵈 지음 / 노진선 옮김. 비채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