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은 오마이뉴스 에디터의 사는이야기입니다.[편집자말] |
"잘 쓰지도 못하는데 계속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하고 육아하며 없는 시간을 쪼개 기사를 올리던 직장맘 시민기자였다. 한동안 그의 글이 보이지 않아, 안부 겸 쪽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 그런데 내 눈에는 저 문장만 보였다. 그 문장 하나가 목 안에 톡 하고 걸려 삼켜지질 않았다.
누구라고 안 그럴까. 글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그럴 거다. 채택은 안 되지만(실시간글) 계속 도전하는 시민기자, 채택만 되는(잉걸) 시민기자, 버금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으뜸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민기자도 그럴 거다. 늘 오름에 걸리다가 어떤 날은 으뜸, 어떤 날은 버금, 또 어떤 날은 잉걸로, 또 어떤 날은 채택이 되지 않는 시민기자들도 그럴 거다. 직업기자라고 다를까. 아닐 거다. 다시 말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그럴 거다.
나도 그랬다. 편집기자로 일하며 퇴근 후 짬짬이 글을 쓰지만 최성연 시민기자, 배지영 시민기자, 이훈희 시민기자, 조종안 시민기자, 임희정 시민기자, 신소영 시민기자, 김은경 시민기자, 박효정 시민기자, 김이진 시민기자, 양성현 시민기자, 문하연 시민기자 등 자신만의 이야기로 꾸준히 글을 써서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민기자들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 마음이 허해질 때가 있다.
나도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저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부끄러워서 속으로 혼자서만 내뱉고 마는 말들. 그러고나면 '이걸 써서 뭘 하나' 싶어 한 글자도 쓸 수 없는 날이 있다.
오름에 걸리는 시민기자들에게만 느끼는 부러움은 아니다. 이제 막 기사를 쓰기 시작한 새 시민기자들의 글을 보고 감탄할 때도 많다. 내 머릿속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 '마음에 남는 문장'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좌절한다. 내게 없는 것에 질투가 난다. 가령, 이런 문장들.
이런 비교는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 시간 속에 나와 오늘의 나를 비춰보고, 내일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 살아보지 않은 내일은 두렵고 불안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나를 느낀다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너무 무거운 건 혼자 짊어질 수 없다. 나 혼자였다면 10시간 동안 험한 암벽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나는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딸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살다가 내 잘못이 아니어도 무언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여 주면 안 될까? 살면서 아픈 사람 보면 나만큼 아팠겠구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 말이 떠올랐다. 아무 두서도 없이. 바람 부는 벌판에 혼자 서서 걸어나가야 하는 나와 내 손을 잡은 딸아이에게 나도 힘드니까 너는 네 발로 걸어나가라고 한 이야기였다.
가장 최근 기사인 '히말라야 희망원정대 산행기 4편'을 읽었을 때 내 어깨는 이미 들썩거리고 있었다. 출근하자마자 눈물 바람. 아, 뭐야... 김준정 시민기자의 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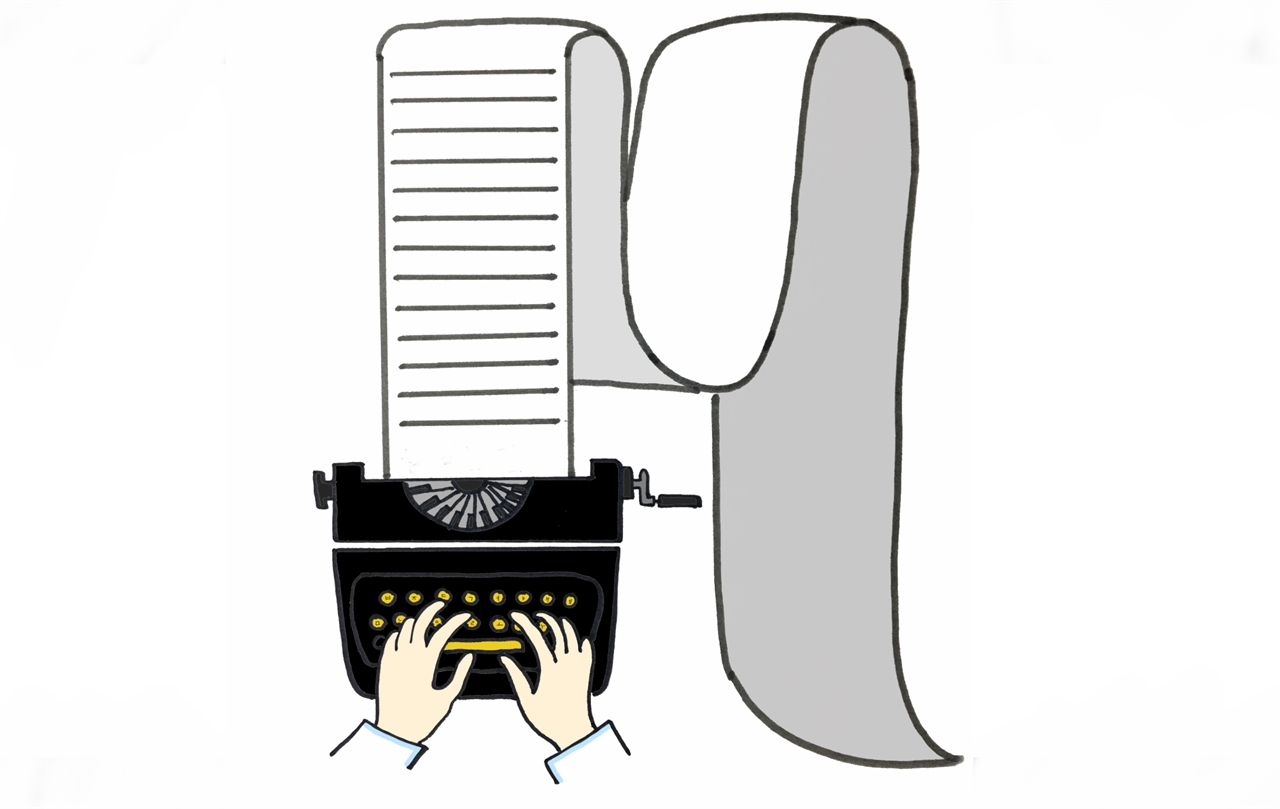
▲'글 쓰는 길'을 걸으면 얻는 게 많아진다. 내 마음 보따리가 든든해진다. 손그림 금경희, 채색 이다은. ⓒ 금경희
18년간 수학을 가르쳐 오다 최근 폐업을 한 보습학원 원장 선생님. 군산에 사는 그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오마이뉴스>에 기자회원으로 가입해 기사를 쓰라고 한(!) 배지영 시민기자가 들려준 김준정 선생 이야기는 더 놀랍다(관련기사 :
서점에서 만난 사이인데 왜 산에 가야 합니까 http://omn.kr/1kxb9).
"헐! 한글 타자 못 친다고요? 몇 달 동안 에세이 숙제는 어떻게 쓴 거예요? 78년생인데 학교 다닐 때 리포트를 손 글씨로 썼어요? 학원 업무 처리는 누가 대신 해준 거예요?"
마흔이 넘도록 타자도 못 치던 사람이 글쓰기 6개월 만에 이런 글을 쓰게 되리라고는 배지영 기자도 몰랐을 거다. 배지영 기자는 저 글에서 썼다. '준정씨는 10월에 지적장애인들과 같이 히말라야에 간다. 여름 내내 격주로 훈련했고 그 과정을 글로 썼다. 멀고 웅장하고 높은 산에 갔다 와서는 더 유쾌하고 속 깊은 글을 쓰게 되겠지'라고.
잘 쓰지 못하는 걸로 치면 위에서 언급한 직장맘 시민기자보다 김준정 시민기자가 위였을 거다. 하지만 뭐든 '꾸준한 사람'은 못 이긴다. '글 쓰는 산악인' 김준정 기자는 산에 오르듯 글을 썼을 거다.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어쨌든 계속 가야 산 정상에 올랐다 내려올 수 있는 것처럼 글도 계속 쓸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랬으니까 타자 치는 속도도 늘고, 이런 좋은 문장들도 생겨났을 거다.
'글 쓰는 길'을 걸으면 얻는 게 많아진다. 내 마음 보따리가 든든해진다. '좋은 기사 원고료'를 주는 독자도 생기고, '좋아요' 눌러주는 독자들,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는 독자들도 눈물나게 고마워진다.
같이 글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 울고, 웃고, 배우는 순간들도 생겨날 거다. 그렇게 계속 쓰다보면 글이 책으로 나오고, 내 팬도 생길 거다. 내 글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될 거다. 무엇보다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이 꽤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계속 쓰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 쓰기만이 가능케하는 일들이다.
그러니 "잘 쓰지도 못하는데 계속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그 이야기는 기자님만이 쓸 수 있는 글이니 계속 쓰시라고.
6년 동안 14권의 책을 낸 서민 교수도 '일기를 쓰자' 강연에서 말했다. 글쓰기는 꼭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글(일기)에는 자기객관화의 힘이 있어 쓰는 동안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 계속 쓰라고. 시민기자들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